공유하기
[BIZ WINE]‘굴에는 샤블리’ 절대진리는 아닙니다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과거 서양에서는 ‘r’가 들어있지 않은 달인 5월(May), 6월(June), 7월(July), 8월(August)에는 굴에 독이 들었다며 먹지 않았다. 사실 독이 들었다기보다는 냉장시설이나 교통수단이 미비하던 시절이라 기온이 올라가는 이 시기에 굴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킨 사례가 많았으리라. 요즘에는 굴의 산란기인 이 시기에 굴이 한층 부드럽다며 일부러 굴을 찾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프랑스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굴의 천국이라 할 만하다. 생산량만 놓고 보면 한국이 프랑스보다 많지만 그 종류를 따지면 프랑스의 압승이다. 파리의 식당에서 ‘모둠 굴’을 주문하면, 쟁반 가득 각양각색의 굴이 담겨 나온다. 찝찌름한 바다 맛, 감칠맛, 단맛, 즙의 양, 육질의 탄성 등 굴의 다양한 면모를 접하다 보면, 정작 프랑스에서 ‘굴에는 샤블리(부르고뉴 지방의 마을 이름이자 이곳에서 만든 화이트 와인)’라는 말을 듣기 어려운 이유가 이해된다.
프랑스 와인숍에서 굴과 함께 마실 와인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어디 산(産) 굴이죠?’나 ‘어떻게 드실 거죠?’ 같은 질문을 받기 마련이다. 산지나 요리법에 따라서 굴의 맛과 향, 질감이 확연히 달라지니 여기에 어울리는 와인도 똑같을 리가 없다.
프랑스의 많은 귀족들은 해안에서 식탁까지 운반돼 온 굴을 먹을 때 높은 산도의 화이트 와인을 찾았다. 신맛이 강할수록 살균 효과도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르고뉴 와인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로 부의 크기를 가늠하던 이 시절, 귀족들은 이왕이면 부르고뉴산 와인을 찾았고, 그중에서도 부르고뉴의 최북단에 위치한 샤블리에서 나는 포도는 산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곳의 겨울 추위는 와인의 날카로운 산도를 누그러뜨리는 발효과정을 막아서 샤블리는 그 어떤 부르고뉴 화이트와인보다 월등히 강한 신맛을 갖게 됐다. 이 때문에 귀족들은 굴과 함께 마실 부르고뉴 와인으로 샤블리를 찾았다는 것.
양조 기술이 발달하면서 샤블리의 맛은 더욱 다양해졌고, 신맛의 강도 또한 조정이 가능해졌다. 개중에는 굴의 비린내가 오히려 도드라지는 역효과를 내는 샤블리도 적지 않다. 따라서 와인 초심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굴에는 샤블리’라는 옛 공식은 더는 회자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본다. 최근 필자는 프랑스의 어느 미식 사이트에서 ‘굴과 와인 매칭의 황금률’에 대한 문구를 읽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흥미로운 내용이라 지면에 소개하고자 한다. ‘너무 찬 굴을 내놓지 않듯, 와인도 아주 차게 내놓지만 마세요!’였다.
김혜주 와인칼럼니스트
● 이번 주의 와인
몽튀스 블랑 2000

트렌드뉴스
-
1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2
나라 곳간지기에 與 4선 박홍근… ‘비명횡사’ 박용진 총리급 위촉
-
3
[단독]“거부도 못해” 요양병원 ‘콧줄 환자’ 8만명
-
4
드론 수백대 줄지어…이란, 무기 터널 공개 ‘전쟁 능력’ 과시
-
5
[단독]靑 “김민기” vs 대법 “박순영”… 이번엔 대법관 인선 놓고 평행선
-
6
‘알바는 퇴직금 없다’는 거짓말… 1년간 주 15시간 근무 땐 보장
-
7
트럼프, 마두로때처럼 ‘親美 이란’ 노림수… 체제 전복도 언급
-
8
돼지수육 본 김 여사 “밥 안 주시나요?”…싱가포르서 제주 음식 ‘감탄’
-
9
헤어진 여친 16시간 감금-폭행… ‘교제 폭력’ 소년범 징역형 선고
-
10
2월 27일 오후 3시 38분 트럼프 “에픽 퓨리를 승인한다. 중단은 없다”
-
1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더 거칠어진 ‘힘의 질서’
-
2
드론 수백대 줄지어…이란, 무기 터널 공개 ‘전쟁 능력’ 과시
-
3
[김승련 칼럼]장동혁-한동훈, 알고 보면 운명공동체
-
4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5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지명…‘이화영 변호인’ 정일연, 권익위원장
-
6
李 “집 팔기 싫다면 두라, 이익-손실 정부가 정해”
-
7
[사설]‘사법개혁 3법’ 통과… 법집행자들의 良識으로 부작용 줄여야
-
8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9
“日 국민 대부분은 韓에 ‘과거사’ 사과 당연하다고 생각”
-
10
순방 가서도 ‘부동산’…李 “韓 집값 걱정? 고민 않도록 하겠다”
트렌드뉴스
-
1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2
나라 곳간지기에 與 4선 박홍근… ‘비명횡사’ 박용진 총리급 위촉
-
3
[단독]“거부도 못해” 요양병원 ‘콧줄 환자’ 8만명
-
4
드론 수백대 줄지어…이란, 무기 터널 공개 ‘전쟁 능력’ 과시
-
5
[단독]靑 “김민기” vs 대법 “박순영”… 이번엔 대법관 인선 놓고 평행선
-
6
‘알바는 퇴직금 없다’는 거짓말… 1년간 주 15시간 근무 땐 보장
-
7
트럼프, 마두로때처럼 ‘親美 이란’ 노림수… 체제 전복도 언급
-
8
돼지수육 본 김 여사 “밥 안 주시나요?”…싱가포르서 제주 음식 ‘감탄’
-
9
헤어진 여친 16시간 감금-폭행… ‘교제 폭력’ 소년범 징역형 선고
-
10
2월 27일 오후 3시 38분 트럼프 “에픽 퓨리를 승인한다. 중단은 없다”
-
1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더 거칠어진 ‘힘의 질서’
-
2
드론 수백대 줄지어…이란, 무기 터널 공개 ‘전쟁 능력’ 과시
-
3
[김승련 칼럼]장동혁-한동훈, 알고 보면 운명공동체
-
4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5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지명…‘이화영 변호인’ 정일연, 권익위원장
-
6
李 “집 팔기 싫다면 두라, 이익-손실 정부가 정해”
-
7
[사설]‘사법개혁 3법’ 통과… 법집행자들의 良識으로 부작용 줄여야
-
8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9
“日 국민 대부분은 韓에 ‘과거사’ 사과 당연하다고 생각”
-
10
순방 가서도 ‘부동산’…李 “韓 집값 걱정? 고민 않도록 하겠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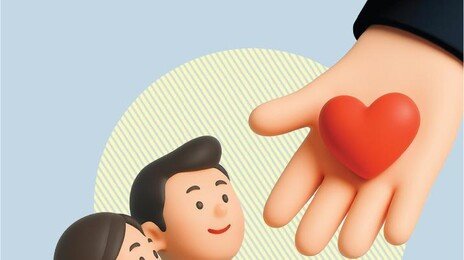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