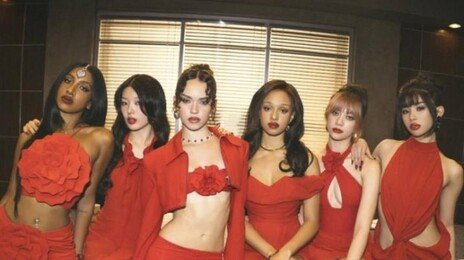공유하기
숭례문은 없다… 그리고 우리도 없다
-
입력 2008년 2월 12일 20시 10분
글자크기 설정

초저녁부터 시작되었던 어머니의 피난 짐 싸기는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허둥대기만 하느라, 새벽에 이르러서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어머니가 보여주는 난삽한 모습을 나는 온몸을 겨울 사시나무 떨듯하며 지켜보았다. 먼 산등성이 저 뒤편으로 작열하는 포화와 어머니의 대중없는 봇짐 싸기가 나를 더없이 긴장시켰기 때문이었다.
불타고 있는 숭례문을 지켜보는 내 머릿속에는 53년 전에 겪었던 육이오 전쟁의 피난길을 떠올리게 했다. 그래서 화염 속으로 처참하게 주저앉는 서울의 큰 대문을 바라보면서 두서없이 집안을 서성거렸다. 전쟁이 아니고서야 어찌 수도 서울 한복판에 600년 이상 온전하게 버티고 있었던 서울의 정문이 전소될 수 있다는 것인가.
짐 싸고 챙기고 자시고 할 건더기가 없었기 망정이지, 갈무리해둔 것이 많았더라면 나는 분명 53년 전의 어머니처럼 무작정 피난 짐부터 싸는 볼품사나운 꼴을 연출했을 것이다. 전쟁과 불길, 그리고 아우성과 포화의 작열음에 대한 피해의식은 일생 동안 그래서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전쟁 발발이 아니었다면, 수도 한양의 중심축에 세워진 국보 1호 숭례문이 전소되고 말았다는 거짓말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29번지. 우리역사 610년의 질곡과 애환을 고스란히 아로새긴 남대문이 지금은 미라가 되어 남루한 모습으로 누워 있다.
우리나라 어느 사찰의 안내판에도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 초토화를 겪지 않았다는 문구는 발견하기 힘들다. 그처럼 누적된 역사의 치명적인 착취와 교란에도 숭례문만은 의연하게 살아남았다. 6·25 전쟁의 참화 속에 서울 전체가 한낱 잿더미로 무너졌을 때도 우리의 정문만은 의연하게 거기 서 있었다.
조선초기의 이상을 담아낸 이 건축물이 어째서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져 버린 것일까. 눈 갈기 치켜들고 문화민족으로 자처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지난날들이 비로소 수치스럽다. 그러나 이 수치심은 네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의 탓이다. 우리 모두가 610년의 역사를 불과 5시간 만에 고스란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방화범들이다. 그런데도 어째서 우리는 진화가 덜된 절박한 현장에서 조급하게 서로를 손가락질로 가리켜야 하는 것일까.
숭례문을 일반에 개방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미련한 말도 들린다. 그야말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반편의 말과 조금도 다름 아니다. 온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큰 사건이나 전쟁도 그 동기는 사소한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방심한 것에서부터 출발했었다.
문제는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간단한 것에 귀착된다. 문화재 관리 실태는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알리는 가늠자다. 문화재청의 발표로는 2,3년 안에 복원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복원한다고 해서 이미 훼손되어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우리 역사 600년의 얼굴, 숭례문의 진정성도 고스란히 복원될 수 있을까. 그것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것은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줄 아는 악덕상인의 사고방식과 조금도 다를 게 없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다. 관리가 소홀하면 또 다른 재앙을 겪기는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그러나 모두 절망적인 것만 보였던 것은 아니다. 어떤 아낙네가 잿더미가 된 남대문에 조화를 바치며 엎드려 오열하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 문화의 자존심이 그 날 땅에 엎드려 울먹이고 있는 이름 모를 아낙네의 떨리는 어깨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 아낙네에게 숭례문은 600년 동안 줄곧 살아 움직였던 생명체이며, 그 생명체가 지녔던 존엄성에 대한 헌화였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 아낙네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며, 그녀로 말미암아 문화민족임을 자처해도 부끄럽지 않을 한줄기 가느다란 희망을 갖게 한다.
김주영 소설가
트렌드뉴스
-
1
트럼프 ‘반도체 포고문’ 기습 발표…“결국 美 생산시설 지으란 것”
-
2
野 중진까지 “한동훈 제명 재고”에… 장동혁, 징계 10일 미뤄
-
3
아시안컵 8강전 가시밭길…한국 U-23 대표팀, 우승 후보 호주와 격돌
-
4
‘정년 65세 연장’과 맞바꾼 버스파업 철회…혈세로 비용 메워야
-
5
탄산음료 제쳤다…한국인 당 섭취식품 1위는 ‘이것’
-
6
[단독]‘부정청약’ 조사 끝나자마자 이혜훈 장남 분가
-
7
이병헌 ‘미모’ 자랑에 美토크쇼 진행자 테이블 치며 폭소
-
8
美 반도체 관세 ‘포고문’에… 정부, 삼성-SK 불러 긴급회의
-
9
美, 75개국 이민 비자 발급 중단…한국은 제외
-
10
서태평양 심해 속 고농도 희토류, 국내 과학자들이 찾았다
-
1
한동훈은 생각 없다는데…장동혁 “재심 기회 줄 것”
-
2
장동혁, 단식 돌입…“與, 공천헌금·통일교 특검 수용하라”
-
3
李대통령이 日서 신은 운동화는 75만원짜리…“수행비서 신발 빌려”
-
4
[송평인 칼럼]군 통수권자의 최소한의 자격
-
5
90분 최후진술 尹 “이런 바보가 쿠데타하나”… 책상치며 궤변
-
6
野 중진까지 “한동훈 제명 재고”에… 장동혁, 징계 10일 미뤄
-
7
[사설]딱하고 민망했던 尹 최후진술
-
8
‘정년 65세 연장’과 맞바꾼 버스파업 철회…혈세로 비용 메워야
-
9
정청래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수사-기소 완전분리 의지 밝혀
-
10
국힘 “이혜훈, 아들들 증여-병역 자료 제출 거부…청문회 무의미”
트렌드뉴스
-
1
트럼프 ‘반도체 포고문’ 기습 발표…“결국 美 생산시설 지으란 것”
-
2
野 중진까지 “한동훈 제명 재고”에… 장동혁, 징계 10일 미뤄
-
3
아시안컵 8강전 가시밭길…한국 U-23 대표팀, 우승 후보 호주와 격돌
-
4
‘정년 65세 연장’과 맞바꾼 버스파업 철회…혈세로 비용 메워야
-
5
탄산음료 제쳤다…한국인 당 섭취식품 1위는 ‘이것’
-
6
[단독]‘부정청약’ 조사 끝나자마자 이혜훈 장남 분가
-
7
이병헌 ‘미모’ 자랑에 美토크쇼 진행자 테이블 치며 폭소
-
8
美 반도체 관세 ‘포고문’에… 정부, 삼성-SK 불러 긴급회의
-
9
美, 75개국 이민 비자 발급 중단…한국은 제외
-
10
서태평양 심해 속 고농도 희토류, 국내 과학자들이 찾았다
-
1
한동훈은 생각 없다는데…장동혁 “재심 기회 줄 것”
-
2
장동혁, 단식 돌입…“與, 공천헌금·통일교 특검 수용하라”
-
3
李대통령이 日서 신은 운동화는 75만원짜리…“수행비서 신발 빌려”
-
4
[송평인 칼럼]군 통수권자의 최소한의 자격
-
5
90분 최후진술 尹 “이런 바보가 쿠데타하나”… 책상치며 궤변
-
6
野 중진까지 “한동훈 제명 재고”에… 장동혁, 징계 10일 미뤄
-
7
[사설]딱하고 민망했던 尹 최후진술
-
8
‘정년 65세 연장’과 맞바꾼 버스파업 철회…혈세로 비용 메워야
-
9
정청래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수사-기소 완전분리 의지 밝혀
-
10
국힘 “이혜훈, 아들들 증여-병역 자료 제출 거부…청문회 무의미”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