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한국문학 젊은 작가들 평단의 도마에 오르다
-
입력 2006년 6월 16일 03시 05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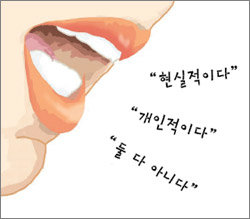

비평가들이 이처럼 신인 작가들을 패러다임화해 논쟁을 벌이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신인들이 본격적인 검증의 대상이 되려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게 그간 평단의 입장이었던 것.
○현실성 VS 탈(脫)현실성
‘2000년대 소설가’들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보다 이들의 소설이 현실적이냐 그렇지 않으냐의 문제다. ‘실천문학’에서 평론가 복도훈 씨는 “2000년대에 등장한 한국소설의 새로운 주인공들은 어떤 경우 더는 캐릭터나 개성과 인격의 담지자가 아니라 자동인형 또는 동물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을 정도로 탈주체화의 맥락과 자장 안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김영찬 씨는 평론집에서 김애란 이기호 편혜영 김유진 씨 등 신인 소설가들을 거론하면서 “2000년대 젊은 문학의 자아는 대체로 처음부터 자기 자신의 현실적·정신적 무력함을 일종의 운명으로 내면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 씨는 나아가 “이들에게는 기댈 수 있는 어떤 관념적 거점도, 현실과 부딪치는 모험적 열정도, 자기파괴적 항의도, 냉소할 수 있는 여력도, 또 이를 떠받칠 수 있는 자아에 대한 강한 신념도 없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한기욱 씨는 ‘창작과비평’에서 “그들의 주체들을 도매금으로 ‘무력’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2000년대 젊은 소설의 자아는 무력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성찰의 경지가 높고 주변부적인 삶의 횡포에 수모를 당하면서도 주눅 들지 않을 만큼 ‘중심’을 지닌 자아”라고 반박한다. 2000년대 소설가들이 현실에서 멀리 있다는 김영찬 씨의 주장에 대해 한 씨는 실은 지극히 현실적이라고 맞선 것이다.
● 개인 VS 관계
‘2000년대 시인’에 대한 논의는 주로 실험시에 맞춰진다. 환상, 전복, 엽기, 난해성 등 기존의 서정시 어법과는 전혀 다른 코드의 시를 쓰는 젊은 시인들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것. ‘해독 불가능한 시’로도 불리는 이들 작품에 대해 그간 새로운 상상력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었다. 그랬던 것이 계간지 여름호에서 대대적인 비판이 쏟아진 것.
이경수 씨는 ‘작가세계’에서 황병승 김민정 장석원 씨 등 젊은 시인들의 시를 분석하면서 “기껏 이 시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위안에 불과해 보인다”면서 “구원이나 치유를 기대하는 독자라면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이런 시들이 개인적 고민에만 몰두한다고 지적하면서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짚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용희 씨도 계간 ‘시작’에서 실험시들이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지적한다. 홍 씨는 신진 시인들에 대해 “시인들 스스로 소통 불능의 자폐적 성채로 들어가는, 일종의 내국망명의 길을 선택했다”면서 “이것은 현실세계에 대한 반영의 한 형식일 수는 있으나 대안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뜨거운 논쟁에 대해 문단은 긍정적이다. “신인작가들이 뚜렷한 특징을 보여줌으로써 ‘2000년대 문학’이라는 패러다임이 빠르게 형성됐고, 문단의 회전율이 그만큼 빨라졌음을 보여 주는 방증”이라는 게 비평가들의 설명이다.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트렌드뉴스
-
1
국힘 지지율 10%대 추락…TK서도 동률, 全연령대 민주 우위
-
2
홍준표 “법왜곡죄, 박정희 국가원수 모독죄 신설과 다를 바 없어”
-
3
김치통에 현금 2억, 안방엔 금두꺼비…고액체납자 은닉 재산 81억 압류
-
4
李 “인천공항서 지방공항 가려면 ‘김포’ 거쳐야…시간 너무 걸려”
-
5
“야 임마” “與, 또 뒤통수”…국힘 몫 방미통위 추천안 부결 충돌
-
6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홍라희와 함박웃음
-
7
한동훈 “백의종군 하라? 그분들, 尹이 보수 망칠때 뭐했나”
-
8
안철수 “정원오, 고향 여수에 성동구 휴양시설 지어”…鄭측 “주민투표로 결정”
-
9
”尹 무기징역 형량 가볍다“ 42%…“적절하다” 26%
-
10
‘17% 쇼크’ 국힘, TK도 등돌려 與와 동률…“바닥 뚫고 지하로 간 느낌”
-
1
국힘 지지율 10%대 추락…TK서도 동률, 全연령대 민주 우위
-
2
김정은 “한국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동족서 영원히 배제”
-
3
한미동맹 잇단 엇박자… 야외 기동훈련도 공개 이견
-
4
李 “北, 南에 매우 적대적 언사…오랜 감정 일순간에 없앨순 없어”
-
5
한동훈 “백의종군 하라? 그분들, 尹이 보수 망칠때 뭐했나”
-
6
李 “저도 꽤 큰 개미였다…정치 그만두면 주식시장 복귀”
-
7
[송평인 칼럼]‘빙그레 엄벌’ 판사와 ‘울먹이는 앵그리버드’ 판사
-
8
‘판검사 최대 징역 10년’ 법왜곡죄 與주도 본회의 통과
-
9
국힘 중진들 장동혁에 쓴소리…윤상현 “속죄 세리머니 필요”
-
10
‘17% 쇼크’ 국힘, TK도 등돌려 與와 동률…“바닥 뚫고 지하로 간 느낌”
트렌드뉴스
-
1
국힘 지지율 10%대 추락…TK서도 동률, 全연령대 민주 우위
-
2
홍준표 “법왜곡죄, 박정희 국가원수 모독죄 신설과 다를 바 없어”
-
3
김치통에 현금 2억, 안방엔 금두꺼비…고액체납자 은닉 재산 81억 압류
-
4
李 “인천공항서 지방공항 가려면 ‘김포’ 거쳐야…시간 너무 걸려”
-
5
“야 임마” “與, 또 뒤통수”…국힘 몫 방미통위 추천안 부결 충돌
-
6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홍라희와 함박웃음
-
7
한동훈 “백의종군 하라? 그분들, 尹이 보수 망칠때 뭐했나”
-
8
안철수 “정원오, 고향 여수에 성동구 휴양시설 지어”…鄭측 “주민투표로 결정”
-
9
”尹 무기징역 형량 가볍다“ 42%…“적절하다” 26%
-
10
‘17% 쇼크’ 국힘, TK도 등돌려 與와 동률…“바닥 뚫고 지하로 간 느낌”
-
1
국힘 지지율 10%대 추락…TK서도 동률, 全연령대 민주 우위
-
2
김정은 “한국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동족서 영원히 배제”
-
3
한미동맹 잇단 엇박자… 야외 기동훈련도 공개 이견
-
4
李 “北, 南에 매우 적대적 언사…오랜 감정 일순간에 없앨순 없어”
-
5
한동훈 “백의종군 하라? 그분들, 尹이 보수 망칠때 뭐했나”
-
6
李 “저도 꽤 큰 개미였다…정치 그만두면 주식시장 복귀”
-
7
[송평인 칼럼]‘빙그레 엄벌’ 판사와 ‘울먹이는 앵그리버드’ 판사
-
8
‘판검사 최대 징역 10년’ 법왜곡죄 與주도 본회의 통과
-
9
국힘 중진들 장동혁에 쓴소리…윤상현 “속죄 세리머니 필요”
-
10
‘17% 쇼크’ 국힘, TK도 등돌려 與와 동률…“바닥 뚫고 지하로 간 느낌”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