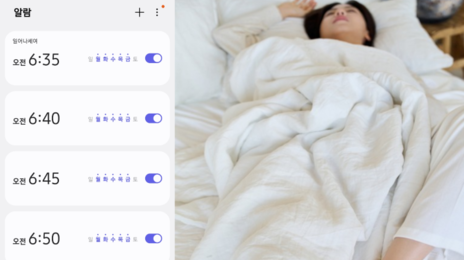공유하기
[클래식]'그윽한 선율'의 브루크너 교향곡 7번
-
입력 2001년 11월 20일 18시 37분
글자크기 설정

그러고 보면 가을이 찾아온 것은 한 순간이었다. 어느날 갑자기 아침 저녁으로 살끝을 간지럽히는 뽀송뽀송한 공기의 감촉이 살가왔고, 정오의 햇살도 눈부시게만 느껴졌었지. 그러나 가을의 끝은 어떤가. 단지 겨울의 한자락에 묻혀 아득하게 잠겨갈 뿐, 분명한 자취를 갖지 않는다.
첫눈을 만나기 전에, 산에 한번 올라야 하지 않을까? 이파리가 다 떨어진 앙상한 고목들의 능선. 그 오솔길을 오르내리며 휴대용 플레이어로 듣는, 또는 마음속으로 불러내는 안톤 브루크너(1824∼1896)의 매력은 각별하다.
그의 교향곡 7번 E장조, 2악장 아다지오를 ‘마음속의 오디오’로부터 불러낸다. 브루크너가 평소 존경했던 바그너의 죽음을 대해, 그를 추모하며 쓴 악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호른과 ‘바그너 튜바’의 긴 지속음(持續音)은 마치 능선 사이로 잠겨가는 흐릿한 햇살과도 같다. 설레는 걸음걸이는 야트막한 봉우리를 돌아 한굽이를 지난다. 절벽 아래로 또하나의 서늘한 풍경이 펼쳐진다. 오래 햇살을 못받은 계곡에서는 젖은 흙냄새가 풍긴다.
머뭇거리는 듯한 금관의 약주(弱奏), 이어 다시 현의 짙은 울림. 또 한해가 이렇게 저물어갈 모양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일들에 골몰해 왔던가! 그러나 못내 포기하지 못할 소망이 있고, 노을은 저리도 찬란하다. 금관의 찬연한 포효와 심벌이 불을 뿜는다.
산허리를 돌아 내려가는 발걸음이 바쁘지만, 바그너 튜바의 그윽한 최후의 지속음은 계속 머리속에 남아 있다….
얼마 전 지휘대에서 쓰러져, 마치 영웅의 최후처럼 되돌아오지 못할 길을 갔던, ‘지휘계의 철학자’ 주세페 시노폴리의 연주로 이 낭만주의 성숙기의 대곡을 듣는다. 구 동구권의 명가인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악단이 그 명성대로 숙연하고도 장엄한 사운드를 들려주었다.
20세기의 거대한 문화적 아이콘으로 여겨졌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그의 연주로 대하는 브루크너 역시 사뭇 새로운 감흥을 준다. 시노폴리쪽이 단정하고 잘 마무리돼 있으며 정제된 울림을 전해준다면, 카라얀의 연주는 더 스케일이 크고, 높이, 멀리 펼쳐져 있으며 ‘단호’하다.
오스트리아 산골과 빈을 오갔던 그의 성장환경이 브루크너와 겹쳐지기에, 더욱 공감이 컸을 지도 모른다.
<유윤종기자>gustav@donga.com
무비카툰 >
-

샌디에이고 특별전 맛보기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기고
구독
트렌드뉴스
-
1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2
홍석천 “부동산에 속아 2억에 넘긴 재개발 앞둔 집, 현재 30억”
-
3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4
“놓지마!” 애원에도…술 취해 어린아들 7층 창문에 매단 아버지
-
5
“까치발 들고 물 1.5L 마시기”…50대 매끈한 다리 어떻게? [바디플랜]
-
6
오늘 밤 서울 최대 10㎝ 눈폭탄…월요일 출근길 비상
-
7
이광재 “우상호 돕겠다” 지선 불출마…禹 “어려운 결단 고마워”
-
8
美 군사작전 임박?…감시 항공기 ‘포세이돈’ 이란 인근서 관측
-
9
다카이치, 팔 통증에 생방송 30분전 취소…총선 앞 건강 변수 부상
-
10
비트코인, 9개월만에 7만 달러대로…연준 의장 워시 지명 영향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4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5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6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7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8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9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10
코스피 불장에도 실물경기 꽁꽁… ‘일자리 저수지’ 건설업 바닥
트렌드뉴스
-
1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2
홍석천 “부동산에 속아 2억에 넘긴 재개발 앞둔 집, 현재 30억”
-
3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4
“놓지마!” 애원에도…술 취해 어린아들 7층 창문에 매단 아버지
-
5
“까치발 들고 물 1.5L 마시기”…50대 매끈한 다리 어떻게? [바디플랜]
-
6
오늘 밤 서울 최대 10㎝ 눈폭탄…월요일 출근길 비상
-
7
이광재 “우상호 돕겠다” 지선 불출마…禹 “어려운 결단 고마워”
-
8
美 군사작전 임박?…감시 항공기 ‘포세이돈’ 이란 인근서 관측
-
9
다카이치, 팔 통증에 생방송 30분전 취소…총선 앞 건강 변수 부상
-
10
비트코인, 9개월만에 7만 달러대로…연준 의장 워시 지명 영향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4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5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6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7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8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9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10
코스피 불장에도 실물경기 꽁꽁… ‘일자리 저수지’ 건설업 바닥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무비카툰]'킬러들의 수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1/10/26/683690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