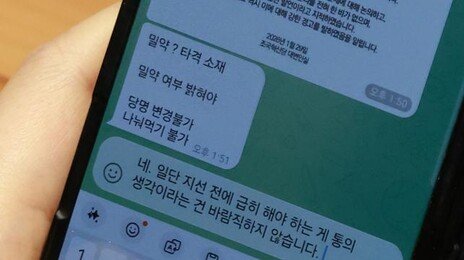공유하기
[책의 향기]이선영 새시집 '평범에 바치다' 펴내
-
입력 1999년 10월 29일 20시 54분
글자크기 설정
‘내 육신과 영혼은 다정하게 지내질 못한다/이를테면 이렇다/집 밖에는 왠지 행복하지 않는 나의 영혼이 있다/집 안에는 행복하길 간절히도 바라는 나의 육신이 있다/집 밖으로 보퉁이째 내몰린 내 영혼은 집 안에 있는 나의 육신을 목청껏 부르며 나오라 하지만 내 육신은 귀머거리다’ (내 육신과 영혼은)
왜 육신은 영혼의 부름에 응하지 않을까. ‘이미 나는 육신의 뜻을 좆아 나를 푹! 묻었다’는 현실에, 또는 아이와 ‘거처’가 주는 안온한 욕망에 편입돼 있으므로. 그러므로 안/팎은 다시금 나/그, 또는 새어나가려는 나/나를 잠그는 그로 변주된다.
‘나는 열쇠에 잠긴다/문에 잠기고/내게 없는 그에게 잠긴다/나에겐 나를 꼼꼼히 잠가주는 그가 있다/틈틈이 나를 잠가주는 것이 나날의 일과가 돼버린 그가 있고/그가 잠가주지 않으면 새나갈 것 같은 내가 있다’ (나에겐 그가 있다)
안/밖의 변주는 잠김, 혹은 가둠을 지나 종내 받아들임/받아들이지 못함의 통찰로 들어선다. 시인은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자아가 환원된다는, 혹은 특징을 이룬다는 놀라운 관계의 아이러니에 맞닥뜨리게 된다.
‘모든 색은 자신이 거부하는 색깔을 띤다/(중략)/장미의 붉은 색은/장미가 토해놓은 붉은색/(중략)/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색깔인가? /이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가두어둘 수만은 없는 뜨거움, 거북함, 치밀어오름이란’ (빌 아저씨의 과학이야기)
자신을 가두어두도록 놓아두지 않는 바깥 혹은 타자란 화해할 수 밖에 없는, 또는 화해를 꿈꿀 수 밖에 없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결국 시인은 ‘그리운 것은 늘 바깥에 있다’ (63빌딩에 갇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유윤종기자〉gustav@donga.com
트렌드뉴스
-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2
“어깨 아프면 약-주사 찾기보다 스트레칭부터”[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
3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4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5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6
日 소니마저 삼킨 中 TCL, 이젠 韓 프리미엄 시장 ‘정조준’
-
7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8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9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
10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3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4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5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6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7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8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
9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10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트렌드뉴스
-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2
“어깨 아프면 약-주사 찾기보다 스트레칭부터”[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
3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4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5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6
日 소니마저 삼킨 中 TCL, 이젠 韓 프리미엄 시장 ‘정조준’
-
7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8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9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
10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3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4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5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6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7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8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
9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10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