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를 건너다/요시다 슈이치 지음/이영미 옮김/548쪽·1만5000원·은행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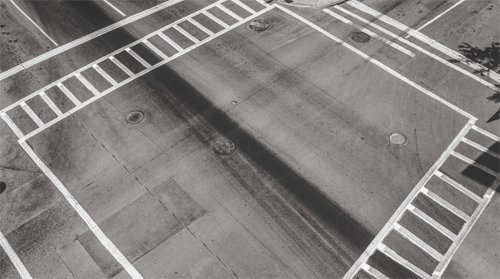

요시다 슈이치 글은 원래가 그랬다. 언제나 그리 쇼킹하거나 묵직하진 않다. 딱히 장르도 구분하기 어정쩡하다. 그럼에도 일단 재밌다. 맛깔스러운 데다 울림이 근사하다. 드디어 다다른 바닷가에 시원하게 발을 담근 기분이랄까. 뛰어들고픈 기대와 물러서고픈 주저가 동시에 뒤엉키는. 어느새 무릎 위까지 젖어가는지도 모른 채. ‘다리를…’도 역시나 그렇다.
이 소설은 일종의 옴니버스 형식이라 줄거리 설명이 애매하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4편으로 구성됐는데, 각자 전혀 다른 주인공과 이야기가 펼쳐진다.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처럼 어찌어찌 이어지는 끈은 있어도 남남이나 다름없다. 물론 2085년 미래를 그린 마지막 편에 가면 꽤나 질긴 실타래라는 게 드러나지만. 어쨌든 하나같이 그리 뚜렷하지도 희미하지도 않은 장삼이사(張三李四)다.
“문득 언제쯤이면 친구들의 죽음을 불의(不意)의 죽음이라고 여기지 않게 될까. …해를 거듭해 가면 주위에 죽음이 늘어간다. 죽음이 적은 동안은 불의의 죽음이고, 그것이 점점 많아지면 ‘뜻밖의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불의’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한 사람의 죽음은 불의지만, 만 명의 불의의 죽음은 없다고 친다면, 불의의 반대말은 ‘계획적’이나 ‘당연한’이라는 말이 되는 걸까.”
‘다리를…’은 딱 10년 전 작가가 “자신의 대표작”이라 불렀던 ‘악인(惡人·은행나무)’과 비교해봄 직하다. 등장인물은 예나 지금이나 비릿한 살냄새가 찐득하다. 웬만큼 이기적이고 치사하고 엉성한. 또 그만큼 괜찮은 구석도 지닌. 버스 유리창을 내다보는 기분이 그럴까. 무감하게 흘러가는 바깥 인생과 그걸 똑 닮은 차 안의 자신. 여전히 우연과 필연이 얽히고설키는 게 인생이다.
그런데 미묘한 변화도 뚜렷하다. ‘악인’ 속 삶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긴 해도 왠지 파도에 휩쓸린 모양새였다. 사회란 큰 물결이 배출한 쓰레기더미에 짓눌린 듯. ‘다리를…’도 도긴개긴이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힘을 지니며 무슨 결과를 가져올지 힘차게 파고든다. 작가가 2014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파키스탄 소녀 말랄라 유사프자이(당시 17세)를 자주 거론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그는 수상 이듬해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단다.
아마, 그걸 일깨워도, 세상은 또 머뭇거리거나 돌아설 때가 많을 게다. 평범한 우리네는 대체로 ‘다리’를 건너지 않으니까. 그러나 삶에서 매번 다리를 피한다면 결국엔 섬에 갇히거나 강에 빠지는 건 아닐는지. 그 또한 누군가에겐 선택이었겠지만. 다만 하나는 확실하다. ‘다리를…’은 한 권의 책이다. 이런들 저런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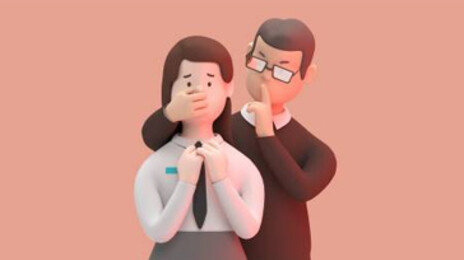
자기 반 여중생 간음·추행…30대 선생, 징역 6년 확정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알파벳, 깜짝 실적에 첫 배당까지…시간외 주가 12% 폭등[딥다이브]](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24665430.1.thumb.jpg)
알파벳, 깜짝 실적에 첫 배당까지…시간외 주가 12% 폭등[딥다이브]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확정…1000만원 받는다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