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 못할 말 한마디]김탁환(소설가)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뒤늦게 해군 장교로 입대하여 경남 진해로 내려갔다.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작문과 해양문학을 강의하는 것이 내게 부여된 새로운 임무였다. 오전 7시 45분,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연구실에 앉아 소설 습작을 시작했다. 단편 소설이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서울에 계신 양귀자 선생님께 팩스로 보냈다. 지금이라면 장편소설 원고를 파일에 담아 e메일로 간단히 띄웠겠지만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이었다. 소설이 담긴 긴 팩스 용지가 혹시 엉키지나 않을까 별별 걱정이 다 들었다.
처음에 선생님은 내 습작품에 대해 구체적인 말씀이 없으셨다. “또 써 봐.” 이게 전화기에서 들려온 목소리의 전부였다. 처음부터 빛나는 시를 쓰는 시인은 있지만, 처음부터 완성도 높은 소설을 쓰는 소설가는 없다고 했던가. 지금 생각해보면, 인물도 구성도 문체도 손볼 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품평 대신 침묵을 택하셨으리라.
단편 하나를 더 썼다. 막내 외삼촌에 관한 이야기였다.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은 경남 창원의 어느 야산에서 과수원을 했다. 그 과수원에는 앵두나무가 100여 그루 있었다. 6월이면 친척들이 과수원으로 몰려가서 주렁주렁 붉게 익은 앵두를 땄다. 아이들은 양손을 번갈아 뻗어 앵두를 한 움큼씩 쥐고 먹느라 바빴다.
서울에서 선생님을 뵈었다. 선생님은 웃으며 말씀하셨다.
“너만의 풍경을 문장으로 옮겼으니, 작가가 될 수 있겠다. 짜증을 내며 산길을 올라가던 아이가 산마루에서 붉게 물든 앵두나무를 발견하고 언제 힘들었냐는 듯이 달려가는 이 장면을 김탁환 아닌 누가 또 쓰겠니?”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다. 나는 제대한 후 소설가가 되었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연구실과 아침 습작과 팩스와 선생님의 격려가 없었다면, 나는 내 재능을 의심하다가 소설을 읽고 논하는 연구자의 길을 갔을지도 모른다.
각종 작법서들이 출간되고 있다. 소설을 업으로 삼기에, 나 역시 글쓰기에 관한 책을 두 권 펴냈다. 나는 줄곧 글을 쓰는 테크닉보다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독자들로부터 ‘태도’가 대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곤 한다. 그때마다 나는 수많은 풍경 중에서 자신만의 풍경을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신만의 문장으로 옮기고자 분투하는 것이라고 답한다. 물론 양귀자 선생님께 배운 것이다.
김탁환 소설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나훈아의 라스트 콘서트… ‘피케팅’ 전쟁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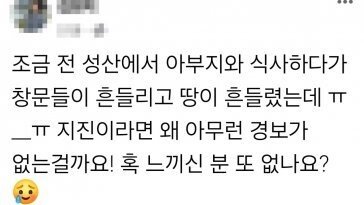
제주 동부지역 ‘땅 흔들림’ 신고 11건…‘지진경보’ 안울려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아들들 힘 싣기’ 나선 김승연 회장, 차남과 63빌딩 방문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말이 세상을 바꿉니다/잊지 못할 말 한마디]깨끗한 거절은 절반의 선물이다](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4/12/29/68805703.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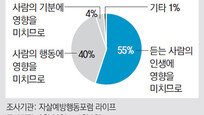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