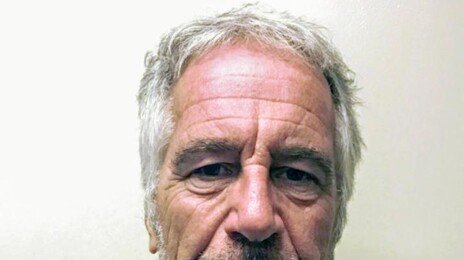공유하기
[우리사는 세상]반신불구 시인 이충기씨의 인생예찬
-
입력 1999년 3월 7일 19시 55분
글자크기 설정
사람들의 물결에 떠밀려
곧장 앞으로 나아간다
햇살은 검은 아스팔트 위에
유난히 빛나고
…
하마터면 내 처지를 잊고서
그들 속에 섞여
함께 걸어가고 싶었던
화창한 어느 봄날’》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16년동안 누워 살아온 이충기씨(46). 그가 병상에서 써온 시들이 최근 한권의 시집으로 출간됐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좋은날미디어)라는 제목으로.
이씨가 사고를 당한 것은 부산 부곡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83년 3월초. ‘호랑이선생’이라는 별명답게 호탕한 성격이었던 그는 친구들과 어울려 술 한잔을 하고 귀가하다 지하철공사장에서 굴러떨어졌다. 그리고 그의 인생도 무너져 내렸다.
이후 그는 ‘막대기’처럼 누워서만 지냈다. 산다기보다는 그저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해갈 뿐이었다. 오늘까지만, 아니 내일까지만…, 하면서 목숨을 끊어버리려 했던 적도 한두번이 아니다.
이씨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제자들이 보내오는 편지와 책을 읽는 것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친구가 한권의 시집 ‘산골소녀 옥진이’를 보내왔다.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놓인 산골소녀의 시를 읽고 그는 한없이 부끄러웠다.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엄지와 검지뿐. 두 손을 기도하듯 끌어모아 한자한자 써내려간 글은 그가 세상에 남기는 유서(遺書)와도 같았다.
그의 글은 94년 월간 ‘샘터’가 주최한 ‘오늘의 인간승리상’ 수기에도 당선됐다. 글쓰기는 어느덧 그에게 ‘생존의 이유’가 됐다.
그렇게 써내려간 시가 어느덧 3백여편. 그는 더이상 절망하지 않는다.
‘절망이 숨을 막히게 하여도/나는 이겨낼 수 있네/절망이 아무리 강해도/희망의 싹은 자라니까’라고 쓴다.
지난 십수년간 그는 주변의 도움만으로 살아왔다. 병상에 있는 동안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홀로 남겨진 그에게 몇년전 박안젤라(46)라는 천사같은 여인이 나타나 그를 보살피고 있다.
또 자기도 모르게 부산교대 동문들이 뜻을 모아 출판사를 물색해 그의 시들을 책으로 내놓았다.
그는 이제 말한다. “그동안 주변의 ‘베풂’만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들에게 저의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나눔’의 시를 쓰고 싶습니다.”
〈사천〓이철희기자〉klimt@donga.com
트렌드뉴스
-
1
[단독]폴란드, 韓 해군 최초 잠수함 ‘장보고함’ 무상 양도 안받기로
-
2
李, 분당 아파트 29억에 내놨다…“고점에 팔아 주식투자가 더 이득”
-
3
‘노인 냄새’ 씻으면 없어질까?…“목욕보다 식단이 더 중요”[노화설계]
-
4
‘연대생’ 졸리 아들, 이름서 아빠 성 ‘피트’ 뺐다
-
5
대구 찾은 한동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설것” 재보선 출마 시사
-
6
국힘서 멀어진 PK…민주 42% 국힘 25%, 지지율 격차 6년만에 최대
-
7
홍준표 “법왜곡죄, 박정희 국가원수 모독죄 신설과 다를 바 없어”
-
8
밥과 빵, 냉동했다가 데워먹으면 살 빠진다?[건강팩트체크]
-
9
4급 ‘마스가 과장’, 단숨에 2급 국장 파격 직행…“李대통령 OK”
-
10
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직 사의…사법개혁 반발 고조
-
1
‘똘똘한 한채’ 겨냥한 李…“투기용 1주택자, 매각이 낫게 만들것”
-
2
尹 계엄 직후보다 낮은 국힘 지지율… 중도층서 9%로 역대 최저
-
3
국힘서 멀어진 PK…민주 42% 국힘 25%, 지지율 격차 6년만에 최대
-
4
“정원오, 쓰레기 처리업체 후원 받고 357억 수의계약”
-
5
한동훈 “백의종군 하라? 그분들, 尹이 보수 망칠때 뭐했나”
-
6
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직 사의…사법개혁 반발 고조
-
7
[사설]계엄 때보다 낮은 지지율 17%… 국힘의 존재 이유를 묻는 민심
-
8
李, 분당 아파트 29억에 내놨다…“고점에 팔아 주식투자가 더 이득”
-
9
오늘 6시 이준석·전한길 토론…全측 “5시간 전에 경찰 출석해야”
-
10
‘17% 쇼크’ 국힘, TK도 등돌려 與와 동률…“바닥 뚫고 지하로 간 느낌”
트렌드뉴스
-
1
[단독]폴란드, 韓 해군 최초 잠수함 ‘장보고함’ 무상 양도 안받기로
-
2
李, 분당 아파트 29억에 내놨다…“고점에 팔아 주식투자가 더 이득”
-
3
‘노인 냄새’ 씻으면 없어질까?…“목욕보다 식단이 더 중요”[노화설계]
-
4
‘연대생’ 졸리 아들, 이름서 아빠 성 ‘피트’ 뺐다
-
5
대구 찾은 한동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설것” 재보선 출마 시사
-
6
국힘서 멀어진 PK…민주 42% 국힘 25%, 지지율 격차 6년만에 최대
-
7
홍준표 “법왜곡죄, 박정희 국가원수 모독죄 신설과 다를 바 없어”
-
8
밥과 빵, 냉동했다가 데워먹으면 살 빠진다?[건강팩트체크]
-
9
4급 ‘마스가 과장’, 단숨에 2급 국장 파격 직행…“李대통령 OK”
-
10
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직 사의…사법개혁 반발 고조
-
1
‘똘똘한 한채’ 겨냥한 李…“투기용 1주택자, 매각이 낫게 만들것”
-
2
尹 계엄 직후보다 낮은 국힘 지지율… 중도층서 9%로 역대 최저
-
3
국힘서 멀어진 PK…민주 42% 국힘 25%, 지지율 격차 6년만에 최대
-
4
“정원오, 쓰레기 처리업체 후원 받고 357억 수의계약”
-
5
한동훈 “백의종군 하라? 그분들, 尹이 보수 망칠때 뭐했나”
-
6
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직 사의…사법개혁 반발 고조
-
7
[사설]계엄 때보다 낮은 지지율 17%… 국힘의 존재 이유를 묻는 민심
-
8
李, 분당 아파트 29억에 내놨다…“고점에 팔아 주식투자가 더 이득”
-
9
오늘 6시 이준석·전한길 토론…全측 “5시간 전에 경찰 출석해야”
-
10
‘17% 쇼크’ 국힘, TK도 등돌려 與와 동률…“바닥 뚫고 지하로 간 느낌”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경제 캘린더]](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