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뒤통수에 눈 달린 ‘공포의 힐 패스’
-
입력 2006년 6월 22일 03시 06분
글자크기 설정

전반 31분 세르비아 진영 오른쪽으로 쇄도하던 아르헨티나의 에스테반 캄비아소가 왼쪽에서 날아온 크로스를 받아 앞에 있던 에르난 크레스포에게 전달했다. 왼발로 공을 멈춘 크레스포는 시선을 앞에 둔 채 순식간에 오른발 힐 패스(발꿈치를 이용한 패스)를 했고 공은 문전으로 달려 들어오던 캄비아소의 발에 정확하게 걸려들었다.
아르헨티나의 두 번째 골. 해설가로 깜짝 변신한 차두리 선수는 “마치 오락게임을 보는 것 같다”는 말로 놀라움을 대신했다.
월드컵 개막 직전 가나와의 평가전에서 1-3으로 진 한국은 상대의 힐 패스에 번번이 허를 찔렸다. 가나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며 한국을 괴롭혔다.
축구는 발로 하는 경기다.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온 정교한 손은 오직 골키퍼만 쓸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그 발이 손을 닮아간다.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킬 패스와 보지도 않고 척척 연결하는 노룩(No Look) 패스, 그리고 힐 패스는 마치 손으로 하는 농구를 떠올리게 한다.
농구국가대표 센터 출신인 김유택 엑스포츠 해설위원은 “농구에서 노룩 패스를 하려면 같은 팀 선수들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예측 능력이 발달해야 한다. 한 팀에 오래 있으면서 정해진 패턴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구 코트보다 훨씬 넓은 축구 경기장에서 손보다 부정확한 발로 노룩 패스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 쉽지 않은 일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힐 패스나 노룩 패스가 현대 축구의 전유물은 아니다. 프로축구 성남 일화의 김학범 감독은 “1990년대 브라질의 히바우두처럼 발재간이 뛰어난 남미 선수들에게서 주로 볼 수 있던 패스 방법”이라며 “국내 프로축구에서는 뭔가를 보여 주고 싶어 하는 용병들이 사용하곤 한다”고 전한다.
국내에서는 이회택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1970년대 선수 시절 ‘공포의 힐 패스’로 이름을 날렸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장외룡 감독은 “달려 들어가는 방향으로 공이 오지 않고 뒤로 왔을 때 순간적인 판단으로 힐 패스를 한다. 시야가 넓고 개인기가 좋아야 가능한 플레이”라고 말했다.
모든 스포츠는 진화한다. 종목을 막론하고 스포츠의 공격과 수비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기 마련. 압박이 점점 강해지는 축구에서 상대의 예상을 뒤엎는 패스 하나는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월드컵과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의 묘기 경연장에서야 더 말할 나위도 없다.
16강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독일 월드컵. 다음에는 어떤 선수가 묘기의 주인공이 될지 발끝뿐 아니라 발뒤꿈치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다.
이승건 기자 why@donga.com
트렌드뉴스
-
1
“유심칩 녹여 금 191g 얻었다”…온라인 달군 ‘현대판 연금술’
-
2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3
“중국 귀화해 메달 39개 바칠때 ‘먹튀’ 비난한 당신들은 뭘 했나”
-
4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5
‘마약밀수 총책’ 잡고보니 前 프로야구 선수
-
6
“얘기 하자하니 ‘감히 의원에게’ 반말” vs “먼저 ‘야 인마’ 도발”
-
7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8
V리그 역사에 이번 시즌 박정아보다 나쁜 공격수는 없었다 [발리볼 비키니]
-
9
“돈 좀 썼어” 성과급 1억 SK하이닉스 직원 ‘반전 자랑 글’
-
10
식후 커피는 국룰? 전문가들은 ‘손사래’…“문제는 타이밍”[건강팩트체크]
-
1
李 “다주택자 눈물? 마귀에 양심 뺏겼나…청년은 피눈물”
-
2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3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4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5
“얘기 하자하니 ‘감히 의원에게’ 반말” vs “먼저 ‘야 인마’ 도발”
-
6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李대통령 SNS 글 삭제
-
7
장동혁, 친한계 반발에 “수사결과 韓징계 잘못땐 책임지겠다”
-
8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
9
與 ‘5+1’ 서울시장 출마 러시… 국힘은 ‘강성 당원’ 변수
-
10
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트렌드뉴스
-
1
“유심칩 녹여 금 191g 얻었다”…온라인 달군 ‘현대판 연금술’
-
2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3
“중국 귀화해 메달 39개 바칠때 ‘먹튀’ 비난한 당신들은 뭘 했나”
-
4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5
‘마약밀수 총책’ 잡고보니 前 프로야구 선수
-
6
“얘기 하자하니 ‘감히 의원에게’ 반말” vs “먼저 ‘야 인마’ 도발”
-
7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8
V리그 역사에 이번 시즌 박정아보다 나쁜 공격수는 없었다 [발리볼 비키니]
-
9
“돈 좀 썼어” 성과급 1억 SK하이닉스 직원 ‘반전 자랑 글’
-
10
식후 커피는 국룰? 전문가들은 ‘손사래’…“문제는 타이밍”[건강팩트체크]
-
1
李 “다주택자 눈물? 마귀에 양심 뺏겼나…청년은 피눈물”
-
2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3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4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5
“얘기 하자하니 ‘감히 의원에게’ 반말” vs “먼저 ‘야 인마’ 도발”
-
6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李대통령 SNS 글 삭제
-
7
장동혁, 친한계 반발에 “수사결과 韓징계 잘못땐 책임지겠다”
-
8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
9
與 ‘5+1’ 서울시장 출마 러시… 국힘은 ‘강성 당원’ 변수
-
10
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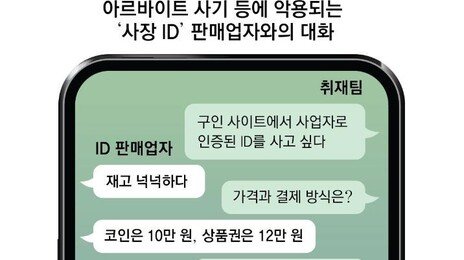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