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노동사목의 대부 도요안 신부 “나의 신앙은 음지의 이웃들”
-
입력 2006년 9월 28일 02시 51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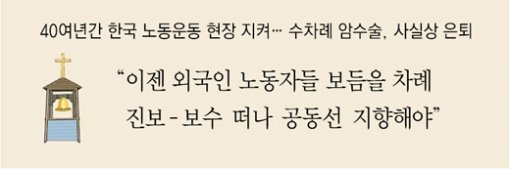
한국 가톨릭 노동사목의 ‘대부’로 알려진 도요안(69·사진) 신부. 1959년 미국 뉴저지 돈 보스코 신학대 학생이었던 벽안(碧眼)의 청년 존 F 트리솔리니 씨는 그해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한국 노동자들, 아니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영원한 친구인 ‘도요안’으로 거듭났다.
47년간 한국에서 서울대교구 가톨릭 노동청년회 지도신부→노동사목위원장→노동장년회 지도신부→노동사목회관 관장신부로 일하는 동안 그는 노동자들의 친구이자 동지요, 신앙의 사도였다.
1970년 전태일 분신자살사건, 1982년 원풍모방사건 등 노동운동의 역사를 바꾼 고비고비 마다 그는 현장에 있었다. 1960년대부터 농촌을 탈출한 젊은이들이 꿈을 찾아 서울로 서울로 무작정 상경하던 시절, 도 신부는 이들을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노동현장의 문제점을 체득했다. 국가주도형 개발논리에 희생됐던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그는 ‘푸른 눈의 해결사’였다.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지 노동자들의 눈을 틔워 주었다. 체불임금 사업주를 찾아가 담판을 짓고,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를 품에 안았다.
군사정권 시절 ‘반(反)정부 선교사’로 낙인찍혀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출입국관리소 대장에는 빨간 줄 두 개가 그어졌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땐 제가 죽일 놈이었지요.”
1970, 80년대 노동자들 사이에 ‘세상을 뒤집어엎자’는 혁명의 기운이 무르익을 무렵엔 오해도 많이 받았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신앙적 헌신과 사회 변혁 간에는 분명 넘기 힘든 간극이 있었다. “외국인이 우리의 현실을 아느냐”는 비아냥거림도 들었다.
1992년부터 그의 시선은 외국인 노동자와 진폐증 재가(在家)환자로 넘어간다. 노동운동의 자생력이 확보됐다고 판단한 도 신부는 ‘가난한 자들 중 더 가난한 사람’을 찾아 당시만 해도 우리 사회 관심권 밖의 영역이었던 외국인 노동자에게 초점을 맞춘다. 매년 추석과 설 서울 대학로 옆 동성고에서 열리는 ‘외국인 노동자 큰 잔치’ 행사도 그가 처음 시작했다.
그와 인연을 맺은 외국인 노동자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며칠 전 15년간 한국에 불법체류해 온 쿤단이라는 네팔 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화성보호소에 있다고… 추방당했을 텐데, 전화만 기다리고 있어요.” 도 신부의 얼굴에 근심이 스쳐간다.
인터뷰 자리에 배석한 허윤진 신부가 “하와(이브)를 만들려고…”라고 농담을 던지자 도 신부는 활짝 웃는다.
올 초에는 하나 남은 신장에 종양이 4개나 생겨 재수술을 했다. 요즘은 1주일에 2차례씩 투석을 한다. 한눈에 봐도 투석으로 인해 혈관이 부어오른 도 신부의 오른팔은 정상이 아니다.
“왜 노동사목을 시작했습니까”라고 묻자 “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미국에서 노동운동을 하셨고, 내가 소속된 살레시오 수도회는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지”라고 설명한다.
90세를 바라보는 노모는 미국에 생존해 있다. “전화를 걸면 ‘너 요즘 어디 있느냐’고 하셔. 한국에도 와보셨는데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신 모양이야.”
한국의 변화에 대해서도 물었다. “내가 왔을 때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었지. 많이 발전했지. 한국 사람들끼리 더 단결했으면 좋겠어. 진보든 보수든 공동선을 위해 노력해야 해.”
인터뷰가 끝난 뒤 도 신부는 기자가 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배웅했다. 문이 닫히고 ‘우웅’하는 기계음이 시작될 무렵, 엘리베이터 밖에서 그의 밭은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
트렌드뉴스
-
1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2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3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4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5
마운자로-러닝 열풍에 밀린 헬스장, 지난달에만 70곳 문닫아
-
6
“태국서 감금” 한밤중 걸려온 아들 전화…어머니 신고로 극적 구조
-
7
이광재 돌연 지선 불출마… 明心 실린 우상호 향해 “돕겠다”
-
8
0.24초의 기적…올림픽 직전 월드컵 우승 따낸 ‘배추 보이’ 이상호
-
9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10
‘역대급 실적’ 은행들, 성과급 최대 350%… 금요일 단축 근무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5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6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7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8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9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10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트렌드뉴스
-
1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2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3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4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5
마운자로-러닝 열풍에 밀린 헬스장, 지난달에만 70곳 문닫아
-
6
“태국서 감금” 한밤중 걸려온 아들 전화…어머니 신고로 극적 구조
-
7
이광재 돌연 지선 불출마… 明心 실린 우상호 향해 “돕겠다”
-
8
0.24초의 기적…올림픽 직전 월드컵 우승 따낸 ‘배추 보이’ 이상호
-
9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10
‘역대급 실적’ 은행들, 성과급 최대 350%… 금요일 단축 근무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5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6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7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8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9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10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