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와 문명/장 카스타레드 지음·이소영 옮김/352쪽·2만2000원·뜨인돌

드라마 ‘섹스 앤드 더 시티’ 주인공에게 어울릴 듯한 이 같은 모습은 기원전 그리스 여인들이 즐겨하던 몸치장을 나타낸 것이다. 인간의 치장 욕구가 오래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또 있다. 1882년 프랑스 브라상푸이에서 2만2000년 전 조각상 ‘두건을 쓴 부인’이 출토됐다. 이 조각상에서 부인이 쓴 두건은 생명을 유지하는 용도도, 자연의 위협에 맞서 자신을 보호하는 용도도 아니다. 그저 삶에 부수적인 ‘사치’를 부린 것이다. 이 책은 문명이 탄생한 이래 인간의 모든 행동에 사치가 함께했음을 보여준다. 프랑스 경제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저자는 기원 전후로 나눠 유럽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문화권 등에 새겨진 주요 문명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사치가 인류 문명을 얼마나 다채롭고 풍요롭게 했는지 분석한다. 여기서 사치란 물질적인 호화로움뿐 아니라 고차원적 정신, 문화·예술적 욕망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 책은 수메르 이집트 이슬람 히브리 그리스 로마 인도 등 주요 문명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사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사치의 발판은 부(富)다. 그렇지만 인간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지 않을 때도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사치를 추구했다. 이집트인들은 금접시에 진수성찬을 담아 먹으려 했고 여인들은 향수를 몸에 들이부었다. 늘 침략과 추방 등 시련을 겪었던 히브리인도 예루살렘을 세운 후 해상무역을 통해 큰돈을 벌자 사치부터 부리기 시작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부유한 히브리인들은 향기로운 실편백과 백목향 등 값비싼 목재로 거처를 꾸몄고 화려한 가구로 실내를 장식했다.
문명이 생긴 이래 사치를 정당화하는 쾌락주의자와 반대하는 금욕주의자는 늘 대립해왔다. 그러나 사치 없는 인류는 상상할 수 없다. 인간 본능 속에 꿈틀거리는 사치가 수많은 건축물과 예술품을 낳았고, 이를 통해 각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바빌론의 정원부터 이집트의 피라미드, 아테네의 판테온, 로마의 콜로세움, 인도의 타지마할, 프랑스의 베르사유궁 등도 결국 사치의 위대한 결과물이다.
그러나 책이 모든 사치를 변호하는 것은 아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 사치는 물질을 넘어서는 정신적 차원의 것”이라며 “오늘날 사치는 물질에 지나치게 경도돼 있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그러면서도 “2000년대 이후 우리는 화려함보다는 진정성과 가치에 의해 상품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사치 역시 양이 아닌 질적인 개념으로 돌아서면서 그 본질을 찾을 것”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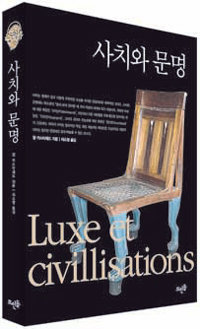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인문사회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고양이 눈
구독
-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구독
-

서영아의 100세 카페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與 “김정숙 여사, 인도 타지마할 방문은 혈세 관광…진상조사 필요”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광화문에서/장관석]UAE 대통령이 MB 자택을 찾았다는 것](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25224395.1.thumb.jpg)
[광화문에서/장관석]UAE 대통령이 MB 자택을 찾았다는 것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오늘과 내일/김윤종]‘연금 특검’ 필요하다는 미래세대](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25224392.1.thumb.jpg)
[오늘과 내일/김윤종]‘연금 특검’ 필요하다는 미래세대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책의 향기]“콩나물 팍팍 무쳤냐”… 국민 울고 웃긴 예능史](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8/02/10/88603498.1.jpg)
![[책의 향기]오랜 헌신이 고통으로… 가족 간병 사회의 비극](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8/02/10/88603452.1.jpg)
![[책의 향기]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결심했다, 용서하기로](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8/02/10/88603427.2.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