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정끝별, 김연수, 문태준, 나희덕, 권대웅, 박민규, 공선욱, 김인숙…. 23명의 문인이 전하는 삶의 이야기.
이들이 전하는 삶은 저마다 다르지만 희로애락을 비롯한 삶의 경험을 성찰하고 긍정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 공통점이 팍팍한 삶에 지친 현대인에게 공감을 주고 입가에 미소를 번지게 한다.
문태준 시인의 ‘나를 지킨다는 것’. 시인은 거북 두 마리를 애완동물로 샀다. 강아지와 기니피그를 사자는 아이들의 요구를 물리치고 협상한 결과다. 그렇게 집에 온 거북의 주름진 목까지 시인은 사랑하게 됐다.
아주 천천히 목의 주름을 접으며 “마치 주머니에 손을 넣듯” 목을 숨기는 거북. 시인은 “오그라드는 그 시간의 지속이 좋았고 천천히 발을 빼는 것 같은 완행의 속도가 좋았다”고 한다. 거북의 침묵과 느림을 사랑하게 된 시인은 “한가하고 욕심을 적게 부리며 기다릴 줄 알고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않으며 침묵을 즐기는 거북의 고아한 성품에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처세를 느꼈다”고 말했다.
소설가 김연수 씨의 ‘가끔은 한 번씩 쉬어 갑시다’에는 작가가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처의 버클리 다운타운에 머물다가 알게 된 노숙인과의 사연을 다룬다. 그 노숙인은 사람을 만나면 “어이, 친구”라고 실없이 웃는다. 밤낮으로 원고 쓰며 바삐 살아온 작가는 “인간이란 스스로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존재인데” 어찌 저리 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싶어졌다. 어느 날 작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도 구경하고 구름도 보고 노래도 따라 부르고 담배도 피웠다. 노동만이 신성한 것이 아니라 쉬어가는 것도 중요함을 깨닫는다.
20대의 마지막에 청춘은 끝났다며 한탄했던 소설가 박민규 씨는 되돌아보니 진정한 청춘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푸를 청, 봄 춘’). 먹고사는 화두로 지내온 젊은 날은 청춘이 아니었다. 봄이 뭔지도 모르는 늙은 에스키모가 “봄은 가버렸다”고 외쳐온 격이라고 작가는 자괴한다. 청춘은 “젊음과 무관한 삶의 특수한 지층”이며 “나이, 육체, 먹고사는 일과 무관한 저 연두의 새싹처럼 용감하고 무모하고 에너지가 충만한 어떤 것”이다. 작가는 생각을 바꿨다. 그리고 외친다, 청춘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정끝별 시인은 복지원 아이들과 산에 올랐다가 가슴이 아렸던 일을 회상한다(‘겨울 산행’). 시인은 다운증후군을 앓는 섭이와 함께 오르느라 장애 때문에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하는 열세 살 현이를 “어느 건실한 청년”에게 맡기면서 “현이 기저귀를 좀 올려 달라”고 부탁했다. 청년은 현이의 추리닝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기저귀를 올려줬다. 시인은 나중에 현이를 부축하다 놀랐다. 현이의 앞가슴이 뭉클했다. 현이도 여자인데, 시인은 자신이 도와야 했다고 자책한다. 어리석음에 얼굴까지 화끈거린다.
안도현 시인은 어린 시절 겨울에 콩나물과 김치, 시래기를 넣고 끓인 갱죽을 먹은 추억을 떠올리며 요즘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는 그 한순간만이라도 감사하며 씹고 마시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라고 말한다.(‘축복으로서의 음식’)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스타일
구독-

BreakFirst
구독
-

초대석
구독
-

임용한의 전쟁사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이철희 칼럼]반갑다, 윤석열의 외교 ‘동문서답’](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25025304.1.thumb.jpg)
[이철희 칼럼]반갑다, 윤석열의 외교 ‘동문서답’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20억 시세차익’ 서초구 아파트에 3만5000명 몰렸다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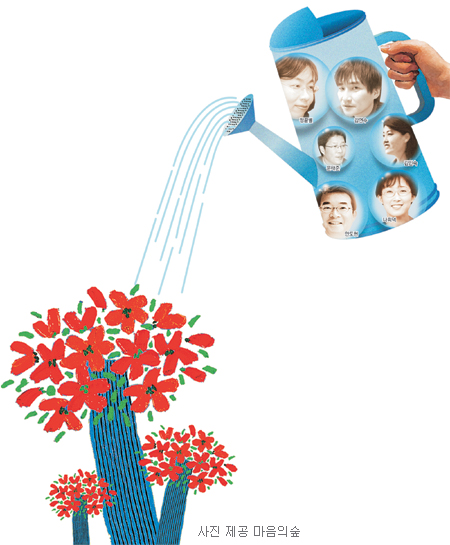
![[스타일]'비대칭형' 헤어컷…중성미가 찰랑 찰랑](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