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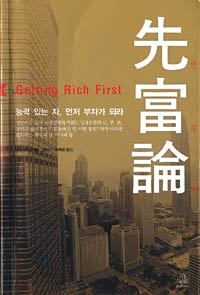
“그렇게 옛날에 왔단 말이에요?”
심지어 한 중국 남성은 “20년 전이면 중국이 이제 막 태어나기 시작한 때”라고 표현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문명권인 중국 사람들이 불과 20년 전을 그렇게 오래전이라고 표현하다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자가 20년 전 상하이에 갔을 때 좁고 낮은 주택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그 길을 자전거들이 여유롭게 달리고 있었다. 교통수단은 삐걱거리는 전차가 전부였고 유선전화도 사치품이던 시절이었다. 그런 그곳에 지금은 4000개의 고층빌딩이 빽빽이 들어섰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경기가 방영되는 지하철 여기저기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소리가 시끄럽다. 21세기 초 중국에서 살아본 사람이라면 중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얼마나 거센지 실감할 것이라고 말하는 저자. “인류 역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한 최대의 변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선부론(先富論). 믿기지 않는 급격한 변화의 기원. 마오쩌둥(毛澤東)의 문화혁명이 휩쓸고 간 폐허에서 1980년대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과 개방의 시대를 선포하며 외친 선언.
“전국 모든 지역, 모든 국민이 한꺼번에 다 부자가 될 수 없으니 국민, 국가 일부 지역만이라도 먼저 부자가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선부론으로 시작된 중국의 극적인 변화에서 기적과 희망을 찾는다. 문제는 찬양 일색이라는 점. 중국의 산업화가 낳은 일상생활의 변화, 그로 인해 드리운 그늘은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 책의 강점은 바로 그런 부분을 중국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비춘다는 것. 새로 생겨난 개념, 사라져 가는 역사, 10대들의 문화, 성의식의 변화, 빈부 격차, 문화 충격 등 중국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이 겪어야 하는 혼란을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공산당 동료를 상징하던 단어인 ‘동지’는 이제 게이나 레즈비언을 상징하는 단어. 과거 지탄의 대상이었던 ‘프티부르주아’적 삶은 이제 고급 잡지가 추천하는 품격의 상징이다.
중국 어느 도시에 화랑을 연 저자의 친구가 마르크스, 엥겔스의 초상화를 걸어뒀다. 지역 관리가 와서 말한다. “고위 관리가 첨단 국제도시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할 테니 떼버리시오.”
하루가 멀다 하고 재개발되는 세태에서 사라지는 전통 건축에 대한 안타까움도 배어난다. 베이징의 400년 된 전통 가옥에 사는 중국 노인은 자기 집 담벼락에 ‘허물어야 할 집’이라 쓰여 있는 걸 보고 망연자실한다. 오랜 세월의 소용돌이에서도 살아남았던 삶의 흔적이 도시 재개발로 사라질 운명을 맞았다. 노인은 집을 떠나야 하는 처지보다 역사와 유적을 아무렇지 않게 없애버리는 사람들의 심보가 밉다.
베이징 사람들은 식당에 저녁식사를 예약할 때 자리가 있는지 묻지 않고 식당 건물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지 확인한다. 저자는 이 얘기가 농담인 줄 알았다. 그런데 친구와 오랜만에 단골집을 찾았더니 식당 자리에 대형 건물이 들어섰다. 아쉬운 대로 길 건너 새로 생긴 대형 식당을 찾았다. 음식 맛이 좋아 몇 주 뒤에 다시 갔다. 이게 웬일인가. 건물은 사라지고 도시 건설 계획 예정이라는 표지판만 덩그러니 붙어있었다.
부의 장밋빛 환상 뒤 가난의 풍경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신흥 부자들이 호화로운 명품을 거둬들이는 시간에 파산한 국영기업 공장의 노동자 수백만 명이 해고당한 채 허드렛일을 찾는다.
1980년대 취직이 어려운 고학력 젊은이를 가리킨 ‘다이예칭녠’이란 말에는 ‘취직을 기다리는 젊은이’라는 희망 어린 뜻이 담겼다. 국영기업이 대량 해고를 감행하던 1990년대 해고자라는 신조어 ‘샤강’이 생겨났지만 ‘잠시 일을 내려놓은 사람’이라는, 여전히 희망 섞인 말이었다.
그러나 이제 해고자들에게 희망은 없다. 국가가 대신 책임져주지 않고 개인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시대로 바뀌었지만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그들을 국가는 내동댕이쳐 버렸다.
저자는 체제 변화 속에서 흔들리는 신념도 날카롭게 포착해 낸다. 상하이에는 공산당 창립을 기념하는 박물관 옆에 화려하고 사치스럽기 그지없는 레스토랑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마오쩌둥이 살아 있다면 인민의 생활수준이 이토록 향상된 것에 기뻐할 것”이라며 “경제 발전이 사회주의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호화로운 것은 수수하고 단순한 공산당의 기본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한탄한다. 신념의 혼란, 정치적 허무감에 빠진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모습도 눈에 뜨인다.
이 책은 중국의 변화를 눈에 선할 정도로 생생하게 보여 준다. 1986년 중국에 유학 온 뒤 BBC 특파원으로 활동한 저자가 중국 전역을 발로 뛰어다니며 사람들의 속내를 직접 들은 덕분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북카페
구독-

글로벌 이슈
구독
-

조건희의 복지의 조건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의사·법조인·셀럽”…직업 심사 후 입주민 받는 강남 초고가 아파트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푸바오에 집착 말라던 홍준표 “대구에 판다 오도록 中과 협의할 것”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SNS에 호화생활 과시 요식업체 사장…직원 월급은 15억 체불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북카페]'식물은 살아남기' 펴낸 이성규 박사](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