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소설]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153>卷三. 覇王의 길
-
입력 2004년 5월 16일 17시 05분
글자크기 설정

“제가 장수를 보내 함곡관을 지키게 한 것도 다른 도적 떼가 드나드는 걸 막아 뜻밖의 변고를 피하기 위함이었을 뿐, 딴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상장군께서 이곳에 이르시기를 손꼽아 기다려 온 제가 어찌 감히 상장군을 거역하고 맞서려 했겠습니까? 원컨대 공께서는 제가 감히 배은망덕하지 않았음을 상장군께 잘 말해 주십시오.”
장량이 듣기에는 능청스럽기 짝이 없는 거짓말이요 둘러대기였고, 항백도 그런 패공의 말을 다 믿는 눈치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전보다 더 패공을 얕보거나 싫어하게 된 것 같지는 않았다. 오히려 패공의 독특한 설득력에 이끌렸는지 항백이 스스로 머리를 짜내 패공에게 권했다.
“비록 조카와 아재비 사이라고는 하나 제 말만으로는 항우의 마음을 돌려놓기 어려울 것이니, 패공께서도 나서주셔야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내일 몸소 우리 진채로 오시어 상장군에게 사죄 드리지 않으시면 잘못 꼬인 일을 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패공의 독특한 설득력이란, 곁에서 보는 사람이 답답하고 안타까워 스스로 돕고 나서도록 만드는 힘이었다. 이렇게 일이 꼬여버릴 수도 있는가. 사람이 저렇게 무력할 수 있는가. 위태롭고도 안됐구나―대개 그런 심경을 거쳐 마침내는 도와 줘야겠다, 내가 돕지 않으면 이 사람은 끝장나고 만다 하는 식으로.
“좋습니다. 그리하지요. 내일 아침 반드시 상장군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백의 심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패공이 그렇게 선선히 그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이에 항백은 온 길을 되짚어 그 밤 다시 홍문에 있는 항우의 진채로 돌아갔다.
항백이 항우의 군막을 찾아가니 다음날 큰 싸움을 앞두어서 그런지 항우는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고 있었다. 항백은 장량을 만나러 갔던 일을 털어놓고 다음날 사죄하러 오겠다는 패공의 뜻을 전했다. 이미 패공을 죽이기로 작정한 항우는 쉽게 마음을 돌리려 하지 않았다. 항백이 더욱 간곡하게 조카를 달랬다.
“패공이 먼저 관중을 쳐부수어 진나라의 힘을 흩어놓지 않았다면 상장군이 어찌 이리 쉽게 관내(關內)로 들어올 수 있었겠는가? 이제 그가 큰 공을 세웠는데도 힘으로 쳐부순다면 이는 의롭지 못한 일이네. 좋게 그를 맞아들임만 못할걸세. 부디 이 아재비의 말을 새겨 들어주게.”
그러자 항우도 마침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패공을 만나볼 뜻을 슬며시 밝혔다.
하지만 일은 그걸로 모두 풀린 게 아니었다. 항백이 돌아가자 항우 주변에 풀어놓은 군사들로부터 그 소문을 들은 범증이 다시 항우의 군막으로 달려왔다.
“상장군께서 패공의 사죄를 받아들이시겠다고 하셨다는데 정말이십니까?”
범증이 항우를 보고 따지듯 물었다. 이미 항백의 말에 반나마 마음이 기울어진 항우가 떨떠름한 얼굴로 말했다.
“우리가 너무 한쪽 말만 듣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소. 내일 만나보고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오.”
글 이문열
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 >
-

따만사
구독
-

이용재의 식사의 窓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소설]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卷三. 覇王의 길](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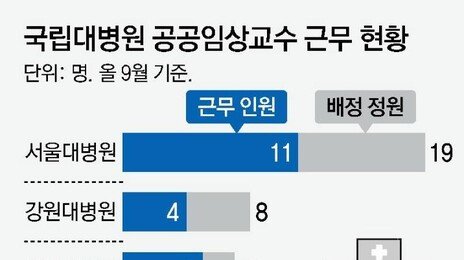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