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박재은의 이야기가 있는 요리]식습관속 문화- 사회 -개성
-
입력 2003년 3월 27일 17시 36분
글자크기 설정

우선 가까이 있는 한중일 세 나라 모두 ‘밥’을 주식으로 삼지만 먹는 법이 다르다. 평평한 수저를 이용해 밥과 국을 오가는 우리에 비해 일본이나 중국은 왼손에 밥그릇, 오른손에 젓가락을 들고 먹는다. 자연히 밥의 이동이 쉽고 본 요리나 반찬을 덜 때에도 밥공기가 요리접시 옆으로 다가간다. 질척한 요리라도 흘리지 않고 밥공기에 담아 가져올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밥그릇을 상에서 들면 무식하다고 핀잔을 듣는다. 밥상 저 편에서 내 앞의 밥공기까지 손수 와야하는 우리의 일상식들은 그리하여 잡채, 전, 너비아니처럼 국물이 흐르지 않는 것들이 많은 비율을 이룬다. 물기가 많지않은 요리들에 목이 마르기 마련이고 이 때를 위해 우리는 항시 국을 밥그릇 곁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식의 국제화가 더뎌지기도 했다고 본다. 마른 목을 와인으로 축이는 서양인들에게는 ‘국 문화’가 어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런 한식 문화를 ‘쌈문화’라고도 한다. 한중일 세 나라 중 유일하게 쌈을 싸 먹는 우리. 그것은 바로 왼손이 자유로웠기 때문이고 모든 게 한 상에 차려지다 보니 식어가는 음식을 쌈이란 형태로 커버했다는 얘기다.
저녁식사가 ‘밥 먹는’ 차원을 넘어 사교의 중심이 되는 서양의 식문화에서는 식전주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 본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혈색을 좋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다. 대표적인 식전주 가운데 캄파리(Campari)라는 술이 있다. 강한 오렌지향이 쌉쌀한 이 술은 주로 지중해성 기후의 지역에서 마신다. 나른해지던 몸이 높은 알코올 도수의 오렌지향을 느끼며 깨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프랑스 내에서 캄파리를 주문한다해도 남부의 칸에서는 멋쟁이로, 건조하고 서늘한 파리에서는 어설픈 관광객으로 보이게 된다. 환경에 의해 생긴 습관의 차이다.
프랑스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프랑스인을 식사에 초대했다면 수프에 공들이지 말자. 오븐에 정성들여 구운 음식을 선호하는 이들은 국물로 그릇을 채운 음식은 뭔가 섭섭하다고 느낀다니까. 예를 들어 아스파라거스 수프에 새우를 띄워내기보다는 충실한 재료 그대로를 버터에 지져서 소금간만 하는 요리가 훨씬 대접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식습관을 보면 그 사회가 보인다. 한식의 경우 주방에서 음식이 나올 때는 이미 모든 간맞춤이 끝난 상태로 개개인은 조리자의 입맛에 따라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극히 공동체적인 관습이다. 반면 서양의 테이블에는 소금과 후추통이 구비되어 있다. 주방에서는 최소한의 간만 맞춘 후 개인의 입맛에 따라 나머지 간은 테이블에서 ‘알아서’ 조절하는 것이다. 무의식 중에 드러나는 ‘개인주의’적 식습관은 이렇게 소리없이 반복되어 왔다. 모든 간을 맞추어 일방적으로 나눠주는 밥상에서는 어지간한 맛이 보장되고, 개개인이 조절해야 하는 밥상은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
얌전하게 생긴 일본 친구와 국수를 먹으러 간 적이 있다. 걸음걸이조차 소리없이 얌전한 그녀는 그러나 국수그릇을 딱 잡자마자 후루룩 후루룩 거친 매너로 한그릇을 비우는 것이었다. 일본에서는 소리내어 국수를 먹어 줘야지만 ‘맛있네요’라는 의사표시가 된다고 한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기에 능한 일본문화에 어울리는 식습관이다.
생각나는 대로 이곳 저곳의 식습관을 짚다보니 오늘의 요리할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다. 위의 예로 등장한 아스파라거스 새우요리를 한국인의 습관대로 ‘빨리빨리’ 진행해보자.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한 야채인 아스파라거스. 그 푸른 색감과 독특한 향은 서구 사회에서 우리 식의 ‘봄나물’처럼 불리는 대표적인 봄 음식이다. 비타민 C의 보고인 이 야채는 살짝 데친 후 믹서에 갈아주어 새우 머리로 우린 맑은 육수와 섞어서 수프를 만들 수 있다. 같은 재료를 이용해 좀 더 든든해 보이는 요리를 만들 수도 있다. 우선 아스파라거스를 버터에 지진다. 그 다음 백포도주를 살짝 붓고 1,2분간 뚜껑을 덮어두어 부드럽게 숨을 죽이면 야채의 향은 최고로 살아나게 된다. 새우는 횡으로 갈라서 펼친 후 데리야키 소스를 발라가며 굽는다. 간단한 퓨전 요리가 된다. 우리 습관대로 한 곁에 밥을 얹어 시원한 김치와 먹어도 좋고, 프랑스인처럼 빵조각과 향긋한 백포도주와 함께 해도 봄햇살과 잘 어울린다.
몸에 배어버린 기억은 쉽사리 고칠 수가 없기에 흔히들 여든까지 간다고 한다. 윤회를 믿는 나는 지금의 내 모습 중 어느 정도는 전생으로부터 이어져온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끼니마다 반주를 곁들이는 나를, 식구들의 식사가 완벽해야 수저를 드시는 어머니를, 갓 지은 밥에만 손을 대시는 아버지를, 그리고 오이만 보면 건져내는 남동생을 서로가 알아볼 수 있다면 좋겠다.
▼아스파라거스와 새우요리▼

아스파라거스 200g, 버터 50g,
양파 1/3개, 백포도주 3∼4큰술,
중하 6∼8마리, 양념(간장 3큰술,
청주나 조미술 2큰술, 설탕 2큰술,
물엿 1큰술)
1. 매우 잘게 다진 양파를 버터에 볶는다.
2. 1의 양파향이 퍼지기 시작하면 깨끗이
씻은 아스파라거스를 넣고 동시에
소금을약간 뿌려 익힌다.
3. 2의 팬바닥이 메말라갈 때 포도주를
넣고 뚜껑을 닫는다.
4. 3의 수증기에 아스파라거스가
부드러워지면 불에서 내린다.
5. 새우는 깨끗이 다듬어 길이로 칼집을
낸 후 날개처럼 펼쳐준다.
6. 양념재료 중 물엿만 빼고 한데 섞어
양념을 만든다.
7. 6의 양념을 5의 새우에 발라서
바짝 굽는다.
8. 새우가 익으면 다시 물엿을 얇게
덧발라서 윤이 나게 굽는다.
박재은 파티플래너·요리연구가
박재은의 이야기가 있는 요리 >
-

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구독
-

내가 만난 명문장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트렌드뉴스
-
1
이혜훈 낙마, 與 입장 전달 전 李가 먼저 결심했다
-
2
이준석 “한동훈 사과는 일본식 사과, 장동혁 단식은 정치 기술”
-
3
[단독]신천지 국힘 가입 ‘과천·의왕’ 집중…교단 성지 민원 노린 듯
-
4
탈원전 유턴…李정부, 신규 원전 계획대로 짓는다
-
5
‘얼음폭풍’ 美전역 강타…22개주 비상사태-100만가구 정전
-
6
‘더 글로리’ 차주영 활동 중단…“반복적 코피, 수술 미루기 어려워”
-
7
운동권 1세대서 7선 의원-책임총리까지… 민주당 킹메이커
-
8
장동혁, 나흘만에 퇴원…“당무 조속 복귀 의지”
-
9
“전격 숙청된 중국군 2인자 장유샤, 핵무기 정보 美 유출 혐의”
-
10
라면 먹고도 후회 안 하는 7가지 방법[노화설계]
-
1
‘민주 킹메이커’ 이해찬 전 총리 별세…7선 무패-책임 총리까지
-
2
“한동훈에 극형 안돼” “빨리 정리한뒤 지선준비”…갈라진 국힘
-
3
李 “팔때보다 세금 비싸도 들고 버틸까”… 하루 4차례 집값 메시지
-
4
탈원전 유턴…李정부, 신규 원전 계획대로 짓는다
-
5
운동권 1세대서 7선 의원-책임총리…‘민주당 킹메이커’ 이해찬 별세
-
6
이혜훈 낙마, 與 입장 전달 전 李가 먼저 결심했다
-
7
운동권 1세대서 7선 의원-책임총리까지… 민주당 킹메이커
-
8
李, 이혜훈 지명 철회…“국민 눈높이 부합 못해”
-
9
이준석 “한동훈 사과는 일본식 사과, 장동혁 단식은 정치 기술”
-
10
한동훈 제명 두고 국힘 ‘폭풍전야’…장동혁 복귀후 직접 마무리할 듯
트렌드뉴스
-
1
이혜훈 낙마, 與 입장 전달 전 李가 먼저 결심했다
-
2
이준석 “한동훈 사과는 일본식 사과, 장동혁 단식은 정치 기술”
-
3
[단독]신천지 국힘 가입 ‘과천·의왕’ 집중…교단 성지 민원 노린 듯
-
4
탈원전 유턴…李정부, 신규 원전 계획대로 짓는다
-
5
‘얼음폭풍’ 美전역 강타…22개주 비상사태-100만가구 정전
-
6
‘더 글로리’ 차주영 활동 중단…“반복적 코피, 수술 미루기 어려워”
-
7
운동권 1세대서 7선 의원-책임총리까지… 민주당 킹메이커
-
8
장동혁, 나흘만에 퇴원…“당무 조속 복귀 의지”
-
9
“전격 숙청된 중국군 2인자 장유샤, 핵무기 정보 美 유출 혐의”
-
10
라면 먹고도 후회 안 하는 7가지 방법[노화설계]
-
1
‘민주 킹메이커’ 이해찬 전 총리 별세…7선 무패-책임 총리까지
-
2
“한동훈에 극형 안돼” “빨리 정리한뒤 지선준비”…갈라진 국힘
-
3
李 “팔때보다 세금 비싸도 들고 버틸까”… 하루 4차례 집값 메시지
-
4
탈원전 유턴…李정부, 신규 원전 계획대로 짓는다
-
5
운동권 1세대서 7선 의원-책임총리…‘민주당 킹메이커’ 이해찬 별세
-
6
이혜훈 낙마, 與 입장 전달 전 李가 먼저 결심했다
-
7
운동권 1세대서 7선 의원-책임총리까지… 민주당 킹메이커
-
8
李, 이혜훈 지명 철회…“국민 눈높이 부합 못해”
-
9
이준석 “한동훈 사과는 일본식 사과, 장동혁 단식은 정치 기술”
-
10
한동훈 제명 두고 국힘 ‘폭풍전야’…장동혁 복귀후 직접 마무리할 듯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박재은의 이야기가 있는 요리]감자 샌드위치](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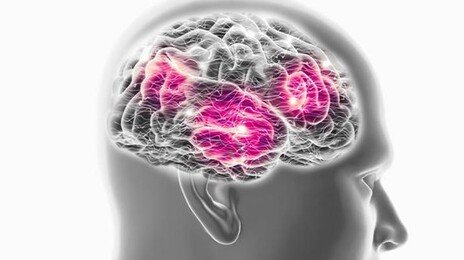
![“추울수록 맛있어” 면역력 쑥 올리는 영양사 픽 ○○ [알쓸톡]](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194648.3.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