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기차게 황우석 교수의 연구윤리를 문제 삼았던 사람들은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번 기회에 과학기술 윤리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자고 말하면서 말이다. “표준이 저기 있는데 왜 그 표준을 못 따라가느냐”고 비난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대중은 문제를 지적한 사람들 편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반성문을 써야 할 것 같은 편에 서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두 맹목적 애국주의, 과학기술 만능주의, 나아가 ‘마법’과 ‘집단 광기’에 빠져 이성적 판단을 저버린 것일까.
필자는 이번 사건이 인문주의자들이 눈앞의 이익에 집착한 과학기술자 혹은 무지한 대중을 꾸짖는 구도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더욱 섭섭한 것은 그동안 그 누구보다 과학기술의 사회성을 강조해 온 인문학자들이 왜 이번만큼은 그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해 논의할 생각조차 하지 않느냐는 점이다. 그 기준이 어떻게 형성돼 왔으며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의 과학문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표준이 어째서 글로벌한 것인지, 그리고 ‘사이언스’와 ‘네이처’가 왜 이 문제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지 등을 묻고 고민하는 사람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우리네 ‘금 모으기’ 문화에 어리둥절해하는 서양의 개인주의 잣대가 왜 ‘글로벌’인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또한 동서양의 사고방식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사랑만 움직이는 게 아니다. 윤리기준도 움직인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다. 인공수정을 통한 출산이 처음 시술됐을 때 많은 사람이 말세를 운운했으나 지금은 합법화된 지 오래다. 동물의 감정과 지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동물의 권리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 요즘 제기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과학기술과 윤리는 함께 성장해 왔다. 인간 복제도 틀림없이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또한 머지않아 뇌 과학이 성숙하면 뇌 정보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토론할 것이고, 로봇공학이 만개하면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로봇윤리학을 정식으로 배우게 될 것이다.
과학기술, 사회 그리고 윤리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잘 아는 인문학자들이 더는 상식적인 논평만 반복해선 곤란하다. ‘감시하는 윤리학자, 감시당하는 과학기술자’라는 구도는 과학기술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이분법이다.
물론 황 교수팀은 처음부터 게임의 규칙을 ‘넘치도록’ 지켰어야 했다. 아슬아슬한 턱걸이로는 세계적 과학기술 문화를 선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윤리적 실험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을 어떻게 ‘글로벌하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생명과학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 이와 관련해서는 그 수준에 걸맞은 인문학적 담론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번 사태의 진정한 메시지는 지금과 같은 과학과 인문의 대립이 아니라 그 둘의 공생적 협력에 있다. 그래야 우리의 인문학적 수준도 진정으로 글로벌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장대익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학부 대우교수
과학세상
구독-

글로벌 현장을 가다
구독
-

김창일의 갯마을 탐구
구독
-

사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한국 가장 강했다” 주저앉아 오열한 中골키퍼…손흥민이 안아줬다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의장-법사위장’ 꿰찬 野, ‘상임위→법사위→본회의’ 하루에도 가능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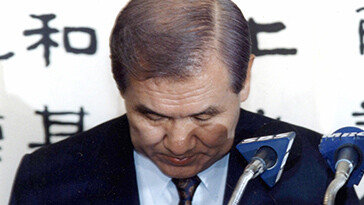
“노태우 300억 불법자금일것… 딸에게 주는 것이 정의인가”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과학세상/배종수]구구단 5단부터 외우게 한 선생님](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