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돈이 관계를 바꾼다]<上>부모와 자식
-
입력 2006년 12월 22일 03시 01분
글자크기 설정

有錢有孝 無錢無孝… 부모의 권위도 지갑에서?
모처럼 아들네 가족이 들르기로 한 토요일 오후 정년퇴직한 남편과 단둘이 사는 이모(61·경기 용인시 죽전동) 씨는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얼마 전 여고 동창모임에서 친구가 한 말이 생각났기 때문.
“난 며느리 올 때 지갑에 돈이 없으면 빳빳한 종이라도 넣어둬. 그래야 며느리가 말을 듣는 척이라도 하지. 너희들도 보석함에 진짜 보석이 없거들랑 돌멩이라도 가득 채워 둬. 묵직하게 뭔가 들어 있다고 느끼게 말이야.”
물론 농담이 섞인 말이지만 효(孝)에도 자본의 논리가 끼어들고 있는 세태를 느끼게 한다. 돈이 있어야 효도도 받는다는 현실이 ‘효의 실용주의’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쓴 입맛을 다시게 된다.
‘유전유효, 무전무효(有錢有孝 無錢無孝)’는 일부 돈 있는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집안 대소사에는 돈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며느리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할머니 강모(63·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주변에서 며느리가 아이를 낳은 뒤 출산 장려금을 주었다는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들어온 터였다. 며느리에게 비록 장려금까지는 주지 못해도 축하금은 주어야 할 터인데 돈이 넉넉지 않아 걱정이다.
“젊은 사람들이 애를 하도 안 낳으니까 부모들이 출산 장려금을 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 문제가 되니 슬금슬금 눈치가 보이고 얼마를 줘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
돈은커녕 ‘수고했다’는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도 눈물이 핑 돌던 시절을 살았던 강 씨는 “어쩌다 이런 세태가 되었는지 한심하다. 그래도 부모 대접을 받으려면 며느리에게 남들하고 비슷하게는 해야 할 것 아니냐”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강 씨처럼 자식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돈이 최선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기성세대가 적지 않다.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 사는 권모(67·여) 씨는 “애들 출가시키고 집을 줄여 이사 갔다가 다시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친구들을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했다”면서 “좁은 집에 살면 자식들이 들러도 불편해하고 손자들도 ‘할머니네 가난해?’라고 묻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엔 집도 차도 자식들 것보다 커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면서 “나도 다시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까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정경숙(가명·60·서울 송파구 거여동) 씨는 “늙으면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돈 없고 건강하면 그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겠다는 생각이다. 몸은 멀쩡해 돌아다녀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얼마나 초라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자식들도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건 매한가지다.
주부 박모(38) 씨는 친정에 가면 올케와 함께 설거지를 도맡아 하는 신세. 언니 2명이 모두 잘살아 부모님께 ‘뻐근한’ 선물을 챙겨 오면 눈치가 보인다.
박 씨는 “나에게 대놓고 뭐라 하는 사람은 없지만 몸으로라도 때워야겠다는 생각에 팔을 걷어붙이게 된다”며 “자식도 부모한테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지 않으려면 돈이 필요한 거 같다”고 말했다.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모를 만난 자식들은 은근한 기대를 했다가 서운해하기도 한다. 맞벌이 주부 차모(35·서울 도봉구 창동) 씨는 “집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애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는 게 힘들어 미리 유산을 주시면 얼마나 고마울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요즘 시부모님들이 너무 약으셔서(?) 찔끔찔끔 도와주시지 큰돈은 절대 안 주시니 서운한 때도 있다”고 고백했다.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PB) A 지점장은 “고객 중 재산 상황을 자식이나 아내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고 오로지 프라이빗 뱅커에게만 털어놓는 분이 꽤 있다”며 “요즘엔 세금 때문에 자식에게 증여하는 분도 많은데 재산을 자식에게 ‘안기는’ 게 아니라 여유 부동산을 세놓아 월세를 생활비 조로 자식에게 줘 자식을 휘어잡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박완정 사외기자 tyra21@naver.com
▼ 욕망의 노예가 된 한국인… 혈연관계조차 ‘돈生돈死’▼
요즘 노인 세대들은 감각적인 삶을 지향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즐긴다. 신세대 노인층은 이른바 통크(two only, no kids)족이다. 자녀들을 분가시킨 부부 단독 가구들이 자기들만의 삶을 즐긴다.
이런 분위기는 전 세대로 확산되는 추세다. 동덕여대 한국여성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남녀 2767명 가운데 12.2%가 ‘자녀를 낳을 필요는 없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37.4%가 ‘부부만의 애정으로 충분하다’고 대답했다.
혈연관계보다 강력한 공동체 단위는 없다. 하지만 돈은 강력한 혈연관계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돈을 우위로 한 가치관의 밑바닥에는 거리낌 없이 겉으로 드러내는 인간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
1980, 90년대를 거치면서 진행된 ‘민주화’나 ‘세계화’가 이런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과거에는 권력이나 권위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가치였지만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자리 잡았다. 또 금융위기 이후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명분이나 체면을 초월한 실용주의화가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가족 구성원 사이의 수직적인 상하 관계도 무너지면서 행동 기준이 실용주의로 바뀌기 시작했다. 한국인이 체면, 명분, 공동체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내면에 잠재해 있던 욕망을 무장해제한 것이다.
최근 ‘대한민국, 욕망의 지도’라는 책을 통해 한국인이 스스로 욕망을 가진 존재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고 욕망을 표현하는 데 거리낌이 없어졌다고 진단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욕망에 충실해졌다. 한국인은 이제 욕망하는 인간이란 의미의 ‘호모 데시데로(Homo Desidero)’로 거듭난 것이다.
이제 욕망의 실현수단인 돈이 종종 혈연의 정리마저 넘어서는 일이 생기게 됐다. 과거에는 내면에 돈에 대한 욕망이 있더라도 체면이나 공동체 의식 때문에 내놓고 표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욕망에 솔직해졌고, 돈의 가치가 부모 자식 간의 혈연관계조차 실용주의적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이런 실용주의의 결론은 돈에 의한 타락이 될 것인가. 그럴 여지도 있지만 가족 간의 ‘기대 수준’을 서로 낮춤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될 것이다. 앞으로 가족은 혈연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기대하거나 감당하지 않으며, 돈에 대한 채무·권리 의식이 줄어드는 관계로 변모되어 갈 것이다.
김경훈 한국트렌드연구소장
트렌드뉴스
-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2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3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4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5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6
日 소니마저 삼킨 中 TCL, 이젠 韓 프리미엄 시장 ‘정조준’
-
7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
8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9
호주오픈 결승은 알카라스 대 조코비치…누가 이겨도 ‘대기록’
-
10
[동아광장/박용]이혜훈 가족의 엇나간 ‘대한민국 사용설명서’
-
1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2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3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4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5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6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7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8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9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10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트렌드뉴스
-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2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3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4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5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6
日 소니마저 삼킨 中 TCL, 이젠 韓 프리미엄 시장 ‘정조준’
-
7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
8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9
호주오픈 결승은 알카라스 대 조코비치…누가 이겨도 ‘대기록’
-
10
[동아광장/박용]이혜훈 가족의 엇나간 ‘대한민국 사용설명서’
-
1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2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3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4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5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6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7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8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9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10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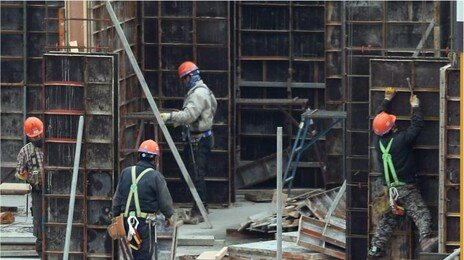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