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인문사회]영혼의 허기가 부른 불치병 ‘수집’
-
입력 2006년 1월 28일 03시 01분
글자크기 설정

‘비쩍 마른 작은 물건 한 점! 점잖게 말하자면 미라 상태로 보존된 근육 한 점! 사후에 시신에서 잘라낸 것!’
1969년 10월 29일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회사에 진귀한 품목이 선보였다. 이름 하여 ‘비냘리의 저명한 나폴레옹 유골 수집품’.
이 위대한 인물의 가장 은밀한 부위는 10파운드에 경매가 시작돼 1만4000파운드에 낙찰되었다. 입찰자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온 브라이언 기멜슨. 그가 나폴레옹의 물건(?)을 사려 한 이유는 자기 아내의 이름이 조세핀이었기 때문이라고.
유골 수집은 중세 때 절정에 달했다. 예수가 최후를 맞이한 거룩한 십자가와 그의 몸에 박힌 못은 물론이고, 성모마리아의 젖도 널리 거래되었다. 예수의 포피(包皮·살가죽)는 여러 곳에서 발견돼 유통된다. 가짜가 무수히 등장했고 진위 논쟁이 숱하게 벌어졌다.
이 책은 수집, 그 기묘하고 아름다운 강박의 세계로 독자를 인도한다.
 |
중세의 유골 수집가에서 오늘날 키치 수집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소장품과 그 내밀한 개인사를 소개하며 이들 물건에 담긴 시대의 풍경과 사상을 추적한다. 미시사적인 동시에 거시사적 문화사다.
사람들은 물건만 수집했던 것은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담기 위해 ‘기억의 극장’을 설계했던 카밀로, 숱한 여인과 애정행각을 벌였던 카사노바, 전 세계에 오페라 공연을 후원하며 “이것은 내 오페라!”라고 외쳤던 빌라…. 그들 역시 수집가였다.
저자는 수집 행위 이면에 도사린 인간 심리를 읽어 내리며 수집 본능은 본질적으로 우리 실존의 문제라고 말한다. “그것은 죽음과 소멸의 공포와 싸우는 것이다. 수집가의 열정은 기억의 혼돈 가까이에 있다.”
로마시대 이래 소수의 특권이었던 수집활동은 르네상스에 이르러 널리 퍼져나갔다. 사회는 점차 세속적으로 변해갔고 ‘지금 여기’의 퇴폐미가 넘쳐났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 “할 수 있을 때 장미꽃 봉오리를 따 모으세요./시간은 지금도 날아가고 있어요./오늘 웃고 있는 이 꽃송이도/내일이면 죽어갈 테니까요….”(로버트 헤릭)
꽃의 시듦이 영생의 세계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의미할 때, 그것으로 정말 끝일 때, 죽음이 점점 더 커 보이는 세계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장미꽃 봉오리 자체, 물질세계 자체로 향했다. 수집광은 그 징후였다.
대체 왜 사람들은 빈 성냥갑이며, 사용하고 난 우표며, 수십 년 동안 포도주 한 방울 담아보지 못한 빈 병에다 아낌없이 돈을 쓰는 것일까?
수집가가 보기에 거기엔 그 무언가가 담겨 있다. 성자의 유골이 천국과 불멸을 이어주는 다리이듯이, 그는 수집품에서 세속의 실존보다 무한히 귀중한 어떤 세계, 초월의 순간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 탐나는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음모와 도둑질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전 세계를 돌아다닐 것이다. 기꺼이 결혼이라도 할 것이다! 수집품에 대한 욕심은 살인을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수집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열정이다. 수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수집품이다. 손에 물건을 들고 그것을 어디에 놓을지 궁리하는 동안에도 ‘굶주린 눈’은 이미 저 멀리 앞을 내다보고 있다.
수집가는 자기가 찾던 물건이 영혼의 허기를 채워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것을 만지는 순간, 마법은 풀려버리고 만다.
“수집가에겐 ‘메두사의 저주’가 내린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메두사를 보는 순간 돌로 변하고 만다. 그녀는 죽음과 침묵의 세계에 내동댕이쳐진 채 절대 이룰 수 없는 충만을 갈구하며 분노로 미쳐간다. 물질을 통해 초월을 추구하는 자들은 메두사의 운명을 피할 수 없으리라….”
원제 ‘TO HAVE AND TO HOLD’(2002년).
이기우 문화전문기자 keywoo@donga.com
인문사회 >
-

광화문에서
구독
-

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구독
-

프리미엄뷰
구독
트렌드뉴스
-
1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도경완, 120억 펜트하우스 내부 공개 “금고가 한국은행 수준”
-
4
이광재 “우상호 돕겠다” 지선 불출마…禹 “어려운 결단 고마워”
-
5
비트코인, 9개월만에 7만 달러대로…연준 의장 워시 지명 영향
-
6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
7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8
한준호, 정청래에 “조국혁신당 합당, 여기서 멈춰 달라”
-
9
“평생 취미 등산 덕분에 88세 성균관장 도전” 설균태 성균관 고문회장[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
10
이웃집 수도관 내 집에 연결…몰래 물 끌어다 쓴 60대 벌금형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3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4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5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6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7
“실패해보지 않으면 위험한 인생” 李대통령의 ‘창업론’
-
8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9
코스피 불장에도 실물경기 꽁꽁… ‘일자리 저수지’ 건설업 바닥
-
10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트렌드뉴스
-
1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도경완, 120억 펜트하우스 내부 공개 “금고가 한국은행 수준”
-
4
이광재 “우상호 돕겠다” 지선 불출마…禹 “어려운 결단 고마워”
-
5
비트코인, 9개월만에 7만 달러대로…연준 의장 워시 지명 영향
-
6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
7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8
한준호, 정청래에 “조국혁신당 합당, 여기서 멈춰 달라”
-
9
“평생 취미 등산 덕분에 88세 성균관장 도전” 설균태 성균관 고문회장[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
10
이웃집 수도관 내 집에 연결…몰래 물 끌어다 쓴 60대 벌금형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3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4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5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6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7
“실패해보지 않으면 위험한 인생” 李대통령의 ‘창업론’
-
8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9
코스피 불장에도 실물경기 꽁꽁… ‘일자리 저수지’ 건설업 바닥
-
10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의 향기]“콩나물 팍팍 무쳤냐”… 국민 울고 웃긴 예능史](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8/02/10/88603498.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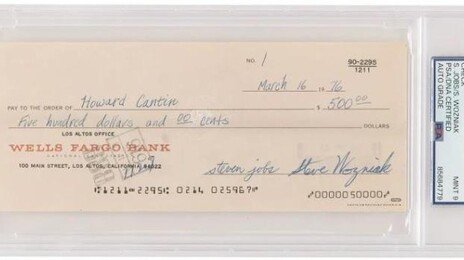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