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눈치보며 글 쓰기싫어 비평誌 창간… 당당한 ‘아웃사이더’
-
입력 2005년 6월 9일 03시 05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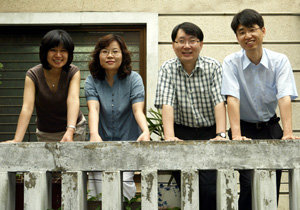
최 씨는 200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데뷔한 뒤 작가 하성란 씨에 대한 평론을 썼으나 이를 실어줄 문예지를 찾지 못했다. 하 씨가 뛰어난 작가임에 분명하지만 당시의 ‘단편들은 긴장도가 떨어지고, 장편은 얼개가 단단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평론이었는데 출판사들이 부담을 가진 것.
“문예지의 눈치를 보는 평론을 쓰는 게 싫어져 버렸어요. 비평답게 쓸 독립 지면을 만들고 싶어 뜻 맞는 동인들을 모았지요.”
그 결과물로 지난해 4월 ‘작가와 비평’ 창간호를 내놓았는데, 400쪽짜리 책의 절반이 갖가지 문학상에 대한 해부인 ‘문학상 제도의 빛과 그늘’이라는 특집이었다. 이상, 현대, 동인, 김수영문학상 등 권위 있는 문학상들이 “시장 눈치를 너무 본다” “원칙 없고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줄줄이 비판당했다. 이 창간호는 1000부가량 팔려 나갔다.
 |
그러나 창간호를 발행해준 출판사가 다음 호 출간에 난색을 보여 최 씨는 고심 끝에 출판사를 직접 차려야 했다. 출판사 이름은 ‘작가와 비평’으로 지었다. 1인 출판사 사장이 된 그는 호주머니를 털어 제2호 ‘작가와 비평’의 외부 필자들에게 원고료도 보내줬다. 이렇게 해서 나온 제2호의 200쪽짜리 특집은 ‘진보적 문학의 현주소’.
“민중문학을 말해온 ‘창작과 비평’의 글들에 엘리트주의적인 난해함이 보인다. 필진에 학벌주의가 보인다” 등의 거침없는 비판들이 실렸다.
다음 주 나올 제3호에는 ‘비평의 위기와 문학주의’라는 특집이 실린다. 최근 10년간 크게 떠오른 계간지인 ‘문학동네’의 문학주의, 1970년대생 작가들을 비판적으로 조명한 글들이 실린다고 한다.
“어쩌다가 사장이 된 다음 건강보험 등록 등 갖가지 ‘숙제’에 시달리다가 끝내 ‘작업장 폐쇄 신고’를 했어요. 결국 후덕한 ‘여름 언덕’을 만나 다행이에요.”
비판 정신이 충실한 이들에게 돌아오는 비판은 뭘까? “‘아웃사이더들의 권위 흠집 내기’라는 비판이 나와요. ‘이렇게까지 헐뜯을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글이 거칠다는 말도 듣습니다.” 고 씨의 솔직한 말이다.
하지만 이들은 “침묵 대응을 많이 받아서, 일단 우리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고 말했다.
최 씨는 “하성란론을 결국 ‘창작과 비평’에 실었는데 그 후 (내 비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글이 훨씬 좋아지는 걸 알 수 있었다. 기뻤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평론이 좋은 대중문학까지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문학의 힘을 북돋는 길은 여러 가지일 것 같다. 열심히 쓴 문학평론들이 사랑받고 즐겨 읽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기태 기자 kkt@donga.com
트렌드뉴스
-
1
돈-칼 모두 쥔 ‘하메네이 문지기’…시위대 강경진압 주도
-
2
이란 “첨단무기 손도 안댔다” 트럼프 “영원히 전쟁 가능”…장기전 가나
-
3
“유통기한 짧다” 교환 거부당하자 케이크 바닥에 내동댕이 [e글e글]
-
4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5
도박에 빠져…후임병 275명에 군복비 등 950만원 사기 친 20대
-
6
논길서 30대女 숨진채 발견…땅엔 흉기 꽂혀있었다
-
7
국힘, 90년대생 청년 인재 5명 영입…“지선 시대교체”
-
8
이란 군사작전에 김승연도 “어서 타”…‘회장님 밈’ 방산주로 옮겨갔다
-
9
“‘모텔 약물 연쇄살인’ 20대女, 사이코패스 판명”
-
10
죽은 기러기 6마리가 쇠막대기에…경찰, 50대 조사
-
1
“혁명수비대 업은 강경파” vs “빈살만식 개혁 가능”…하메네이 차남 엇갈린 평가
-
2
“정파적 우편향 사상, 신앙과 연결도 신자 가스라이팅도 안돼”
-
3
“한국 교회 큰 위기…설교 강단서 복음의 본질 회복해야”
-
4
韓증시 아직 못믿나…중동전 터지자 외국인 5조원 ‘썰물’
-
5
주가 폭락에…코스피·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
6
李 “檢 수사·기소권으로 증거조작…강도·살인보다 나쁜 짓”
-
7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8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증거 인멸 염려”
-
9
정청래 “조희대,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냐? 사퇴도 타이밍 있다”
-
10
미스 이란 출신 모델 “하메네이 사망, 많은 국민이 기뻐해”
트렌드뉴스
-
1
돈-칼 모두 쥔 ‘하메네이 문지기’…시위대 강경진압 주도
-
2
이란 “첨단무기 손도 안댔다” 트럼프 “영원히 전쟁 가능”…장기전 가나
-
3
“유통기한 짧다” 교환 거부당하자 케이크 바닥에 내동댕이 [e글e글]
-
4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5
도박에 빠져…후임병 275명에 군복비 등 950만원 사기 친 20대
-
6
논길서 30대女 숨진채 발견…땅엔 흉기 꽂혀있었다
-
7
국힘, 90년대생 청년 인재 5명 영입…“지선 시대교체”
-
8
이란 군사작전에 김승연도 “어서 타”…‘회장님 밈’ 방산주로 옮겨갔다
-
9
“‘모텔 약물 연쇄살인’ 20대女, 사이코패스 판명”
-
10
죽은 기러기 6마리가 쇠막대기에…경찰, 50대 조사
-
1
“혁명수비대 업은 강경파” vs “빈살만식 개혁 가능”…하메네이 차남 엇갈린 평가
-
2
“정파적 우편향 사상, 신앙과 연결도 신자 가스라이팅도 안돼”
-
3
“한국 교회 큰 위기…설교 강단서 복음의 본질 회복해야”
-
4
韓증시 아직 못믿나…중동전 터지자 외국인 5조원 ‘썰물’
-
5
주가 폭락에…코스피·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
6
李 “檢 수사·기소권으로 증거조작…강도·살인보다 나쁜 짓”
-
7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8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증거 인멸 염려”
-
9
정청래 “조희대,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냐? 사퇴도 타이밍 있다”
-
10
미스 이란 출신 모델 “하메네이 사망, 많은 국민이 기뻐해”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