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추상회화로…목탄화로…'외길 화업' 두 화가의 작품전
-
입력 2003년 2월 4일 17시 29분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 가나아트센터 우리나라 현대 전위 미술의 선봉격인 추상화가 김형대씨의 1966년작 ‘생성’. 고단했던 현대사에서 부대낄마다 전시회가 아닌 덕수궁벽에 작품을 전시하는 식으로 ‘벽’에 퍼부었던 그의 젊은 시절의 좌절, 방황, 울분이 오히려 힘찬 에너지로 표현되어 있다.
▼추상화가 김형대 회고전, 빛으로 버무린 전통미감▼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선봉격인 추상화가 김형대씨(金炯大·67).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 6·25 전쟁과 산업화의 질주과정을 겪어 온 그는 고빗길마다 부닥친 방황과 좌절, 울분과 저항을 전시회라는 틀을 부수고 길거리 ‘벽’에다 퍼부었다.
1960년과 1961년 전위적인 젊은 그룹 ‘벽’(壁)의 동인이었던 그는 앵포르멜 추상계열 작업을 하며 전통 화단에 도전장을 냈다. ‘벽’은 덕수궁 벽에 전위적 작품을 전시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김씨는 1961년 ‘환원B’로 국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상(특선)을 받기도 했는데 ‘환원B’는 추상화로는 처음으로 국전 특선의 영예를 안아 국전이 추상화에 문을 여는 계기가 됐다.
지난 해 이화여대 교수직에서 정년퇴임한 그는 화단의 주류에서 다소 비켜선 채 캔버스와 나이프, 붓의 변화무쌍한 세계에 몰입해 왔다.
“서양화에 회의를 느껴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었다. 내 그림이 서양 것과 닮아 가는 것이 싫었다. 한지를 통해 들어오는 빛의 은은함에 관심을 가진 것은 그 때문이었다. 드러내지 않고 한꺼풀 가린 채 부드럽고 연한 빛을 수용하는 한지야말로 우리 문화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작업노트-‘참된 한국성을 찾아서’에서)
김씨는 이같은 간접적인 빛에 대한 천착과 함께 이 땅에서 자라면서 눈에 익힌 한국적 전통이야말로 자신이 구현해야할 것들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자신의 작품 곳곳에 유년기의 소중한 추억이 실려 있는 것은 그 때문. 서울 문래동에 살았던 그는 지금 63빌딩 인근 샛강에 자주 놀러가 멱을 감으며 놀곤 했다. 샛강의 하얀 모래언덕과 물굽이는 뇌리에 두고 두고 남아 그의 예술혼을 자극했다.
|
여기에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점을 하던 어머니는 그에게 색채의 아름다움에 푹 빠지게 했다. 백열등 아래 곱게 누운 비단과 모시같은 옷감은 처연한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었고, 이는 그의 의식을 내내 지배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들렀던 조계사의 법당과 경복궁의 전각들은 리듬과 절단, 반복과 교착이라는 전통 미감을 그의 가슴 깊이 스며들게 해주었다.
김씨는 “음악으로 치면 일찍부터 양악이 아닌 국악으로 방향을 정한 셈이다. 창호지와 발의 투명함이 화면에 그대로 적용돼 있다고 보면된다”면서 “주류가 아닌 샛강은 아웃사이더로 살아 온 내 삶과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회오리처럼 유동적인 선과 면이 간결하면서도 강인하게 느껴지는 앵포르멜 추상작업 ‘생성시대’ 연작으로 출발했다.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심상’ (心象) 시리즈를 내 놓으며 화면의 격렬성과 표현성에서 내면화한 심상추상으로 내달았다.
19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는 ‘후광’(後光) 시기로 요약되는 데 더욱 투명해진 빛과 색, 잔광(殘光)의 유희를 보여 주며 20여년간 쌓아 온 화업의 연륜과 깊이를 느끼게 한다.최근 ‘후광’연작은 화려한 듯하면서도 심오해 칠순을 바라보는 작가의 내면을 엿보게 하는 작품들이다.
1965년 첫 개인전이후 지금까지 4차례 개인전만을 가졌던 그가 40여년 화업을 정리하는 회고전을 처음으로 연다. 7일∼3월 9일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 미공개작 20여점을 포함 1961년부터 올해 만든 작품까지 70점이 나온다. 02-3217-1233.
허문명기자 angelhuh@donga.com
▼서양화가 이재삼전, 영혼의 눈으로 바라본 목탄 인물화▼
|
서양화가 이재삼(43)씨는 목탄이라는 재료에 10년째 매달리고 있는 독특한 사람이다. 거친 드로잉이나 밑그림을 그릴 때 가볍게 쓰는 숯덩이 목탄을 처음부터 끝까지 회화의 재료로 쓰는 사람은 드물다. 그는 10여년 전 나뭇가지와 자갈 등에 흑연을 칠하는 방식의 설치 작업을 하다 검정 색에 매료됐다고 한다. 광택없는 묵직한 검정톤이야말로 절대적 무게를 표현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결국, 검정이라는 재료를 추구하다보니 목탄과 인연을 맺게 된 것. 그는 목탄이 우리 전통 그림의 먹과 비슷한 성질을 지녔다고 말한다.
“목탄이 가루이기 때문에 마무리 작업이 안된다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실컷 그려놓으면 다 날라가버려 캔버스를 망치기 십상이었다.”
그는 1년여 치열한 실험 끝에 특유의 밀착법을 개발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그러면서 기존에 해왔던 설치작업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아예 회화분야에만 매달렸다.
“만들고 설치하는 풍조가 강해져, 이벤트만 무성해 버린 미술계에서 문득 정체성을 고민하게 됐다. 겉도는 개념에 매달리기보다 나의 진정한 고민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자각이 들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라고 남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 내게 맞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살기로 했다.”
10일까지 갤러리 도올에서 선보이는 그의 작품들은 목탄이 주는 재료적 특성에 걸맞게 인물을 담고 있다. 작가의 자화상과 주변 인물들 초상, 동물그림들 10여점이 나왔다.
현장감을 걷어내고 냉정하게 묘사한 그의 그림들은 차갑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적이면서 어딘지 그로테스크하다. 얼굴 전면에 검은 선을 가늘게 내리긋는 화법으로 그린 그림속 인물들은 그의 말처럼 가장 본질적인 내면에 닿아 있다.
“인물을 그리면 흔히 초상화작가, 인물작가라고 하지만 나는 인물의 이미지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A라는 사람을 둘러 싼 모든 관계와 사회적 신분을 걷어내고 그 사람 그 자체의 시원(始原)을 파고드는 것이다. 결국 영혼의 눈으로 한 사람을 표현하고 싶다.”우사를
개조한 외양간 화실에서 작업하는 그에게서 시류에 편승하지 않은 채,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고 사는 우직한 한 예술가의 ‘혼’이 느껴진다. 02-739-1405
허문명기자 angelhuh@donga.com
트렌드뉴스
-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2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3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4
트럼프, 연준 의장에 ‘쿠팡 이사’ 케빈 워시 지명
-
5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6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7
트럼프, 친구 사위를 연준 의장에…‘금리인하 옹호’ 코드 딱 맞아
-
8
고이즈미에 탁구 실력 뽐낸 안규백 “매일 칩니다”
-
9
[동아광장/박용]이혜훈 가족의 엇나간 ‘대한민국 사용설명서’
-
10
‘정청래-조국 밀약설’ 술렁이는 與…반청측 ‘타격 소재’ 찾았나
-
1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2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3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4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5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6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7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8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9
지선앞 ‘자폭 제명’… 한동훈 끝내 쳐냈다
-
10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트렌드뉴스
-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2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3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4
트럼프, 연준 의장에 ‘쿠팡 이사’ 케빈 워시 지명
-
5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6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7
트럼프, 친구 사위를 연준 의장에…‘금리인하 옹호’ 코드 딱 맞아
-
8
고이즈미에 탁구 실력 뽐낸 안규백 “매일 칩니다”
-
9
[동아광장/박용]이혜훈 가족의 엇나간 ‘대한민국 사용설명서’
-
10
‘정청래-조국 밀약설’ 술렁이는 與…반청측 ‘타격 소재’ 찾았나
-
1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2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3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4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5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6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7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8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9
지선앞 ‘자폭 제명’… 한동훈 끝내 쳐냈다
-
10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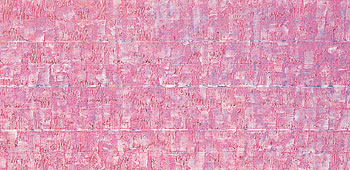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