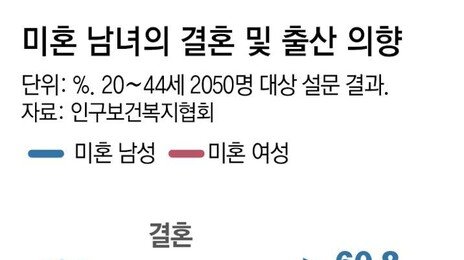공유하기
[김형찬의 문화비평]테러공포가 광기로 바뀌면…
-
입력 2001년 11월 6일 18시 48분
글자크기 설정
이 퍼포먼스에 리듬과 행위의 긴장이 있다면, 탄저균을 걱정하며 편지봉투를 찢는 미국인들의 손에는 생화학 테러에 대한 공포와 편지에 대한 호기심 사이의 팽팽한 긴장이 있다. 테러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신에게 배달된 편지 한 통을 펼쳐 보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견뎌내야 하는 현실은 공포를 일상화하고 긴장을 습관화한다.
사실 긴장은 어느 곳에나 있다. 균형을 유지하며 서 있거나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몸의 각 부분이 일정한 긴장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상을 자극하며 긴장을 유발하는 일정 정도의 공포는 쾌감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과도한 긴장을 강요하는 공포 속에서 매일매일을 보낼 수는 없는 법.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운 공포의 대상과 마주치거나 두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불안을 피하기 위해 ‘회피전략’을 마련한다. 괜히 휘파람을 불거나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 소리를 지르거나 무작정 폭력을 휘두르기도 한다. 때로는 타자가 아닌 자신에게 폭력을 휘둘러 고통을 자초함으로써 보다 큰 공포를 잊으려 하기도 한다. 정 안 되면 미쳐버리기라도 해야 공포의 긴장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만일 공포에 당당히 맞서려 한다면 우선 당면한 사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맞설 대상도 파악이 되지 않고 이 공포의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예측할 수 없을 경우, 공포의 긴장은 한없이 고조되고 비이성적 폭력을 휘둘러 대거나 힘없이 좌절하게 된다.
이 때 흔히 나타나는 회피전략이 희생양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는 한 목표가 어떤 장애로 인해 달성될 수 없을 때 대신 다른 목표를 달성해 본래의 욕구를 대체 충족시키는 대상(代償)행동의 하나다. 공포를 분노로 바꿔 희생양을 향해 분출시킴으로써 공포의 긴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다. 내부 결속을 위해 희생양은 우선 밖에서 찾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내부에서라도 만들어 낸다. 13∼17세기에 유럽을 휩쓸었던 마녀사냥의 광기는 바로 대상행동의 대표적 예였다.
그런데 정보가 특정 집단에 의해 통제되던 시절에는 마녀사냥이 손쉬운 대상행동의 방법일 수 있었지만, 이제 정보가 다수에게 공개 유통되는 상황에서 섣부른 마녀사냥은 자살행위일 수 있다. 손발을 묶은 채 물 속에 던져 넣은 후 떠오르는가를 시험해 본다거나 성서와 마녀의 무게를 비교해 보는 식으로는 더 이상 마녀임을 증명할 수 없다. 상대가 마녀임을 공개적으로 증명한 후 처형하지 않으면, 마녀를 처형하고도 도리어 심판자가 새로운 희생양으로 지목될 위험에 처한다. 공포의 긴장이 계속되는 동안 희생양을 찾는 화살은 끊임없이 새 목표를 찾아 달려가고 조급해진 사람들은 폭력성을 더해간다.
이쯤 됐으면 본래의 목표를 되돌아 볼 때다. 목표는 본래 마녀를 잡아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마녀의 유혹이 발붙일 수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김형찬기자>khc@donga.com
트렌드뉴스
-
1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2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3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
4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5
“태국서 감금” 한밤중 걸려온 아들 전화…어머니 신고로 극적 구조
-
6
마운자로-러닝 열풍에 밀린 헬스장, 지난달에만 70곳 문닫아
-
7
정해인, ‘쩍벌’ 서양인 사이에서 곤혹…인종차별 논란도
-
8
이란 영공 코앞에 뜬 美초계기… 하메네이 “공격땐 지역 전쟁”
-
9
“내 주인은 날 타이머로만 써”… 인간세계 넘보는 AI 전용 SNS 등장
-
10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6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7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8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9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10
‘역대급 실적’ 은행들, 최대 350% 성과급 잔치…金 단축 근무도
트렌드뉴스
-
1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2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3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
4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5
“태국서 감금” 한밤중 걸려온 아들 전화…어머니 신고로 극적 구조
-
6
마운자로-러닝 열풍에 밀린 헬스장, 지난달에만 70곳 문닫아
-
7
정해인, ‘쩍벌’ 서양인 사이에서 곤혹…인종차별 논란도
-
8
이란 영공 코앞에 뜬 美초계기… 하메네이 “공격땐 지역 전쟁”
-
9
“내 주인은 날 타이머로만 써”… 인간세계 넘보는 AI 전용 SNS 등장
-
10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6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7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8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9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10
‘역대급 실적’ 은행들, 최대 350% 성과급 잔치…金 단축 근무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