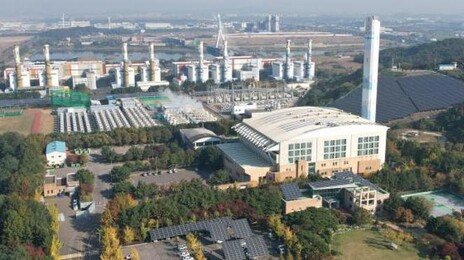공유하기
[문학평]심리학자가 본 정찬 소설 '그림자 영혼'
-
입력 2001년 1월 29일 18시 34분
글자크기 설정

부자(父子) 관계를 배경으로 무의식 속의 악마를 끌어내 이야기를 전개한 정찬의 ‘그림자 영혼’은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부자 관계처럼 ‘오이디푸스 갈등’을 배경으로 한다.
일곱살 무렵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살던 주인공 김일우에게 사춘기 무렵 어머니를 연상시키는 영희라는 여인이 등장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를 차지했던 것처럼 그녀를 차지한다.
또 다시 욕구좌절을 경험한 주인공은 영희를 괴롭히며 끝내 그녀를 자살로 몰아 간다. 그 후 주인공은 자신보다 아버지를 선택한 영희에 대한 분노를 하숙집 딸에게 전위시켜 분출하고, 하숙집 여주인과의 관계를 통해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충족한다.
사춘기에 경험한 좌절은 어린 시절처럼 무력하게 수그러들지 않았고, 아버지에 대한 직접적인 복수로 이어진다.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악령’의 주인공 스타브로긴이 자신과 동일인이라고 착각하는 정신분열증적 증상을 통해 아버지 살해에 대한 죄의식에서 도피한다.
김일우는 자신의 삶을 연극에 비유하기도 하고, 스타브로긴을 통해 자신과 아버지의 행동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지만, 끝내 자신의 ‘그림자 영혼’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스타브로긴처럼 자살을 선택한다.
그리고 ‘나 스스로 한 짓이니, 누구의 죄도 아니다’라는 스타브로긴의 유서와 똑같은 유서를 남김으로써 자신의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합리화하려 든다. 김일우의 집 지하실은 오이디푸스 갈등, 죽음의 본능 타나토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말한 ‘그림자’(shadow) 같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음침한 어둠을 형상화한 것이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란 사람이 조상으로부터 진화하면서 지녀온 원시적 동물 본능으로 선(善)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심리상태다.
이로부터 인간의 자기 보호적, 가학적, 자학적, 충동적 공격성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융은 자아가 ‘그림자’의 힘을 잘 조절하여 균형을 잡으면 이것은 오히려 생기 있고 활력적이며 열정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그림자’로부터 벗어나려는 어설픈 몸짓은 오히려 삶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기 때문에 자아가 약한 사람들은 노이로제, 정신병, 퇴행, 자살이라는 어두운 그림자에 굴복하고 만다.
존속 살인과 유기, 자살, 근친상간, 동성애, 연상 결혼, 원조 교제, 형제 다툼, 마마보이와 같은 얘기를 매스컴을 통해 들을 때마다 우리 삶 속에 짙게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느낀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주인공과 스타브로긴의 만남도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흐르는 거역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그림자는 변한다. 그림자는 언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모습도 존재도 달라진다. 주인공 김일우는 어린 시절 보았던 그림자만을 마음 속에 각인시킨 채 불행히도 다른 그림자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현대인의 슬픈 초상이다.
최창호(강남대 겸임교수·사회심리학)
트렌드뉴스
-
1
“너 때문에 넘어졌어” 부축해준 학생에 4600만원 청구 논란
-
2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3
“성관계 몰래 촬영”…20대 순경, 전 여친 고소로 입건
-
4
“같은 사람 맞아?”…日 ‘성형 전후 투샷 인증’ 챌린지 유행
-
5
‘1000억대 자산’ 손흥민이 타는 車 뭐길래…조회수 폭발
-
6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7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8
‘20만전자’-‘백만닉스’…반도체 훈풍타고 나란히 최고가
-
9
도서관 책에 줄 그은 김지호…“조심성 없었다” 사과
-
10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1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2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3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4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5
장동혁 “내 이름 파는 사람, 공천 탈락시켜달라”
-
6
경찰·검찰·소방·해경·산림…‘민생치안 5청장 공석’ 초유의 사태
-
7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8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9
‘절윤’ 공세 막은 국힘 ‘입틀막 의총’…당명개정-행정통합 얘기로 시간 끌어
-
10
李 “한국과 브라질, 룰라와 나, 닮은게 참으로 많다”
트렌드뉴스
-
1
“너 때문에 넘어졌어” 부축해준 학생에 4600만원 청구 논란
-
2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3
“성관계 몰래 촬영”…20대 순경, 전 여친 고소로 입건
-
4
“같은 사람 맞아?”…日 ‘성형 전후 투샷 인증’ 챌린지 유행
-
5
‘1000억대 자산’ 손흥민이 타는 車 뭐길래…조회수 폭발
-
6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7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8
‘20만전자’-‘백만닉스’…반도체 훈풍타고 나란히 최고가
-
9
도서관 책에 줄 그은 김지호…“조심성 없었다” 사과
-
10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1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2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3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4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5
장동혁 “내 이름 파는 사람, 공천 탈락시켜달라”
-
6
경찰·검찰·소방·해경·산림…‘민생치안 5청장 공석’ 초유의 사태
-
7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8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9
‘절윤’ 공세 막은 국힘 ‘입틀막 의총’…당명개정-행정통합 얘기로 시간 끌어
-
10
李 “한국과 브라질, 룰라와 나, 닮은게 참으로 많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