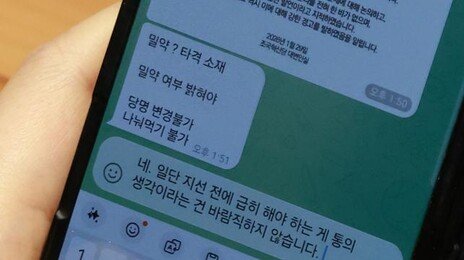공유하기
[골동품]"이태원 앤티크숍 거리 찾아보세요"
-
입력 2000년 10월 23일 18시 50분
글자크기 설정

주부 박정미씨(가명·39·서울 강남구 청담동)는 서양의 고물건 앤티크(Antique)의 매력을 이렇게 말한다.
◇정교함, 앤티크의 매력
팔려 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대량 생산, 대량 복제품이 아니다. 새끼손가락만한 머리핀에도 담겨 있는 장인의 숨결과 정교한 손길, 먼저 지녔던 이들의 사랑과 추억의 그림자….
박씨가 시간 날 때마다 앤티크점을 찾는 것은 그림 좋아하는 이들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찾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다만 좀더 삶과 사람에 밀착돼 있을 뿐.
“친정어머니가 워낙 오래된 물건을 아끼셨어요. 반상기나 시집올 때 갖고 온 함 같은 걸 쓸고 닦곤 하셨죠.”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덕일까. 결혼후 남편과 영국을 갔는데 유명 관광지보다 골목골목 자리잡은 앤티크숍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선물이나 기념품 살 돈 아껴서 액세서리며 작은 화병, 램프 등을 하나둘 사기 시작했다.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 전통 소품이나 가구와도 잘 어울려요. 그런데 우리 골동품보다 값은 저렴해요. 앤티크는 또 그냥 ‘모셔 놓는 것’이 아니라 램프엔 불을 켜고, 액세서리는 몸에 하고, 의자엔 앉아 차를 마시면서 같이 ‘산다는 것’이 좋아요.”
◇이태원, 서울의 앤티크거리
박씨가 서울에서 즐겨 찾는 곳은 이태원 해밀턴호텔 맞은편 앤티크숍의 거리다. 박민수 전자메이카대사부인인 서창휘씨(69)가 오랜 외국 생활을 하며 관심을 갖게 된 앤티크를 모아 3년전 이곳에 ‘소피아’를 차린 이래 최근까지 20여곳의 앤티크숍이 들어섰다.
가게마다 100년 안팎의 세월을 안고 있는 유럽의 자그마한 은스푼부터 램프 시계 등 장식품, 육중한 식탁과 가구까지 특색있는 제품으로 가득 차 있다. 앤티크를 우리말로 굳이 바꾼다면 ‘골동품’이 적합하겠으나 앤티크 자체의 의미를 따지면 우리의 골동품과는 다르다는 것이 이곳 주인들의 말. 우리에게 골동품은 일부 호사가들의 투자 대상이기 쉽지만 앤티크는 살면서 쓰는 물건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유럽인들이 쓰던 물건을 내놓고 파는 것도 바로 이같은 문화에서 비롯된 것.
“조강지처의 멋이랄까요. 새 것은 싫증이 나지만 앤티크는 싫증이 안난다는 게 앤티크 좋아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더라고요.”(서창휘씨)
◇만남, 앤티크쇼
서씨가 이끄는 서울 앤티크 어소시에이션(02―793―0130)은 30, 3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클럽 한라산홀에서 ‘앤티크쇼’를 펼친다. 소속 5개숍 주인들이 공들여 모은 생활소품부터 가구까지 500여점의 앤티크가 선보인다.
‘엘리 앤티크’의 이구경씨(47)는 앤티크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우선 구경부터 하면서 낯을 익히세요”라고 말한다. 화랑이나 백화점을 드나들 듯 부담없이 앤티크숍을 찾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어느 날 ‘앤티크가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그럼 서로 인연이 닿은 거예요. 능력되는 대로 하나둘씩 사기 시작하면 새 옷, 새 가구 사는 것과는 또 다른 삶의 기쁨을 느끼게 될 걸요.”
이제 노랗게 바래기 시작하는 나뭇잎이 정겨워 보이는 가을, 앤티크에 마음을 붙이면 오래된 것들이 소중해 보이기 시작한다고 ‘앤티크 마니아’들은 말한다. 그리고 내 주변의 오래된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고….
<김순덕기자>yuri@donga.com
트렌드뉴스
-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2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3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4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5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6
日 소니마저 삼킨 中 TCL, 이젠 韓 프리미엄 시장 ‘정조준’
-
7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
8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9
호주오픈 결승은 알카라스 대 조코비치…누가 이겨도 ‘대기록’
-
10
[동아광장/박용]이혜훈 가족의 엇나간 ‘대한민국 사용설명서’
-
1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2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3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4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5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6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7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8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9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
10
지선앞 ‘자폭 제명’… 한동훈 끝내 쳐냈다
트렌드뉴스
-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2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3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4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5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6
日 소니마저 삼킨 中 TCL, 이젠 韓 프리미엄 시장 ‘정조준’
-
7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
8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9
호주오픈 결승은 알카라스 대 조코비치…누가 이겨도 ‘대기록’
-
10
[동아광장/박용]이혜훈 가족의 엇나간 ‘대한민국 사용설명서’
-
1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2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3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4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5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6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7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8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9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
10
지선앞 ‘자폭 제명’… 한동훈 끝내 쳐냈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