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책갈피 속의 오늘]1973년 美軍 베트남서 완전철수
-
입력 2005년 3월 28일 18시 57분
글자크기 설정

연인원 300만 명 이상, 최대 인원 54만 명(1968년)의 미군이 북베트남과 베트콩을 상대로 12년에 걸쳐 5만6000명의 사망자를 내며 싸운 결과가 그것이었다. 미국으로서는 나름대로 위안을 찾았을지도 모른다. 당시로서는 ‘베트남의 완전 공산화를 막아냈다’고 말할 수 있었으니까. 평화회담 협정문에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강요하거나 통합함이 없이 단계적으로 통일을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미군이 철수하면서 넘겨준 최신 무기, 세계 4위의 공군력, 그리고 100만 명에 이르는 남베트남군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한 더는 충돌 없이 남북 베트남이 공존의 길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익히 알려진 대로 2년 뒤인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군이 사이공(현 호찌민 시)에 진주하면서 남베트남은 역사의 한 장으로 사라졌다.
막강한 군대를 보유한 남베트남이었지만 보호자가 발을 빼자마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명분과 대의’의 장악에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를 보장한 남베트남 정부였지만 지식인들 대부분의 눈에는 ‘호찌민의 북베트남에 맞서기 위해 프랑스와 미국 등 외세가 만들어 낸 꼭두각시 정부’로 비쳤다. 지배층의 부패와 1963∼1967년 열 번이나 정권교체가 반복될 만큼 불안했던 정정(政情)은 국민들이 체제에 염증을 느끼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75년 북베트남의 공세가 시작되자 남베트남군은 전투다운 전투도 해보지 못한 채 퇴각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사령관이 적군에게 돈을 받고 무기를 팔아넘기는 일까지 일어났다.
‘자유’란 그토록 허무한 가치였을까. ‘외세 배격·자주’라는 가치 앞에 그것은 한낱 기득권자들의 배부른 소리에 불과했을까. 조국을 등지고 풍랑에 몸을 맡겼던, 1975년 4∼12월에만 23만 명에 이르렀던 베트남의 ‘보트피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유윤종 기자 gustav@donga.com
책갈피속의 오늘 >
-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구독
-

주성하의 ‘北토크’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트렌드뉴스
-
1
“과거사 사죄는 평생의 사명” 日목사…“日 정부와 국민은 달라요”
-
2
“합격, 연봉1억2000만원” 4분 뒤 “채용 취소합니다”…法, 부당 해고 판결
-
3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4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5
엇갈리는 미군 사상자…美 “3명 전사” vs 이란 “560명 죽거나 다쳐”
-
6
한국이 제빵 강국이 된 비결
-
7
싱가포르, 난초 교배종에 ‘이재명-김혜경 난’ 이름 붙여
-
8
“귀 안까지 찌릿”…뒤통수 통증 부르는 이 질환은?
-
9
트럼프 “모든 목표 달성 때까지 이란 공격…미군 죽음 복수할 것”
-
10
역대급 불황이라고? 실상은 자산 계층 중심으로 소비 확산하는 국면
-
1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더 거칠어진 ‘힘의 질서’
-
2
北 “이란 공격은 후안무치 불량배적 행태…용납 못 해” 美-이스라엘 비난
-
3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4
[김승련 칼럼]장동혁-한동훈, 알고 보면 운명공동체
-
5
李 “집 팔기 싫다면 두라, 이익-손실 정부가 정해”
-
6
175일만에 만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악수만 했다
-
7
장동혁 “오피스텔, 보러도 안 와”…정청래 “부럽다, 난 0주택”
-
8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9
李대통령 “국민 여러분 전혀 걱정 않으셔도…일상 즐기시길”
-
10
“과거사 사죄는 평생의 사명” 日목사…“日 정부와 국민은 달라요”
트렌드뉴스
-
1
“과거사 사죄는 평생의 사명” 日목사…“日 정부와 국민은 달라요”
-
2
“합격, 연봉1억2000만원” 4분 뒤 “채용 취소합니다”…法, 부당 해고 판결
-
3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4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5
엇갈리는 미군 사상자…美 “3명 전사” vs 이란 “560명 죽거나 다쳐”
-
6
한국이 제빵 강국이 된 비결
-
7
싱가포르, 난초 교배종에 ‘이재명-김혜경 난’ 이름 붙여
-
8
“귀 안까지 찌릿”…뒤통수 통증 부르는 이 질환은?
-
9
트럼프 “모든 목표 달성 때까지 이란 공격…미군 죽음 복수할 것”
-
10
역대급 불황이라고? 실상은 자산 계층 중심으로 소비 확산하는 국면
-
1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더 거칠어진 ‘힘의 질서’
-
2
北 “이란 공격은 후안무치 불량배적 행태…용납 못 해” 美-이스라엘 비난
-
3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4
[김승련 칼럼]장동혁-한동훈, 알고 보면 운명공동체
-
5
李 “집 팔기 싫다면 두라, 이익-손실 정부가 정해”
-
6
175일만에 만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악수만 했다
-
7
장동혁 “오피스텔, 보러도 안 와”…정청래 “부럽다, 난 0주택”
-
8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9
李대통령 “국민 여러분 전혀 걱정 않으셔도…일상 즐기시길”
-
10
“과거사 사죄는 평생의 사명” 日목사…“日 정부와 국민은 달라요”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창간특집]책갈피 속의 4월 1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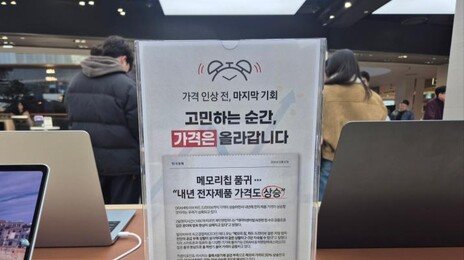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