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문학예술]'에세이스트의 책상'…'예술적 삶'을 향한 욕망
-
입력 2004년 1월 9일 18시 01분
글자크기 설정

한때 ‘나’와 M은 서로 사랑했다. 어느 날 M은 전차 안에서, ‘단지 순수한 육체적인 호기심 때문에’ 동성 친구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는다. ‘나’는 M과 멀어진다. 그 해 겨울, ‘나’는 M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배수아씨(39)의 장편 ‘에세이스트의 책상’은 독일로 짐작되는 곳을 배경으로 한, 한국인 ‘나’와 독일인 M의 사랑이야기다. 소설 속에서는 쇼스타코비치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가 흐른다. 낯선 언어를 배우는 ‘나’는 사고(思考)의 혼란을 겪고, 예술적으로 완전한 삶을 추구하려는 욕망이 내면에서 꿈틀댄다.
“말을 할 때는 진정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이 엉뚱하게 튀어나와 싫다”는 배씨를 e메일로 인터뷰했다.
작가는 소설의 많은 부분에서 언어와 음악에 대해 진술한다. ‘음악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 유일하게 인간에 속하지 않은 어떤 것’, ‘나는 M과 서로 다른 모국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통스러워한다’.
“나는 말을 경멸하는 편이다. 그것은 영혼이 없는 자연과 같다. 나는 그것에 매우 서투르다. 그래서 대부분 거짓말만 하거나 진실을 말할 순간을 놓쳐 버리게 된다. 그래서 나는 문자의 세계를 사랑한다. 문학은 오락이기에 앞서 언어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음악은 언어의 경계가 소멸된 문학의 형태라고 본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소설의 중심에 ‘사랑’이 놓여있기는 하지만,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격랑이나 미묘한 감정의 움직임은 나오지 않는다. ‘나’는 M과의 사랑을 홀로 생각한다. ‘나’의 내면이 짚어가는 과거는, 친구의 개를 산책시키고 괜찮은 아침메뉴를 제공하는 식당을 찾아다니는 무미건조한 일상의 한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내면으로 향하는 글이 독자의 참여를 방해하는 서툰 것으로 오해받기도 하는데, 내 생각은 좀 다르다. … 작년에 작은 책을 하나 번역하면서 번역과 창작의 합치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 문장을 결코 옮겨 적을 수 없듯이, 작가가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사유는 문장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독자를 배려한 행동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이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영향도 주지 못한다. 나는 간혹 비약하는 것을 즐기는데, 문학의 가장 이상적인 단계는, 그 글 안에서 작가가 마침내 소멸되어 버리듯이 독자 또한 사라지는 것이다.”
작가는 “나에게 글쓰기란 독자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오래 살면 살수록 그리워지는 것은 오직 자유뿐이었듯이, 글을 쓰면서도 형태나 시선에 매이지 않는 사유의 자유를 갈망하게 되었다. 소설에 결핍된 것을 채워주면서도 소설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에세이스트의 책상’이라고 생각했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문학예술 >
-

광화문에서
구독
-

어린이 책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트렌드뉴스
-
1
이원종, 유인촌, 이창동…파격? 보은? 정권마다 ‘스타 인사’ 논란
-
2
[김순덕의 도발] ‘李부터 연임’ 개헌, 이 대통령은 가능성을 말했다
-
3
“‘이 행동’ 망막 태우고 시신경 죽인다”…안과 전문의 경고
-
4
‘4선 국회의원’ 하순봉 前한나라당 부총재 별세
-
5
70대 운전자 스쿨존서 ‘과속 돌진’…10대 여아 중상
-
6
美 “반도체 시설 40% 내놓거나 관세 100%”…대만 당혹
-
7
“설거지해도 그대로”…냄비 ‘무지개 얼룩’ 5분 해결법 [알쓸톡]
-
8
‘뇌 나이’ 젊게 하는 간단한 방법 있다…바로 ‘□□’
-
9
[단독]李대통령 中 향한 날…北 23차례 항공기 GPS 교란했다
-
10
마두로 체포, 왜 ‘데브그루’ 아니고 ‘델타포스’가 했을까?
-
1
“한동훈 ‘당게’ 사건, 최고위원 전원 공개 검증” 제안…韓 받을까
-
2
“뼛속도 이재명” 배우 이원종, 콘텐츠진흥원장 거론
-
3
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20조씩 푼다
-
4
국힘 당명 바꾼다는데…‘책임, 청년, 자유’ 최근 많이 언급
-
5
美 “반도체 시설 40% 내놓거나 관세 100%”…대만 당혹
-
6
[김순덕의 도발] ‘李부터 연임’ 개헌, 이 대통령은 가능성을 말했다
-
7
조셉 윤 “尹 구명 시위대 제정신 아니라 느껴…성조기 흔들어”
-
8
중국發 미세먼지-내몽골 황사 동시에 덮쳐… 전국 숨이 ‘턱턱’
-
9
‘전가의 보도’ 된 트럼프 관세, 반도체 이어 이번엔 그린란드
-
10
[오늘과 내일/우경임]아빠 김병기, 엄마 이혜훈
트렌드뉴스
-
1
이원종, 유인촌, 이창동…파격? 보은? 정권마다 ‘스타 인사’ 논란
-
2
[김순덕의 도발] ‘李부터 연임’ 개헌, 이 대통령은 가능성을 말했다
-
3
“‘이 행동’ 망막 태우고 시신경 죽인다”…안과 전문의 경고
-
4
‘4선 국회의원’ 하순봉 前한나라당 부총재 별세
-
5
70대 운전자 스쿨존서 ‘과속 돌진’…10대 여아 중상
-
6
美 “반도체 시설 40% 내놓거나 관세 100%”…대만 당혹
-
7
“설거지해도 그대로”…냄비 ‘무지개 얼룩’ 5분 해결법 [알쓸톡]
-
8
‘뇌 나이’ 젊게 하는 간단한 방법 있다…바로 ‘□□’
-
9
[단독]李대통령 中 향한 날…北 23차례 항공기 GPS 교란했다
-
10
마두로 체포, 왜 ‘데브그루’ 아니고 ‘델타포스’가 했을까?
-
1
“한동훈 ‘당게’ 사건, 최고위원 전원 공개 검증” 제안…韓 받을까
-
2
“뼛속도 이재명” 배우 이원종, 콘텐츠진흥원장 거론
-
3
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20조씩 푼다
-
4
국힘 당명 바꾼다는데…‘책임, 청년, 자유’ 최근 많이 언급
-
5
美 “반도체 시설 40% 내놓거나 관세 100%”…대만 당혹
-
6
[김순덕의 도발] ‘李부터 연임’ 개헌, 이 대통령은 가능성을 말했다
-
7
조셉 윤 “尹 구명 시위대 제정신 아니라 느껴…성조기 흔들어”
-
8
중국發 미세먼지-내몽골 황사 동시에 덮쳐… 전국 숨이 ‘턱턱’
-
9
‘전가의 보도’ 된 트럼프 관세, 반도체 이어 이번엔 그린란드
-
10
[오늘과 내일/우경임]아빠 김병기, 엄마 이혜훈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의 향기]평창 온 괴짜 할배 “이 아름다운 나라에 핵폭탄을?”](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8/02/10/88603478.1.jpg)
![이란 시위 사진은 왜 이것뿐이었을까 — 허락된 이미지[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176323.1.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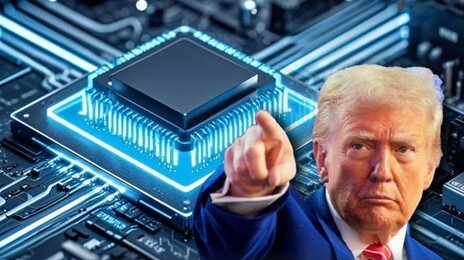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