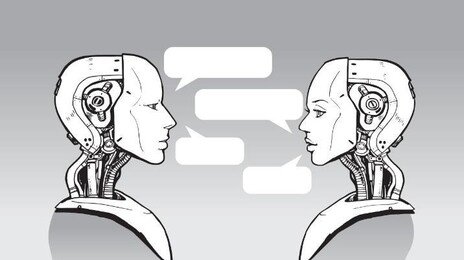공유하기
[문학예술]“시집가지 말아라” 中격동기 여인史 ´성별:여´
-
입력 2002년 12월 13일 17시 53분
글자크기 설정

이야기적 성격을 중시하는 중국의 서사전통이 잘 드러나 있는 감동적인 소설. 명성이야 1990년대 국내에서도 널리 읽힌 장룽(張戎)의 ‘대륙의 딸들’(원제 Wild Swans)에 미치지 못하지만 감동은 그에 못지 않다. 중국의 유명작가 주루이(朱蘂)는 작년 출간된 이 책에 대해 중국도서상보(中國圖書商報)가 내는 서평주간(書評週刊) 기사에서 “실로 오랜만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소설을 읽었다”고 평했다.
제목이 암시하듯 이 책은 전통과 현대의 격동기를 거쳐온 중국 여성에 관한 얘기다. 소설 초반, 화자의 큰 이모가 아이를 낳다 죽는 장면의 묘사는 비슷한 시대를 거쳐온 한국의 독자가 보기에도 섬뜩할 정도로 사실적이다.
 |
‘큰 이모는 배가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댔다. 외할머니는 손을 아기가 태어날 자궁의 입구로 가져갔다. 그리고는 얼굴 색이 확 변하고 말았다. 외할머니는 막 태어날 아기의 한쪽 다리를 만질 수 있었고 그것이 자기 딸의 자궁 가장자리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차라리 죽게 내버려두라고 울부짖는 큰 이모, 영아의 발가락을 연신 자궁 속으로 집어넣으며 어쩔 줄 몰라하는 외할머니. 그리고 밤낮이 지났다.
‘이모의 표정은 평온해졌다. 그러나 죽은 애가 뱃속에 있으면 더욱 위험하다. 사산아를 빼내야 했다. 보통 약을 몇 첩 달여서 먹이고 조금만 잡아당기면 사산아가 바깥으로 나왔다. 그러나 이번엔 예외였다.’
셋째날 이모는 겨우 일어나서 머리를 빗고 얼굴을 씻었다. 아래로 내려온 사산아의 발가락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기 뱃속으로 밀어넣었다.
‘넷째날 이모는 여동생을 불러오게 했다. 그때 불려온 여동생이 바로 우리 어머니였다. 큰 이모는 모기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당부했다. ‘동생아, 절대로 시집가지 마라. 시집만 안가면 애를 낳지 않아도 된다. 알겠니?’ 어머니는 머리를 끄덕여 보였다. 그날 밤 이모는 죽었다. 외할머니는 정신없이 울었다. 이모가 죽을 때 아랫도리에서 썩은 냄새가 물씬 났다. 관속으로 옮길 때 그녀의 아랫도리에선 썩은 고깃덩어리가 아래로 쏟아져 내려왔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썩는 냄새가 풍기는 그런 시체를 집에다 더 이상 둘 수 없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대강 서둘러 장례를 치르곤 곧 매장을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결혼을 했고 딸만 일곱을 낳았다. 화자는 이 중 여섯째 딸이다. 이 소설은 딸부잣집의 여성 수난사를 그리고 있는 듯하지만 그것은 표피적인 이야기 구조에 지나지 않는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아버지라는 인물이 전면에 등장한다.
아버지는 처음 완벽에 가까운 인물로 나타난다. 가정에서는 엄격했으며 일제가 침략했을 때는 국민당 편에서 전쟁을 했고 혁명의 와중에는 공산당에 입당해 싸웠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고 자식도 아버지를 대자보에 회부할 수 있는 시절이 되자 아버지의 권위가 흔들린다.
아버지가 죽을 때 숨겨둔 여인이 있음이 드러난다. 영결식장에 그 여인의 자녀들이 꽃바구니를 들고 나타났다 사라진다. 어머니는 꽃바구니의 꽃을 쥐어뜯으면서 통곡한다. 그건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한 것인가, 아버지의 배신을 슬퍼한 것인가. 자녀들은 이제 각기 자기 영역을 찾아 떠나갈 것이고 중국의 늙은 대륙 같은 어머니는 텅빈 집에서 새로운 싸움을 해야 한다.
저자는 47년 태어나 문혁기간 중 농촌생산대에 참가한 경험을 가진 전형적인 신시기(新時期) 여성작가다. 원제 ‘性別:女’.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
스타일 >
-

오늘의 운세
구독
-

동아광장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트렌드뉴스
-
1
다카이치가 10년 넘게 앓은 ‘이 병’…韓 인구의 1% 겪어
-
2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3
상호관세 대신 ‘글로벌 관세’…韓 대미 투자, 반도체-車 영향은?
-
4
송가인 LA공연 펑크…“비자가 제때 안 나와”
-
5
‘면직’ 산림청장, 술 취해 무법질주…보행자 칠뻔, 車 2대 ‘쾅’
-
6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
7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8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9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10
‘신격호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향년 85세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3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4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5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6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7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8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
9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
10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트렌드뉴스
-
1
다카이치가 10년 넘게 앓은 ‘이 병’…韓 인구의 1% 겪어
-
2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3
상호관세 대신 ‘글로벌 관세’…韓 대미 투자, 반도체-車 영향은?
-
4
송가인 LA공연 펑크…“비자가 제때 안 나와”
-
5
‘면직’ 산림청장, 술 취해 무법질주…보행자 칠뻔, 車 2대 ‘쾅’
-
6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
7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8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9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10
‘신격호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향년 85세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3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4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5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6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7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8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
9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
10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스타일]'비대칭형' 헤어컷…중성미가 찰랑 찰랑](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2/01/17/684566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