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구제역· AI의 교훈… 축산시스템 바꾸자]<上>지옥 같은 축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4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항생제 사료-주사로 버텨… 햇빛 보는 날? 도축장 가는 날!

10일 돼지 사육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의 A양돈농장을 찾았다. 돼지 11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농장이었다.
A농장을 취재하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양돈 농가들이 한결같이 기자의 방문을 꺼렸기 때문이다. 돼지 농장은 사육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같은 양돈업자끼리도 농장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결국 기자는 현지 축산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A농장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단, 이 관계자는 “전국 어디나 상황은 비슷하니 지역 이름은 밝히지 말아 달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A농장을 운영하는 50대 사장 김명진(가명) 씨는 우선 막 낳은 새끼돼지를 키우는 ‘인큐베이터’를 보여주겠다며 안내했다. 김 씨가 멈춰선 곳은 공사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앞. ‘창문 하나 없는 양철 건물 안에 뭐가 있다는 걸까’ 생각하는 순간, 김 씨가 컨테이너 박스의 쇠문을 열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안을 꽉 채우고 있는 새끼돼지 120여 마리가 나타났다.
이어 우리는 ‘인큐베이터’ 바로 옆 비육돈 축사로 이동했다. 살이 찌면 도축돼 삼겹살, 목살 등으로 팔려나갈 돼지들이 자라는 곳이다. 비육돈 축사 문이 열리는 순간 기자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첫째는 눈앞의 광경에 놀랐기 때문이고, 둘째는 축사에서 ‘훅’ 하고 풍겨 나오는 분뇨 가스에 눈이 몹시 쓰라렸기 때문이다.
잠시 뒤 호흡을 멈추고 눈을 뜨자 시멘트 옹벽으로 된 축사 내부가 눈에 들어왔다.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벽과 천장에는 거대한 거미줄이 커튼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 안을 파리 수천 마리가 윙윙대며 날아다녔다. 돼지들은 대부분 죽은 듯 누워 있었다. 김 씨는 “120평(약 400m²) 공간에 320마리 정도 자란다”며 “이곳에서 돼지들이 사료도 먹고 잠도 자고 똥오줌도 싼다”고 말했다.
○ 악취와 가스 가득한 축사
축사 바닥에서 올라오는 악취는 숨을 참고 있어도 코가 매울 정도로 강력했다. 돼지들 역시 축사 가득한 가스 때문에 눈동자가 시뻘겋게 충혈돼 있었다. 축사 안 공기는 뜨끈했다. 김 씨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환풍기”라며 “환풍기가 꺼지면 돼지들이 다 죽는다”고 말했다. 동행한 축산공무원은 “환경이 이렇다 보니 돼지들에게 호흡기 질환은 제일 흔한 병”이라며 “항생제 섞은 사료를 꾸준히 먹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돌아본 현장 중에서 가장 심각한 곳은 돼지들의 임신과 분만 환경이었다. 임신 축사의 어미돼지들은 비육돈과 달리 몸을 옴짝달싹할 수 없는 ‘케이지(틀)’에 갇혀 사육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미돼지들은 출산을 며칠 앞두고 분만 축사로 옮겨지는데, 분만 축사라는 곳에 가보니 축사 안은 온통 두꺼운 쇠파이프로 된 ‘분만 케이지’로 가득 차 있었다. 케이지는 100여 개나 됐다. 김 씨는 “수십 마리의 새끼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케이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그 안에 넣어두면 알아서 새끼를 낳는 것”이라고 했다. 빛이 전혀 들지 않는, 가스와 악취로 가득한 이곳은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라기보다는 ‘번식 공장’에 가까워 보였다.
같은 날 오후, 이번에는 또 다른 지역의 B양계농장을 찾았다. 현장에 가보니 밀집 정도로만 따지면 닭의 사육환경이 돼지보다 더 열악했다.
B농장주 최혁수(가명) 씨는 275평(약 910m²) 크기의 축사 한 동에서 닭 3만2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숫자가 가능할까. 축사 구조를 보니 우선 60×60×60cm 크기의 케이지 한 칸에 닭 8마리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케이지 4000여 개가 4열 4단으로 건물 끝까지 들어차 있었다. 국내 산란닭 농가에서 일반적인 일명 아파트형 사육 구조였다.
최 씨는 “나는 케이지를 4단까지만 올렸지만 서울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8단, 9단까지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그렇게 하면 축사 한 동에서 8만 마리 가까이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닭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무척 비좁았다. 닭들은 운동은커녕 케이지 안에서 자리를 뒤바꾸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최 씨는 자신이 사육 규정보다 넓게, 합법적으로 닭을 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사실이었다. 축산법이 정한 국내의 산란닭 사육면적 규정은 0.042m²로, A4 용지 한 장(0.062m²) 크기보다도 작기 때문이다. 최 씨는 “규정보다는 넓게 키우고 있지만 지금도 닭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사실”이라며 “닭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리로 앞 닭의 항문을 쪼아 산란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보통 병아리 시절 주둥이에 강한 광선을 쏘아 부리를 둥글게 만든다”고 말했다.
밀집사육 구조에서는 병에 걸린 닭 한 마리 때문에 다른 수만 마리가 감염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산란닭들은 병아리 시절부터 백신과 항생제를 여러 차례 맞고 있었다. 최 씨는 “병아리가 태어나서 105일이 될 때까지 뉴캐슬병, 기관지염, 대장균 감염 등 각종 전염성 질환을 막기 위한 주사를 10회 이상 놓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키워진 산란닭은 1년 뒤 산란율이 떨어지면 도축돼 식용으로 팔려나간다고 했다.
○ 소규모 무허가 소 축사 난립

소 사육 실태를 보기 위해 찾아간 C지역. 이 지역 곳곳에서는 일반 농가에 별채처럼 딸린 소규모 축사를 여럿 볼 수 있었다. 겉보기엔 영락없는 비닐하우스인데, 안에 들어가면 소가 대여섯 마리씩 있는 식이다. 마리당 공간은 1평(3.3m²)도 채 안 돼 보였다. 당연히 분뇨처리 시설도 없었다. C지역 관계자는 “우리 지역 축산 농가 중 80% 이상이 이런 ‘부업축산’ 농가”라며 “등록도, 관리도 되지 않는 곳이 많아 방역을 할 때 가장 문제”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소도 사람처럼 햇빛과 운동이 최고의 보약”이라며 “하지만 이 소들은 도축장 가는 날이 햇빛 보는 날”이라고 말했다. 박창길 성공회대 경영학과 교수는 “생지옥과 다름없는 집단사육에 대해 이제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생명으로서의 가축에 대한 최소한 배려가 있어야 국민 건강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 가축 ‘벌집사육’ 왜 많을까 ▼
“육류소비 늘며 산업화… 경제성만 추구 역효과”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육류 소비 증가로 축산업은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한 산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밀집사육은 이런 빠른 성장의 그늘인 셈이다. 1990년 19.9kg이던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2000년 32.0kg, 2009년 36.8kg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축산업도 점차 대형화, 산업화됐다. 전국에서 사육되는 한우 및 육우는 1990년 162만2000마리에서 2010년에 292만1000마리로 늘었다. 돼지는 1990년 452만8000마리에서 2010년 988만1000마리로, 닭은 7446만3000마리에서 1억4919만9000마리로 늘어났다.
또 2003년 68%이던 전업농 사육 비중은 2009년 85%까지 늘어났다. 소의 경우 50마리 이상, 돼지는 1000마리 이상, 닭은 3만 마리 이상 기르는 농가를 전업농으로 분류한다. 결국 대량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강국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성균관대 명예교수)은 “축산을 산업 측면으로만 바라보고 경제성만을 추구하다 보니 좁은 공간에서 사육되는 사례가 많다”며 “충분한 운동을 못한 채 자란 가축이 몸이 약하고, 따라서 병에 약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밀집사육된 가축들은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 분비가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대구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연구진의 2007년 발표 논문에 따르면 밀집사육으로 키워진 돼지와 닭의 코르티솔 분비가 자연적인 환경에서 자란 돼지, 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밀집사육으로 키워진 닭들에서는 코르티솔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 코르티솔은 장기간의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기능이 있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측은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을 설정했다고 해도 이를 적발할 인력 등이 부족해 실효성이 없다”며 “일부 지역은 축산농가가 밀집해 질병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축산농가가 밀집한 경기 김포와 파주, 여주, 이천 등은 구제역으로 일부 지역 돼지의 60∼95%가 도살처분되기도 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트렌드뉴스
-
1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2
1983년 이후 최대 폭락…워시 쇼크에 오천피 붕괴-亞 ‘블랙 먼데이’
-
3
“놓지마!” 애원에도…술 취해 어린아들 7층 창문에 매단 아버지
-
4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5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
6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7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8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9
마약밀수 총책 잡았더니,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다
-
10
“까치발 들고 물 1.5L 마시기”…50대 매끈한 다리 어떻게? [바디플랜]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
8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
9
이준석 “與-정부 다주택자, 5월9일까지 집 팔 건가”
-
10
李, 국힘 직격 “망국적 투기 옹호-시대착오적 종북몰이 이제 그만”
트렌드뉴스
-
1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2
1983년 이후 최대 폭락…워시 쇼크에 오천피 붕괴-亞 ‘블랙 먼데이’
-
3
“놓지마!” 애원에도…술 취해 어린아들 7층 창문에 매단 아버지
-
4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5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
6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7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8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9
마약밀수 총책 잡았더니,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다
-
10
“까치발 들고 물 1.5L 마시기”…50대 매끈한 다리 어떻게? [바디플랜]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
8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
9
이준석 “與-정부 다주택자, 5월9일까지 집 팔 건가”
-
10
李, 국힘 직격 “망국적 투기 옹호-시대착오적 종북몰이 이제 그만”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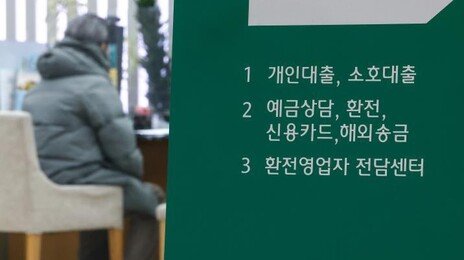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