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광화문에서/임규진]화물연대와 택배업체
-
입력 2006년 1월 26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말 ‘택배차량 증차(增車) 제한을 풀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택배업체들은 주문 물량이 업체별로 연 25∼40% 증가하는데도 운송차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2004년 4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화물차량을 증차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체 화물시장에서 적정 대수를 넘는 차량이 4만7000여 대에 이르러 증차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과당 경쟁은 모두를 망하게 할 수 있어 경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얼핏 듣기에 그럴듯한 설명이다. 하지만 사실은 운송을 거부하며 파업을 벌였던 화물연대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문제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다. 소형 화물차와 대형 화물차를 가리지 않고 증차를 규제한 탓에 화물연대와 무관한 택배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5t 이상 대형 화물차 위주의 화물연대 시장(市場)과 1t 미만 소형차 위주인 택배업체 시장은 거의 겹치지 않는데도 왜 일괄 규제를 했을까. 건설교통부 측은 “택배업은 별도의 화물운수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택배업체만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건교부의 이런 태도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를 드러내는 것이며 파업이나 시위라도 해야 떡을 준다는 ‘한국적 진실’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소형 화물차 증차 규제는 택배산업의 성장을 막을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불편과 경제활동의 불이익을 준다. 택배업체들은 고객의 주문을 받고도 운송차량이 모자라 즉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형 화물차의 증차를 억제해도 고객이 겹치지 않는 화물연대의 경영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본보는 ‘규제만 풀어도 실업자 줄일 수 있다’는 제목의 13일자 사설을 통해 화물차 증차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올해 택배업을 별도의 화물운송업종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증차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쟁을 제한해 불합리한 이권(利權)을 낳는 규제, 소비자 편익(便益)을 해치는 규제, 행정 당국이 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규제 등 ‘저질 규제’는 이뿐이 아니다. 정부는 위원회도 만들어가며 규제 완화를 되뇌지만 그 속도는 더디고 실적도 미미하다.
정부는 세금 더 걷어 ‘나눠 주기 식’ 복지의 천사(天使)가 되려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분배 개선도, 양극화 해소도 어렵다. 세계적으로 실험이 끝난 사실이다. 저질 규제를 대폭 줄이기만 해도 투자가 늘고 일자리도 더 생긴다. 그러면 분배도 개선되고 납세자들의 세금 고생도 덜어 줄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증세(增稅)에 급급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임규진 논설위원 mhjh22@donga.com
광화문에서 >
-

사설
구독
-

부동산 빨간펜
구독
-

현장속으로
구독
트렌드뉴스
-
1
오늘 밤 서울 최대 10㎝ 눈폭탄…월요일 출근길 비상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5
비트코인, 9개월만에 7만 달러대로…연준 의장 워시 지명 영향
-
6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7
이광재 “우상호 돕겠다” 지선 불출마…禹 “어려운 결단 고마워”
-
8
“평생 취미 등산 덕분에 88세 성균관장 도전” 설균태 성균관 고문회장[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
9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
10
홍석천 “부동산에 속아 2억에 넘긴 재개발 앞둔 집, 현재 30억”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4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5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6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7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8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9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10
코스피 불장에도 실물경기 꽁꽁… ‘일자리 저수지’ 건설업 바닥
트렌드뉴스
-
1
오늘 밤 서울 최대 10㎝ 눈폭탄…월요일 출근길 비상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5
비트코인, 9개월만에 7만 달러대로…연준 의장 워시 지명 영향
-
6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7
이광재 “우상호 돕겠다” 지선 불출마…禹 “어려운 결단 고마워”
-
8
“평생 취미 등산 덕분에 88세 성균관장 도전” 설균태 성균관 고문회장[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
9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
10
홍석천 “부동산에 속아 2억에 넘긴 재개발 앞둔 집, 현재 30억”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4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5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6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7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8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9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10
코스피 불장에도 실물경기 꽁꽁… ‘일자리 저수지’ 건설업 바닥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광화문에서/조동주]162석 여당의 덧셈 정치, 107석 야당의 뺄셈 정치](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30/133269805.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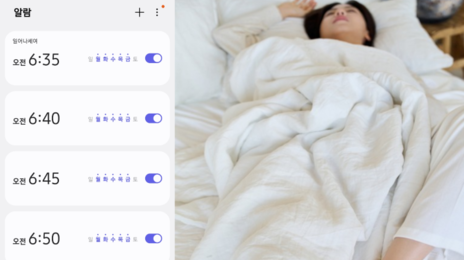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