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이웃의 지식을 탐하라/빈스 에버르트 지음·조경수 옮김/268쪽·1만3000원·이순

저자는 다이어트나 친환경, 지구 온난화 문제 등 세상 모든 일에 대해 대세를 무조건 믿지 말고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자고 자꾸 발을 건다.
세간에서는 너무 많이 먹고 적게 움직여서 뚱뚱해진다고 하지만 영양섭취와 운동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오히려 수면부족이 비만을 유발하고 체중은 대부분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지의 다이어트 팁은 ‘먹는 양을 반으로 줄여라’가 아니라 ‘다른 조부모를 찾아라’가 되어야 더 정확하다는 것이다. ‘유기농 식품만 먹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는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린 영양식품연구처의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친환경이나 유기농이 대체 종교와 같은 지위를 갖는 세태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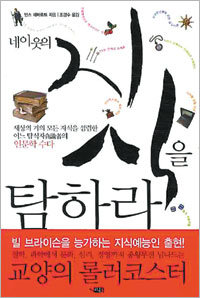
저자의 오지랖은 이상형 애인을 고르는 법까지 건드린다. 수학자들이 ‘n개의 물체들 중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최고의 것을 찾는가’라는 궁금증에서 찾은 해답이 애인 찾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 저자는 이른바 ‘37% 방법’을 내세운다. 37%의 대상자로 최고의 기준을 정한 뒤 나머지 63% 중에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최고의 남자를 고르는 것이다. 37%에 조지 클루니가 있더라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미안하지만 남자들은 배우자 선택 게임에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저자의 농 섞인 주장이다.
저자는 뇌는 학습을 하는 최적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즐거움은 과학적으로 섹스보다 즐거울 수 있다고 전한다. 또 노인이 간호사에게 무턱대고 손을 뻗는 것은 절제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쇠퇴에 있다고 소개한다.
저자는 과학자들이 100년 전보다 인간의 수명을 2배나 늘렸음에도 핵 위협, 환경오염의 책임이 그들에게 떠넘겨진다고 안타까워한다. 유전자변형 옥수수 밭을 망가뜨리는 환경운동가는 영웅이 되고 파킨슨병 특효약을 만들기 위해 동물실험을 하는 신약 개발 연구자들은 경멸당하는 현실이다.
원제는 ‘스스로 생각하라(Denken Sie selbst!)’이다. 그 다음에 이웃의 지식을 탐해야 한다. 책이 재미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부제에 나오는 ‘세상의 거의 모든 지식을 섭렵한’이라는 수식어는 너무 나갔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인문사회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구독
-

어린이 책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성심당 임대료 논란에…대전시 “역 앞 市 공간, 대안될 수 있어”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아름다운 치앙마이 노천탕 숙소…밤 되자 욕조에 벌레떼 우글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현대전의 창과 방패 ‘전파 공격’…드론·항공기 납치도 가능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책의 향기]“콩나물 팍팍 무쳤냐”… 국민 울고 웃긴 예능史](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8/02/10/88603498.1.jpg)
![[책의 향기]오랜 헌신이 고통으로… 가족 간병 사회의 비극](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8/02/10/88603452.1.jpg)
![[책의 향기]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결심했다, 용서하기로](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8/02/10/88603427.2.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