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소설]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270>卷四. 흙먼지말아 일으키며
-
입력 2004년 10월 3일 19시 01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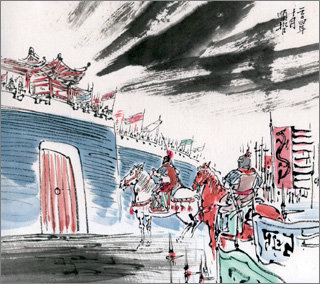
하지만 대왕께서는 낙양에서 군사를 물려 관중으로 돌아가시고, 사마앙의 속셈만 항왕에게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사마앙의 부장 가운데 하나가 팽성으로 달려가 항왕에게 그 일을 고자질한 탓이었습니다.
성이 난 항왕은 객경(客卿)으로 데리고 있던 진평(陳平)이란 자에게 군사를 주고 가만히 은왕 사마앙을 치게 했습니다. 진평은 형왕(兄王=魏王 咎)밑에서 태복(太僕) 노릇을 하다가 죄를 짓고 항왕에게로 달아난 자입니다. 하내 땅의 사정에 밝은 형왕의 옛 신하들과 장수들을 끌어 모아 갑작스레 조가(朝歌)를 치고, 사마앙을 사로잡아 항복을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그게 겨우 두 달 전의 일인데, 사마앙이 어찌 다시 대왕께 항복할 수 있겠습니까?”
위표의 그 같은 말에 한왕 유방은 입맛이 썼다. 그러나 그 진평이 지난날 홍문(鴻門)의 잔치에서 몸을 빼내는 자신을 눈감아주던 바로 그 사람인 줄은 기억해내지 못했다.
“그런 일이 있었던가. 안타까운 일이다….”
한왕은 그러면서 혀를 찼으나, 사정을 알고 보니 하내 땅을 거둬들이는 길은 다시 한번 힘으로 은왕 사마앙을 사로잡는 수밖에 없어 보였다. 더는 따져 묻지 않고 그 일을 슬며시 대장군 한신에게로 미루었다.
사마앙을 사로잡고 하내 땅을 거둬들이라는 한왕의 명을 받은 한신은 그 사이 7만으로 부풀어난 대군을 이끌고 조용히 하동을 떠났다. 하내에 이르자 조참에게 군사 1만을 떼어주며 수무(修武)를 치게 하고, 자신은 나머지 군사를 휘몰아 곧바로 은왕의 도읍 조가를 두껍게 에워쌌다.
성을 에워싼 첫날 한신은 소용없을 줄 알면서도 옛 주인이었던 장이와 전우였던 하남왕 신양을 내세워 은왕 사마앙을 달래보려 했다. 하지만 은왕 사마앙은 이미 그들의 말을 들어줄 처지가 아니었다. 두 달 사이에 두 번이나 주인을 바꾸어 항복을 할 수도 없는 일이거니와, 부모처자가 모두 팽성에 볼모로 끌려가 있었다. 장이와 신양이 번갈아 성벽 아래서 불러대도 성가퀴에조차 나와 서지 않았다. 싸우다 죽어 부모처자라도 살릴 작정이었다.
그날 밤 한신은 장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도읍이라 그런지 조가는 성이 높고 든든하여 힘으로 깨뜨리기에는 어려울 듯하오. 아무래도 꾀를 써서 사마앙을 성밖으로 끌어낸 뒤에 사로잡는 수밖에 없소. 내일부터 장군들은 사졸들을 휘몰아 사방에서 매섭게 몰아치시오. 하지만 되도록이면 사졸들이 상하지 않도록 성을 치는 시늉만 내야 하오. 그러다가 내 명이 있거든 동문 쪽을 슬며시 열어주고 나머지 세 곳만 더욱 불같이 들이치시오. 이때는 구름사다리를 걸고 밧줄을 던지며 장졸이 아울러 성벽 위로 뛰어올라야 하오.”
그러고는 따로 관영을 불러 보기(步騎) 합쳐 5000을 딸려 주며 가만히 일렀다.
글 이문열
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 >
-

기고
구독
-

알쓸톡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소설]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卷四. 흙먼지말아 일으키며](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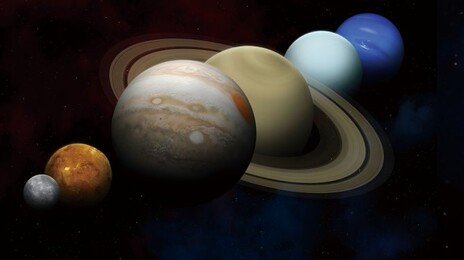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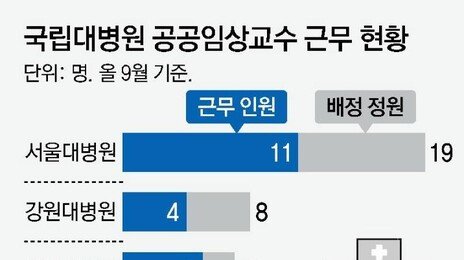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