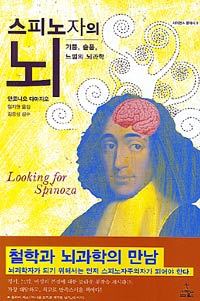
사람들은 말한다. 가슴에 손을 얹은 채. 마음의 소리. 머리가 아닌, 뇌와는 상관없는 마음이 움직인다고. 심장 어디쯤에 뭔가가 존재한다고.
그러나 그건 반쯤 맞는 말이다. 심장은 마음을 관장하지 않는다. 마음은 뇌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뇌, 몸 그리고 마음은 나눠진 별개 기관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선 가슴이 아니라 엉덩이에 손에 올리고 얘기한들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은 공공연해졌지만 이는 최신 과학이 풀어낸 쾌거 중 하나다. 진화론과 뇌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마음 메커니즘’의 실타래를 풀어 왔다. 그런데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뇌과학연구소장인 저자가 보기에 벌써 수백 년 전에 이를 깨친 사람이 있었다. 네덜란드 철학자 바뤼흐 스피노자다.
현대과학자에게 스피노자의 철학은 엄청난 보고다. 표현은 다르지만 그는 몸과 뇌의 상호작용, 생명체와 외부환경의 조화 등을 꿰뚫어봤다. 첨단 뇌 과학을 다루면서 17세기 철학자의 발자취를 찾아가는(원제가 ‘Looking for Spinoza’다) 형식을 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스피노자의 ‘코나투스(conatus)’를 현대 생물학 용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코나투스는 생명체가 신체 내부나 외부 환경의 조건에 직면했을 때 생존과 안녕을 추구하도록 생물체 뇌 회로에 자리 잡은 경향의 총합이라 할 수 있다. … 수많은 생명활동이 뇌에 신호로 전달되고 그곳에서 뇌 특정 부위에 존재하는, 신경세포의 회로로 만들어진 수많은 지도에 표현된다. 바로 느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단계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스피노자가 저술한 ‘에티카(Ethica)’의 21세기 과학 버전이다. 단순히 스피노자의 재해석에 그치는 것도 아니다. 최신 실험의 결과물들을 소개하고 현재 뇌과학이 이룩한 성과를 보여준다. 또한 여전히 탐구되어야 할 영역, 이를테면 신경 패턴이 심적 이미지로 이어지는 과정의 모호성 등도 함께 진단한다.
저자에 따르면 뇌 활동의 일차적 목표는 뇌를 포함한 몸의 ‘안녕’이다. 외부 환경을 접한 육체가 물리적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조절해 생명 활동을 유지한다. 이런 기본 목표가 달성되면 이차적 목표, 즉 시를 짓거나 우주선을 설계하는 복잡한 활동을 벌인다.
마음 메커니즘도 여기서 작용한다. 인간과 같은 고등동물에게 뇌의 조절작용은 심적 이미지 또는 생각의 생성과 조작에 의존한다. 시각이나 촉각 등이 감지하는 기본적인 외부 이미지부터 미래의 반응을 예측하고 계획하는 모든 이미지까지 ‘지도화’된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마음’이라고 부른다.
무엇보다 이 책의 매력은 자연과학과 철학 간의 절묘한 줄타기에 있다. 각각의 분야에선 난해했던 내용이 교류를 통해 진일보함은 물론 알기 쉽게 설명된다. 특히 저자는 스피노자의 생애에 한 장이나 할애해 실체이원론을 극복한 철학사적 배경까지 들려준다. 진짜 ‘통섭’이란 무엇인지, ‘스피노자의 뇌’가 제대로 보여준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비만탈출
-

오늘의 운세
구독
-

정용관 칼럼
구독
-

특파원칼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세종 아파트단지서 2세 아이 택배차에 치여 숨져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당 “특검 수용해야”… 대통령실 “국회서 논의를”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무면허로 운전 업무 중 사고…法 “직접적인 원인 아니면 업무상 재해”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비만탈출]어깨-팔 날씬하게…](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