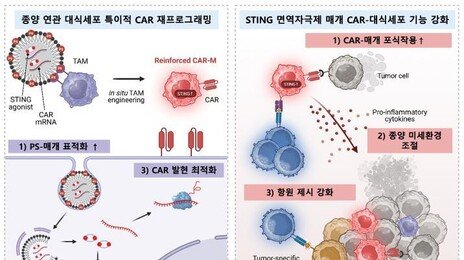공유하기
[마이라이프 마이스타일]최애기/3개 세기에 걸쳐 살기
-
입력 1999년 12월 28일 19시 48분
글자크기 설정

나는 1895년 5월10일생이고 이름은 ‘애기’입니다. 원래 이름은 ‘차현’이었는데 열서너살쯤 되었을 때 인구조사 나온 면직원에게 “그냥 작은애기(둘째 며느리)예요”하고 둘러댄 것이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혼란통에 끌려가기라도 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고향은 전남 화순군, 해주 최씨 핏줄입니다.
열여덟살에 전남 나주군 다도면 풍산리로 시집을 왔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았습니다. 자식은 넷(3남1녀), 손주는 열일곱(6남11녀), 증손주는 서른둘(19남14녀), 고손주는 두명(2녀)입니다.
며느리와 마실을 나갈 때 나는 가장 미안합니다. 고부간을 친구지간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서입니다. 며느리는 허리도 굽었고 몸도 나보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나는 “빨리 죽어야지”하는 말은 입밖에 내지 않습니다. 나는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한해가 저무는 이맘때면 장남 양희(71)가 소학교에 다니던 어느 날이 떠오릅니다. 하루는 헐레벌떡거리며 15리 길을 단숨에 달려와 물이 줄줄 흐르는 막대기를 들어보이는 게 아닙니까. 다 녹아가는 ‘아이스케키’였습니다. “어머니, 드셔보세요. 참 달고 맛납니다.” 그때 나는 난생 처음으로 얼음과자를 맛보며 자식이 얼마나 어미를 사랑하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처녀시절 나는 문쟁이(글을 짓는 사람들을 비하해 부르는 말)인 고모를 통해 운좋게도 언문(한글)을 배웠습니다. ‘심청전’을 붓으로 베껴서 외롭고 쓸쓸할 때면 되풀이해 읽었습니다. 셋째 아이 밑으로 두 명의 아이가 사산(死産)되었을 때도 나는 ‘심청전’의 한 대목을 읽으며 눈물을 다스렸습니다. 막내 아들이 마흔줄에 세상을 떠난 것도 두고두고 가슴 아팠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 산기를 느껴 조용히 짚을 한아름 안고 건넌방으로 들어가 혼자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바쁘게 살고 아끼며 산 것 외에는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마을에선 나를 ‘달밤에 나락을 훑는 아낙’이라 부르며 바지런함을 칭찬하고는 했습니다. 일이 없을 때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의사 역할도 해보았습니다. 개똥을 미나리와 함께 빻아서 타박상처에 붙여주면 하나같이들 ‘특효’라며 좋아했습니다.
스무마지기가 넘게 농사를 지어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왜 궁상맞게 옷을 덕지덕지 기워입느냐”며 불평했습니다. 여름 밤이면 밭일을 하느라 곤한 잠에 빠진 내 주위를 밤새 지키며 모기떼를 쫓아줬던 남편을 나는 잊지 못합니다.
남편은 내가 장남 양희(71)를 낳자 ‘가정에서 어린 자녀를 교육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지어 벽에 걸었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데는 속이지 않는 성실함이 근본이다. 자녀에게 작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나 자녀를 크게 오해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이가 아파 약을 권할 때 쓰고 독한 약을 주면서 달다거나 맛있다며 준다면 어린자녀는 부모를 의심원망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본문 중)
아들에게 중학교 공부를 시키지 못한 게 평생의 한(恨)입니다. 아들이 일본 중학교 교과서를 구해와 읽으며 한참 공부에 재미를 붙일 무렵 나는 장질부사에 걸려 석달을 자리에 눕게 됐습니다. 아들은 학교를 내팽개치고 내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마음 속에 묻어두었기 때문인지 아들이 마을 청년단장이나 면의회 의장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나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나는 오늘 아침도 3시에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어 집안을 환기시키고 마루를 쓸었습니다. 손자들의 동화책과 신문을 넘기며, 뜻은 모르지만 읽을 수 있는 큰 글씨들은 모조리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동네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3개 세기(世紀)를 사시네요”하고 내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세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루빨리 날씨가 풀려 증손자들과 커다란 밤을 따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애기할머니는 장손이자 손자인 홍성수씨(45)와 손주며느리 정옥단씨(40)부부의 서울 종로구 신교동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리〓이승재기자〉sjda@donga.com
▼여성지 '삼천리' 32년12월호, 신식여성 정조-연애관 설문▼
“여학생들의 사상이 지금 몹시 동요하고 있다. 사회 자체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몹시 동요하고 있는 이즈음이니 또한 현대의 공기를 마시고 있는 여학생들의 사상과 감정이 동요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최근에는 그 경향이 더욱 현저함을 느끼게 한다….”
29년 창간된 대중 여성지 ‘삼천리’. 32년 12월호에서 ‘신식여성’들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변화하는 여성의 정조와 연애관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의 한 여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뿌르(부르주아·회사 중역, 지주, 거상(巨商), 귀족집의 딸로 규정)’와 ‘푸로(프롤레타리아·졸업 후에 부모와 형제를 돕고 살아야 하는 중산계급이하의 가정의 딸로 규정)’로 나누어 각각 100명을 조사. 당시 미혼여성들은 지금 여성들과 얼마나 다른 의식을 갖고 있었을까. 다음은 조사결과.
▽결혼과 여학생의 정조관
Q. 결혼하기까지 처녀대로 있고 싶노라.
뿌르(A)〓78명 푸로(B)〓85명
Q. 결혼은 한개의 모험이므로 처녀대로 있고 싶지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므로 정조에 구애받지 않노라.
A〓44명 B〓63명
Q. 결혼 전에 어느 정도 향락(정조를 버리며 논다는 뜻)하고 싶노라.
A〓23명 B〓16명
▽결혼을 함에는?
Q. 연애로부터 결혼에 들고 싶노라.
A〓98명 B〓67명
Q.부모의 매개로서 결혼하고 싶노라.
A〓0명 B〓33명
Q. 양친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결혼하겠노라.
A〓33명 B〓6명
Q. 한평생 남편에게 정조를 지키겠노라.
A〓75명 B〓83명
Q. 자식을 낳지 않을 방법을 알고 있노라.
A〓79명 B〓100명 중 37명
〈이승재기자〉sjda@donga.com
PPA 감기약 : PPA 논란 : PPA 감기약 영향 >
-

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
구독
-

알쓸톡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