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날 늦게 잠들 때까지도 눈의 기척이 없었는데 언제 내렸는지 하얗게 쌓여 있었다. 눈빛은 참으로 환하다. 창을 열지 않아도 그 빛이 안을 은은하고 환하게 비춰준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마침 북한산 근처라 산은 어떤가 하고 산이 보이는 쪽 방 블라인드를 걷었더니 흰 눈이 겨울 산을 고요하게 덮어주고 있었다. 그 모습이 깨끗하게 나이 먹은 분을 약속 없이 우연히 만난 듯한 반가움을 주었다.
나는 홀로 마음이 답답하면 내가 혼자서 사랑하는 분을 생각하곤 한다. 마음속에 그런 분이 몇 분 살고 계신다. 내가 흠모하는 분들은 깨끗이 늙은 분들이시다. 아마 나도 그처럼 늙고 싶은 욕망이 내 마음속에 그분들을 모셔둔 걸 게다. 생각하는 것만으로 성이 안 찰 때는 문득 전화를 드리고 그분을 찾아가기도 한다. 그분은 저이가 까닭 없이 찾아와 저러고 앉아 있구나, 하겠으나 내겐 마주앉아 있는 것만으로 그분의 존재는 눈빛과 같다. 그 빛을 쬐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
깨끗하게 늙은 분을 만난 듯이 기쁜 마음으로 눈이 쌓인 북한산을 내다보고 있는데 한 처녀가 생각났다. 몇 해 전에 내게 무슨 일을 함께 하자며 찾아와서 보게 된 처녀였는데 내가 별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 일은 잘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도 그녀는 가끔 내게 전화를 했다. 내가 어디에 가 있으면 찾아오기도 하고 봄이 오거나 가을이 오면 봄이 왔다고 가을이 왔다고 건강하라고 내 자동응답기에 목소리를 남기기도 했다. 얼굴이 희고 키가 알맞게 크고 볼 적마다 옷차림도 수수하게, 그러나 세련되게 입고 말도 조리있게 할 뿐 아니라 인간에 대해 편견이나 냉소가 적은 사람으로 여겨져 나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때로 내 윗사람처럼 여겨질 적도 있었다. 생각 같아서는 가끔 만나서 맛있는 것도 함께 먹고 차도 마시며 세상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듣고 싶기도 했으나 시간이 그리 되지 않았다. 그래도 그녀는 잊을 만하면 전화를 했다. 일을 쉬어야 할 만큼 몸이 아픈 적도 있는 것 같았고, 영화와 관계되는 일을 다시 찾아 하는 것도 같았다. 언제 한번 보자고 말만 하며 시간이 흘러갔다.
그러다가 지난 가을이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북한산 등반을 한 모양이었다. 다음날 내게 전화를 걸어서 그녀가 물었다. 북한산에 터널을 뚫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녀는 자신은 처음 북한산에 다녀왔는데 서울에 이만한 산이 있다는 것에 감명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그곳에 터널을 뚫는다고, 그건 안될 일이라고 했다. 마음이 아프기까지 하다고 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일단 주변 친구들과 힘을 모아서 북한산에 터널을 뚫는 걸 반대하는 모임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나보고 자기와 생각이 같지 않느냐고 물었다. 선생님은 북한산을 사랑하니까 더 하시죠? 그랬다. 그녀는 그 일로 그후로도 몇 번 전화를 걸어왔는데 나는 그때마다 그녀와 통화를 오래할 상황이 못되었다. 그래서 좀 퉁명스럽게 구체적으로 안이 서면 그때 다시 전화를 하라고 했다.
성탄절날 아침에 눈이 쌓인 북한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야 그녀로부터 지금까지 다시 전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내게 실망했나 보다. 솔직히 그녀가 북한산 터널 뚫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모임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나는 속으로 그게 무슨 힘이 될까? 생각했다. 그런다고 그게 안 뚫리겠는가, 괜한 헛수고지, 싶었던 것이다. 몇 번 통화하는 중에 그녀가 내 속마음을 알아차린 게 분명하다. 구체적으로 안이 서면 전화하라고 했으니 얼마나 얄미웠겠는가. 그녀로서는 함께 안을 만들자는 얘기였을 텐데. 여하튼 그녀는 분명 그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도 나쁘다. 갑자기 북한산을 바라보기가 민망해진 아침이었다. 누구보다 북한산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 아니었던가. 이제,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봐야겠다.
신경숙 소설가
김유준의 재팬무비
-

그 마을엔 청년이 산다
구독
-

어린이 책
구독
-

동아광장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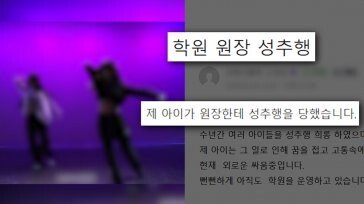
‘성추행 의혹’ 댄스학원 원장, 알고보니 아동 성범죄 전과자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국혁신당 “축하난 거부가 옹졸? ‘거부왕’ 尹이 쫄보”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리세요!” 태국서 보트 침몰하는 순간…승객들 구조한 韓남성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유준의 재팬무비]멋진 캐릭터만 만들면 만사형통](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