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향기]인류-영장류 운명 가른 진화의 마지막 퍼즐
- 동아일보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교육-협동 등 ‘공진화’ 활용한 결과
‘자연 선택’ 넘어선 진화 가능해져
◇다윈의 미완성 교향곡/케빈 랠런드 지음·김준홍 옮김/536쪽·2만6000원·동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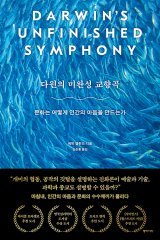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340만 년 전 깨진 돌조각으로 짐승의 고기를 잘랐다. 최초의 직립 인류인 호모 에렉투스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주먹 도끼를 사용했다. 호모 사피엔스는 9만 년 전엔 송곳 작살 등 간단한 도구, 4만 년 전엔 바늘 같은 정교한 도구를 만들었다. 이제 인간은 자동차, 비행기, 우주선처럼 복잡한 도구를 사용해 문명을 발달시킨다.
반면 인간과 유전자가 98.5% 같은 침팬지는 거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돌로 견과류를 쳐서 깨 먹거나 나무 막대기를 개미집에 쑤셔 넣었다 뺀 뒤 개미를 훑어 먹는 정도에 불과하다. 일부 도구를 사용하는 다른 동물도 수준이 지극히 낮다. 왜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엔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걸까.
영국 세인트앤드루스대 진화생물학과 교수인 저자는 다른 개체가 서로 영향을 끼치며 진화하는 ‘공진화(共進化)’를 인간이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영국 생물학자 찰스 다윈(1809∼1882)은 동물이 기후, 포식자, 질병에서 강한 자만 살아남는 ‘자연 선택’에만 의존해 진화했다고 봤지만, 인간의 공진화는 간과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특히 공진화에 문화가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책을 집필하고, 언어로 소통하는 문화적 능력을 바탕으로 인간이 지식을 공유하고 축적해 왔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인간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문화를 만든 게 아니라, 문화 덕에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인공지능(AI) 시대, 인간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적지 않다. 어쩌면 ‘자연 선택’에서 인간은 빅데이터를 학습한 AI에게 밀릴지 모른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세계를 구축함으로써 스스로를 빚어내는 독특한 종”이라는 저자의 말처럼 소통할 줄만 안다면 인간은 다시 한번 ‘자연 선택’을 벗어나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한동훈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올것…우리가 보수 주인”
-
2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국힘 내홍 격랑속으로
-
3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는 ‘이 방향’이 맞는 이유
-
4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서 韓 빠지겠다는것” 이례적 공개 비판
-
5
삼성전자, 보통주 566원·우선주 567원 배당…“주주 환원”
-
6
美 ‘이건희 컬렉션’ 갈라쇼…이재용-러트닉 등 거물들 한자리에
-
7
홍준표 “김건희 도이치 굳이 무죄? 정치판 모르는 난해한 판결”
-
8
용산-태릉-과천 등 수도권 51곳에 6만채 공급
-
9
떡볶이 먹다 기겁, 맛집 명패에 대형 바퀴벌레가…
-
10
“문 열린 댐 강물처럼 흐르는 눈”…인도 오지 희귀 현상 포착(영상)
-
1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국힘 내홍 격랑속으로
-
2
홍준표 “김건희 도이치 굳이 무죄? 정치판 모르는 난해한 판결”
-
3
李 “국민의견 물었는데…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
-
4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서 韓 빠지겠다는것” 이례적 공개 비판
-
5
[단독]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
6
[속보]장동혁 국힘 지도부, 한동훈 제명 확정
-
7
‘소울메이트’서 정적으로…장동혁-한동훈 ‘파국 드라마’
-
8
법원 “김건희, 청탁성 사치품으로 치장 급급” 징역 1년8개월
-
9
李 ‘설탕 부담금’ 논의 띄우자…식품업계 “저소득층 부담 더 커져”
-
10
한동훈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올것…우리가 보수 주인”
트렌드뉴스
-
1
한동훈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올것…우리가 보수 주인”
-
2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국힘 내홍 격랑속으로
-
3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는 ‘이 방향’이 맞는 이유
-
4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서 韓 빠지겠다는것” 이례적 공개 비판
-
5
삼성전자, 보통주 566원·우선주 567원 배당…“주주 환원”
-
6
美 ‘이건희 컬렉션’ 갈라쇼…이재용-러트닉 등 거물들 한자리에
-
7
홍준표 “김건희 도이치 굳이 무죄? 정치판 모르는 난해한 판결”
-
8
용산-태릉-과천 등 수도권 51곳에 6만채 공급
-
9
떡볶이 먹다 기겁, 맛집 명패에 대형 바퀴벌레가…
-
10
“문 열린 댐 강물처럼 흐르는 눈”…인도 오지 희귀 현상 포착(영상)
-
1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국힘 내홍 격랑속으로
-
2
홍준표 “김건희 도이치 굳이 무죄? 정치판 모르는 난해한 판결”
-
3
李 “국민의견 물었는데…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
-
4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서 韓 빠지겠다는것” 이례적 공개 비판
-
5
[단독]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
6
[속보]장동혁 국힘 지도부, 한동훈 제명 확정
-
7
‘소울메이트’서 정적으로…장동혁-한동훈 ‘파국 드라마’
-
8
법원 “김건희, 청탁성 사치품으로 치장 급급” 징역 1년8개월
-
9
李 ‘설탕 부담금’ 논의 띄우자…식품업계 “저소득층 부담 더 커져”
-
10
한동훈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올것…우리가 보수 주인”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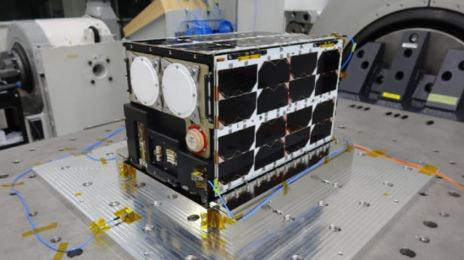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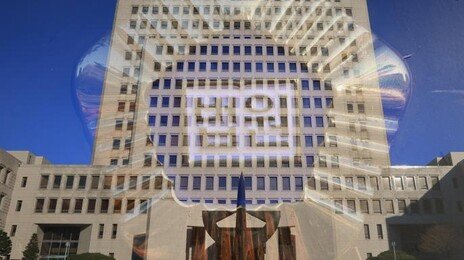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