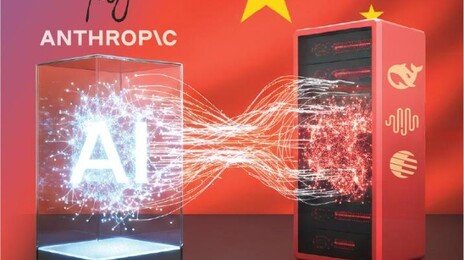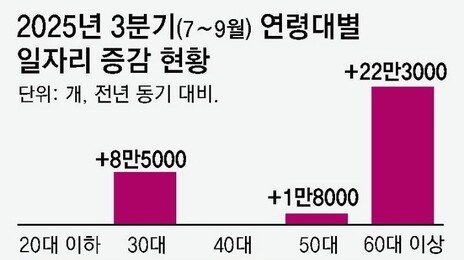공유하기
[내 고향의 봄]<3>이순원, 대관령 산자락 '노란 전령'
-
입력 2001년 4월 5일 18시 35분
글자크기 설정
나는 그 품에서 태어나 그 품에서 자랐다. 지난 겨울, 눈에 대한 이런 경전도 썼다. 오오, 신성한 것. 내가 당신의 품 안에서 자랐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나처럼 당신을 경배하고 당신의 품 속에 귀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특히 내린 다음 금방 녹고 마는 봄 눈들은 내게 더욱 그렇다. 다른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해도 대관령에 마지막 봄 눈이 내린 게 언제인지만은 여름까지도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매년 그 기록이 갱신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봄을 이길 겨울 장사는 없는 법, 그 봄눈이 내리기 전 그곳을 다녀왔을 때, 이미 산에 봄은 성큼 와 있었다.
산중이라 어느 곳보다 더디 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봄은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엔 눈쌓인 산에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다. 작은 물줄기를 따라, 산과 산 사이의 계곡으로 부는, 아직은 찬 바람속에도 봄의 전령들은 계절의 파발을 안고 산위에서 산 아래로 바람처럼 달려내려 가는 것처럼 보였다.
도시에서는 날씨로 말고는 느낄 수 없는 봄이 그곳에선 또다른 모습으로 눈을 밀어내고, 작은 나뭇가지들을 흔들어 겨울잠을 깨우는 것이다. 들 나무로는 산수유고, 산 나무로는 동박이랬다. 둘다 비슷한 이른 봄철에 노란꽃을 피우는 나무들이라는 뜻이겠지만, 같은 노란색이라도 들나무는 가볍고 산나무는 짙고 무겁다.
도시의 삶은 달력 속으로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계절이 간다. 콘크리트 숲 사이로 부는 황사바람으로만 계절의 변화를 느낀다. 그 바람 속엔 꽃 소식이 없다. 고향의 봄소식 또한 텔레비전이나 신문으로만 느낄 뿐이다.
겨울에 내린 눈이 어느 봄날 마지막으로 녹는지도 모르고, 어느 꽃이 어느 계절에 피는지도 모른다. 알았어도 잊고 산다. 그래야 할만큼 우리의 현실은 늘 각박하다. 저 산위에서 작은 나뭇가지를 흔들어 깨우는 바람같은, 우리 생활 속의 그런 봄소식도 좀체로 불어오지 않는다.
아직 쌓인 눈위에서 부는 바람에도 봄이 묻어난다는 걸 우리는 모른다. 하우스 속인 아닌 밭두렁에서 달래와 냉이가 푸른 빛을 띠기 시작한다. 전화를 했을 때 고향 친구는 “봄이야 불이지 뭐.”라고 단 한마디로 말했다. 한번 붙으면 걷잡을 수 없게 산과 들판을 새로운 잎과 새로운 꽃으로 채운다는 얘기였다.
“내려와. 내려와서 달래나 캐 가. 나생이(냉이)도 캐 가고. 어제 둘러봤더니 느(너의) 밭뚝에 지금 한창이더라.”
이번 주말엔 고향에 내려가 아직 싶은 산중에 남아있을 희끗희끗한 봄눈을 보며, 도시의 때를 벗고 고향의 봄을 가져올 생각이다. 그리고 누구에겐가 함께 가자고 말할 생각이다. 봄을 잊고 사는 그대에게 아직 눈 남은 내 고향의 봄을 보여주고 싶다.
이순원(소설가)
트렌드뉴스
-
1
주한美사령관 “美-中전투기 서해 대치, 韓에 사과 안해” 불쾌감
-
2
김태희 한남더힐 7년만에 시세차익 85억…127억 매수자는 ‘이사람’
-
3
“대구에 이렇게 눈이 온다고?” 시민들도 놀란 ‘2월 폭설’
-
4
손님이 버린 복권 185억원 당첨…편의점 직원이 챙겼다 소송 당해
-
5
[단독]“학업 위해 닷새전 이사왔는데”…‘은마’ 화재에 10대 딸 참변
-
6
주호영 “TK통합 반대 누구냐” vs 송언석 “그만두겠다” 충돌
-
7
[횡설수설/우경임]“훈식 형 현지 누나” 돌아온 김남국
-
8
박신양 “10년간 몸 못 가눠”…허리 수술·갑상선 투병 고백
-
9
공들인 시니어주택, 휴가 반납하고 찾은 회장님[부동산팀의 비즈워치]
-
10
[사설]집값 상승 기대, 역대 최대 폭 하락…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야
-
1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2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3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4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5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6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7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8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9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역사의 기록 앞에 판결 오류 밝힐 것”
-
10
서로 껴안은 두 소년공, 대통령 되어 만났다
트렌드뉴스
-
1
주한美사령관 “美-中전투기 서해 대치, 韓에 사과 안해” 불쾌감
-
2
김태희 한남더힐 7년만에 시세차익 85억…127억 매수자는 ‘이사람’
-
3
“대구에 이렇게 눈이 온다고?” 시민들도 놀란 ‘2월 폭설’
-
4
손님이 버린 복권 185억원 당첨…편의점 직원이 챙겼다 소송 당해
-
5
[단독]“학업 위해 닷새전 이사왔는데”…‘은마’ 화재에 10대 딸 참변
-
6
주호영 “TK통합 반대 누구냐” vs 송언석 “그만두겠다” 충돌
-
7
[횡설수설/우경임]“훈식 형 현지 누나” 돌아온 김남국
-
8
박신양 “10년간 몸 못 가눠”…허리 수술·갑상선 투병 고백
-
9
공들인 시니어주택, 휴가 반납하고 찾은 회장님[부동산팀의 비즈워치]
-
10
[사설]집값 상승 기대, 역대 최대 폭 하락…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야
-
1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2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3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4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5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6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7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8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9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역사의 기록 앞에 판결 오류 밝힐 것”
-
10
서로 껴안은 두 소년공, 대통령 되어 만났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