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경제시평]이근/지식경제 첫발은 정보공유
-
입력 2001년 1월 29일 18시 30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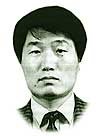
▼기업 성과의 결정적 요인▼
전통적 경제에서 생산은 기계라는 물적 자본과 이를 움직일 노동이라는 두 생산요소에 의해 이뤄졌다면, 이제는 지식이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 자리잡았다. 제대로 된 상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식이 개입해야 하는 것이다. 지식기반 경제에서 국민경제나 기업 성과의 차이는 비용의 차이보다는 이제는 해당 조직이 갖고 있는 지식 창고의 내용과 지식 격차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도 단순한 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 지식을 이용하고, 가공하고, 그 지식 자체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라고 봐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본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다음의 4가지 주요 과제가 파악되며 향후 한국경제와 기업도 이들 과제 해결을 새 경제로의 출발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첫째, 지식의 생산과 그 확산 사이의 긴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업과 종업원 사이에 더 많은 지식의 생산에 관해서는 인센티브상의 괴리는 없다. 종업원이 더 많은 지식을 쌓을수록 회사 업무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로 하여금 자신의 지식을 회사 내 다른 이에게 많이 알려주라고, 즉 확산시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것은 그것이 추가적이고 별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의 소중한 지식을 나만 독점하고 싶다, 즉 공짜로 남에게 내줄 수 없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 기존 지식의 이용과 새 지식의 습득 사이의 긴장을 해결해야 한다. 종래의 시각이 종업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자꾸 새 지식을 추구하고 배우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게 되고 있다. 이는 근무시간 중 얼마를 지식활용, 즉 통상적 의미의 생산에 투입하고 얼마를 새 지식학습에 투입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제기한다.
셋째, 지식의 암묵성과 관련된 시장실패에 대처해야 한다. 지식의 상당한 부분은 문서로 표시되기 어려운 암묵적 지식이 많다. 이런 암묵성은 그 지식의 이전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지식거래에 시장실패 문제를 초래한다. 지식을 살려는 구매자는 공급자가 갖고 있는 지식의 내용과 수준을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불해야 할 보상, 즉 지식가격 설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문제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만일 내가 직접 지식을 이전해야 할 경우, 그 작업의 쉽고 어려운 정도는 상대방의 지식흡수 능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작업에 대한 적절한 보수의 수준을 사전에 정하기 어렵다. 암묵성 문제의 극단적 경우는 누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 누가 이 지식을 필요로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이다.
▼지식축적위해 장기고용 필요▼
넷째, 지식의 축적과 노동시장 유연성과의 긴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업을 지식 저장소로 볼 때 저장된 지식 중 중요한 부분은 아무데서나 얻을 수 있는 일반적 지식보다는 해당 기업에서만 더 유용하고 다른 데서는 없거나 필요가 적은 기업특수적 지식이다. 회사 입장에서 볼 때 해당 기업에만 아주 유용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종업원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그 회사에 머물러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지식이 회사에 유용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 지식 습득에 회사가 일정한 자원을 종업원에게 배정했기 때문에도 그렇다.
그런데 증대하는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흐름은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장기적 지식 축적을 어렵게 한다. 반면에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는 일정 정도 이상의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식축적을 위한 장기고용의 필요성과 노동시장 유연성 사이의 긴장 관계가 존재한다. 즉 종종 “미끌미끌한 표면에서 어떻게 하면 끈적끈적한 장소를 만들 것인가”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 근(서울대 교수·경제학)
바다이야기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로비 >
-

우아한 라운지
구독
-

프리미엄뷰
구독
-

발리볼 비키니
구독
트렌드뉴스
-
1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2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
3
담배 냄새에 찡그렸다고…버스정류장서 여성 무차별 폭행
-
4
한동훈 다음 스텝은…➀법적 대응 ➁무소속 출마 ➂신당 창당
-
5
머스크 “전기차 생산라인 빼내 로봇 만든다”…테슬라 모델S·X 단종
-
6
“김건희, 싸가지” 도이치 일당 문자가 金무죄 근거 됐다
-
7
“참으려 해도 뿡” 갱년기 방귀, 냄새까지 독해졌다면?
-
8
李, 로봇 도입 반대한 현대차노조 겨냥 “거대한 수레 피할수 없다”
-
9
“갑자기 멍∼하고, 두통까지”… 건망증 아닌 뇌종양 신호일 수 있다[이진형의 뇌, 우리 속의 우주]
-
10
‘린과 이혼’ 이수, 강남 빌딩 대박…70억 시세 차익·159억 평가
-
1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국힘 내홍 격랑속으로
-
2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3
한동훈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올것…우리가 보수 주인”
-
4
홍준표 “김건희 도이치 굳이 무죄? 정치판 모르는 난해한 판결”
-
5
李 “국민의견 물었는데…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
-
6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서 韓 빠지겠다는것” 이례적 공개 비판
-
7
‘소울메이트’서 정적으로…장동혁-한동훈 ‘파국 드라마’
-
8
[단독]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
9
[속보]장동혁 국힘 지도부, 한동훈 제명 확정
-
10
용산-태릉-과천 등 수도권 51곳에 6만채 공급
트렌드뉴스
-
1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2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
3
담배 냄새에 찡그렸다고…버스정류장서 여성 무차별 폭행
-
4
한동훈 다음 스텝은…➀법적 대응 ➁무소속 출마 ➂신당 창당
-
5
머스크 “전기차 생산라인 빼내 로봇 만든다”…테슬라 모델S·X 단종
-
6
“김건희, 싸가지” 도이치 일당 문자가 金무죄 근거 됐다
-
7
“참으려 해도 뿡” 갱년기 방귀, 냄새까지 독해졌다면?
-
8
李, 로봇 도입 반대한 현대차노조 겨냥 “거대한 수레 피할수 없다”
-
9
“갑자기 멍∼하고, 두통까지”… 건망증 아닌 뇌종양 신호일 수 있다[이진형의 뇌, 우리 속의 우주]
-
10
‘린과 이혼’ 이수, 강남 빌딩 대박…70억 시세 차익·159억 평가
-
1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국힘 내홍 격랑속으로
-
2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3
한동훈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올것…우리가 보수 주인”
-
4
홍준표 “김건희 도이치 굳이 무죄? 정치판 모르는 난해한 판결”
-
5
李 “국민의견 물었는데…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
-
6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서 韓 빠지겠다는것” 이례적 공개 비판
-
7
‘소울메이트’서 정적으로…장동혁-한동훈 ‘파국 드라마’
-
8
[단독]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
9
[속보]장동혁 국힘 지도부, 한동훈 제명 확정
-
10
용산-태릉-과천 등 수도권 51곳에 6만채 공급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