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망쳐 나온 한군(漢軍)이 500명에 가깝고, 그들로부터 번쾌의 모진 다그침과 한왕(漢王)이 잔도 닦는 일을 재촉하기 위해 다시 보낸 군사들이 식(蝕) 골짜기에 이르렀다는 말을 들은 옹왕(雍王) 장함은 마침내 손을 썼다. 아우 장평을 불러 군사 3만을 딸려주며 말했다.
“너는 군사를 이끌고 두현(杜縣) 남쪽으로 내려가 식 골짜기 어귀를 막고 있거라. 한왕 유방이 잔도를 고쳐 그리로 나오더라도 우리 삼진(三秦)땅 안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곳은 골짜기가 좁고 양쪽의 지세가 험하니 우리 군사 한 사람이면 적군 백을 당할 수 있다. 비록 한군이 100만이 넘는다 해도 이 3만이면 넉넉할 것이다.”
그래놓고 자신도 다시 군사를 모아 만일에 대비했다. 옹(雍)땅을 비질하듯 장정들을 긁어내어 5만 대군을 폐구(廢丘)에 모아두고 언제든 움직일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그때 이미 한왕이 이끄는 군사들은 좁고 험한 고도현의 옛길을 소리 소문 없이 지나고 있었다.
고도현의 옛길 또한 적이 알고 막으려 들면 하나가 100명을 막아낼 수 있을 만큼 험한 산길이었다. 한신은 대군이 움직이기에 앞서 한 갈래 날랜 군사를 먼저 풀어 근처에 있는 나무꾼이나 사냥꾼들의 눈과 귀로부터 대군의 움직임을 가렸다. 그리고 정히 뜻 같지 못하면 그들을 죽여 입을 막음으로써 옹왕 장함의 군사들에게 한군의 움직임이 알려지는 걸 막았다.
그러나 정작 한군의 움직임이 끝내 적의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해준 것은 한왕 유방이 몇 달 관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거둔 인심이었다. 한신이 아무리 애를 써서 한군의 움직임을 숨기려 해도 워낙 많은 군사가 움직이는 것이라 그리 되지가 않았다. 고도현의 농부나 사냥꾼들 중에는 한군이 동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을 아는 이들도 있었으나, 아무도 옹왕 장함의 군사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오히려 한군이 하루빨리 삼진으로 들어와 자신들을 구해주기만 기다렸다.
대산관(大散關)은 진나라 서남쪽 위수(渭水)가에 치우쳐 있기는 해도 원래부터 그렇게 만만하게 지나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특히 파촉이 진나라의 땅이 된 뒤부터는 교통의 요지로도 중시되어 관문이 두껍고 굳센 데다 적지 않은 군사가 머물며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도 땅에서 홀연히 솟아오르듯 서남에서 대군이 밀려와 관문을 짓두들기자 옹군(雍軍) 장졸들은 겁부터 먼저 먹었다.
“관문을 닫아걸어라! 그리고 어서 날랜 파발마를 내어 도성에 위급을 알려라. 관문을 닫아걸고 굳게 지키면서 기다리면 머지않아 폐구에서 우리 대왕의 구원병이 이를 것이다.”
대산관을 지키던 늙은 장수는 그렇게 외치며 한군에 맞서 보았으나, 워낙 갑작스러운 일인 데다 군세가 너무 달렸다. 겨우 이틀을 버텼으나 보낸 파발이 폐구에 도착하게도 전에 한군에 떨어지고 말았다.
“여기서 하루를 쉬고 진창(陳倉)으로 간다. 먼저 진창부터 차지한 뒤에 폐구를 치고 옹왕 장함을 사로잡을 것이다.”
어렵지 않게 대산관을 떨어뜨린 한신이 미리 작정하고 있었던 듯 그렇게 영을 내렸다. 진창은 대산관에서 서북쪽으로 몇 십 리 치우쳐 있는 곳으로 옹왕 장함의 도읍인 폐구와는 거리가 있었다. 걱정이 된 한왕이 슬며시 한신에게 물어보았다.
글 이문열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부자들의 아침 일과, 종이신문 읽기 [횡설수설/김재영]](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24678115.1.thumb.jpg)
[횡설수설/김재영]부자들의 아침 일과, 종이신문 읽기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전 가는 고속도로서 택시기사 뺨 때린 카이스트 교수 기소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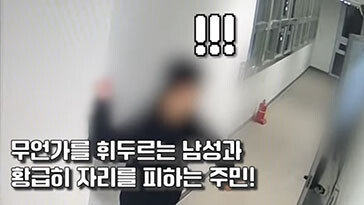
흉기로 이웃 위협한 男…‘나무젓가락’이라 발뺌하다 덜미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소설]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卷四. 흙먼지말아 일으키며](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