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이 후대에 남긴 유훈(遺訓)은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명 태조는 주변국 가운데 16개 나라를 섣불리 건드려선 안 된다고 유언을 남겼는데 첫 번째로 꼽은 나라가 고려, 두 번째가 베트남이었다. ‘고려 사람들은 험악하고 면종복배(面從腹背·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뒤에선 인정하지 않음)한다’는 게 이유였다. 수나라, 당나라는 한국을 침략했다가 물러간 뒤 왕조가 무너지고 왕이 사망하는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중국은 한국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정복을 포기한 것이다.
▼청나라 압도한 秋史▼
중국이 한국을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만든 저력은 어떤 것일까. 역시 우리의 문화적 자부심이다. 한국은 동양사상의 핵심인 불교와 유교를 받아들여 우리 식의 ‘완결 편’을 만들어낸 나라다. 석굴암과 같은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운 신라 사람들이 그렇고, 주자성리학을 받아들여 조선성리학으로 완성한 조선의 선비들이 또 그렇다. 이퇴계 이율곡의 사상은 유교의 본고장 중국에서도 감탄을 금치 못한다.
한국의 문화적 자부심을 확인시켜준 역사 속의 명(名)장면을 꼽는다면 추사 김정희와 중국의 석학 옹방강의 만남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의 대면은 1810년 청나라의 수도 연경(현 베이징)에서 이뤄졌다. 추사는 24세의 열혈 청년이었고 옹방강은 당대를 대표하는 77세의 노학자였다.
조선에서 젊은 천재가 찾아왔다고 해서 추사를 만난 옹방강은 이내 탄복하고 만다. 추사를 ‘경술문장 해동제일(經術文章 海東第一·경전 예술 문장에서 조선에서 가장 뛰어나다)’이라고 극찬했다. 추사가 연경을 떠날 때는 중국의 학자들이 추사를 위한 환송연을 성대하게 베풀었다고 한다.
아마도 중국의 지식인사회는 내심 추사에게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추사 같은 걸출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조선 사회의 지적 토양에 또 한번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우리가 대대로 중국 문화의 수입국이면서도 이런 ‘문화의 힘’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던 게 한민족의 생존 비결이었다.
한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 중에는 문화적 우월감이 한자리를 차지한다. 일본은 우리의 문화를 전수받은 나라라는 것이다. 이런 강한 자존심이 한국이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고 가난을 탈출하는 데 큰 자극제가 됐던 게 사실이다.
문화적 자부심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체감을 갖게 하고 곤경에 빠졌을 때 구심점 역할을 한다. 백범 김구가 한국이 나가야 할 길로 ‘문화국가’를 강조했던 것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민족의 생존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겼기 때문일지 모른다.
▼문화적 자부심 지킬 노력을▼
한반도 주변의 역학 관계가 급변하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힘든 긴박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북한 문제, 통일 문제도 발등의 불이다. 경제력 면에서 훨씬 나아졌다지만 낙관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동력(動力)을 갖고 앞길을 헤쳐 나가야 하는가.
 |
어떤 큰소리나 장담보다도 내부적으로 문화적 자부심을 확고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근본적인 생존방식은 변하지 않는다. 격변의 세월 속에서도 지식과 기술, 문화의 힘으로 무장한다면 민족 정체성을 지키면서 어떤 험난한 파고라도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이다.
홍찬식 논설위원 chansik@donga.com
동아광장
구독-

부동산 빨간펜
구독
-

브랜더쿠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이 얼굴이 60대?”…아르헨티나 미인대회 1위 나이 화제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충남 이어 2번째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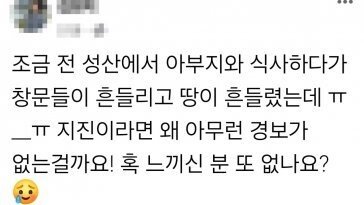
제주 동부지역 ‘땅 흔들림’ 신고 11건…‘지진경보’ 안울려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불통’을 벗어나는 출발점[동아광장/이은주]](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24/04/24/124642024.2.png)
![[동아광장/송인호]스크린쿼터, 타다, 의대 증원… 변화의 성장통](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24/04/12/124456546.2.png)
![[동아광장/정소연]대페미의 시대](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24/04/11/124442046.2.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