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기자의 눈/서정보]뛰어가는 외국 신문, 발목 묶인 한국 신문
-
입력 2006년 6월 8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5∼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신문협회(WAN) 총회에 참석한 110개국 1700여 명의 언론인은 이 화두를 놓고 고민했다. 로이터통신의 딘 라이트 독자서비스 국제센터장은 “신문 사업을 하기에 지금만큼 좋은 때는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 등 디지털 뉴미디어와 결합해 다양한 뉴스를 제공한다면 신문위기설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새로운 시도와 성공 사례도 많이 소개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올해 온-오프라인 통합 뉴스룸을 만들어 디지털 세대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4월부터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제공하는 데 이어 올여름 ‘마이 타임스’라는 독자별 맞춤형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블루프턴 투데이’는 지역사회와 밀착한 인터넷 기사로 성공했고, 브라질의 지역신문 ‘제로 오라’는 구독자의 42%가 30대 미만이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신문 읽는 시민’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스크바에서 바라보는 국내 언론 환경은 이런 세계적 조류에서 멀어도 한참 멀어 보인다. 디지털 환경으로의 이행은커녕 참여정부가 제정한 신문법 언론중재법의 위헌적인 규제 조항들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회에선 여론 형성 주체가 신문 등 전통적인 매체 외에 인터넷신문 블로그 시민저널리즘으로 다양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마치 신문만이 여론의 독점 공급자인 것처럼 호도하고 메이저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떨어뜨려야 여론의 다양성이 생긴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총회에선 인터넷은 물론 휴대전화, 아이팟, 휴대용 게임기까지 뉴스의 통로가 된 사례가 발표됐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종이신문의 배달 시스템을 개선해야 신문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며 신문유통원 운영에 국고 수천억 원을 쓸 계획이다.
정부는 신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신문법을 제정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신문들이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이런 법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한 갈수록 세계적인 변화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갈 길은 먼데 이중삼중으로 발이 묶인 한국 신문업계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총회 내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모스크바에서
서정보 문화부 suhchoi@donga.com
기자의 눈 >
-

오늘과 내일
구독
-

골든타임의 약탈자들
구독
-

기고
구독
트렌드뉴스
-
1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2
손님이 버린 복권 185억원 당첨…편의점 직원이 챙겼다 소송전
-
3
사패산 터널 ‘1억 금팔찌’ 주인 찾았다…“차에서 부부싸움하다 던져”
-
4
“너 때문에 넘어졌어” 부축해준 학생에 4600만원 청구 논란
-
5
“같은 사람 맞아?”…日 ‘성형 전후 투샷 인증’ 챌린지 유행
-
6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징역 6년 선고…구형보다 더 나와
-
7
“성관계 몰래 촬영”…20대 순경, 전 여친 고소로 입건
-
8
‘1000억대 자산’ 손흥민이 타는 車 뭐길래…조회수 폭발
-
9
[단독]타슈켄트 의대 한국인 유학생들, 국시 응시 1년 밀릴 듯
-
10
[단독]은마아파트 화재 윗집 “물건 깨지는 소리 뒤 검은 연기 올라와”
-
1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2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3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4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5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6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7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8
‘절윤’ 공세 막은 국힘 ‘입틀막 의총’…당명개정-행정통합 얘기로 시간 끌어
-
9
전현무, 순직 경관에 ‘칼빵’ 발언 논란…“숭고한 희생 모독” 경찰 반발
-
10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역사의 기록 앞에 판결 오류 밝힐 것”
트렌드뉴스
-
1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2
손님이 버린 복권 185억원 당첨…편의점 직원이 챙겼다 소송전
-
3
사패산 터널 ‘1억 금팔찌’ 주인 찾았다…“차에서 부부싸움하다 던져”
-
4
“너 때문에 넘어졌어” 부축해준 학생에 4600만원 청구 논란
-
5
“같은 사람 맞아?”…日 ‘성형 전후 투샷 인증’ 챌린지 유행
-
6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징역 6년 선고…구형보다 더 나와
-
7
“성관계 몰래 촬영”…20대 순경, 전 여친 고소로 입건
-
8
‘1000억대 자산’ 손흥민이 타는 車 뭐길래…조회수 폭발
-
9
[단독]타슈켄트 의대 한국인 유학생들, 국시 응시 1년 밀릴 듯
-
10
[단독]은마아파트 화재 윗집 “물건 깨지는 소리 뒤 검은 연기 올라와”
-
1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2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3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4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5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6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7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8
‘절윤’ 공세 막은 국힘 ‘입틀막 의총’…당명개정-행정통합 얘기로 시간 끌어
-
9
전현무, 순직 경관에 ‘칼빵’ 발언 논란…“숭고한 희생 모독” 경찰 반발
-
10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역사의 기록 앞에 판결 오류 밝힐 것”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KLPGA, 시드권 특전 주며 스스로 권위 날렸다[기자의 눈/김정훈]](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11/07/13272798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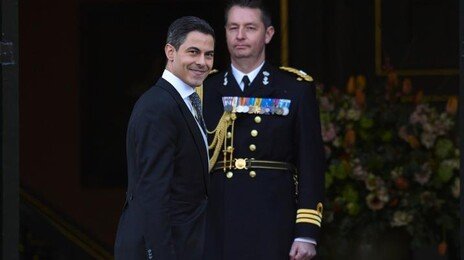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