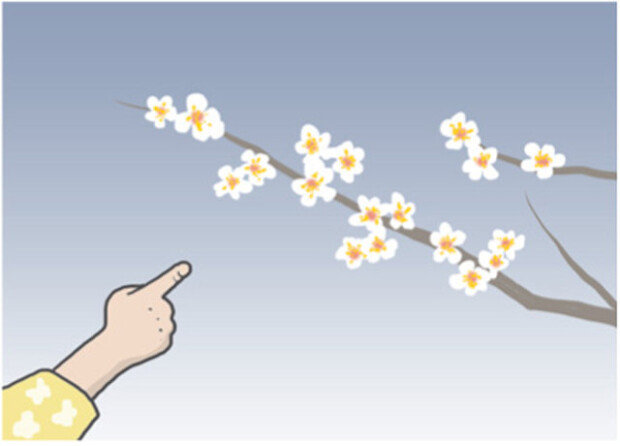

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서둘지 말라 나의 빛이여/오오 인생이여 ―김수영 ‘봄밤’ 중
오늘 아침 딸아이가 자꾸만 어딜 보라고 손가락을 들어 채근했다. 아이와 달리 나는 마음이 바빴다. 보행 신호가 곧 푸른빛으로 바뀌려는 참이었기 때문이다. 아이의 손은 살구꽃을 향하고 있었다. 꽃나무도 신호등처럼 이제 빛을 발하려는 참이었다. 아직 흐드러지진 않았지만, 하나둘 제 색을 드러내는 게 앞으로 올 따스한 날들의 전령 같아서, 봄이 오긴 왔구나 싶었다.
봄이 왔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우리 앞에 어김없이 선다. 황사를 뚫고 미세먼지를 젖히고 심지어 코로나19라는 기이한 재난에서도 봄은 제 할 일을 한다. 땅을 녹이고 꽃을 피우고 아이들을 다시 학교에 가게 한다. 살구꽃 감상은 짧디짧았다.
이번 봄부터 아이의 등교를 맡게 되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아홉 시까지 당도해야 할 사무실이 없으니 아홉 시까지 동네 초등학교 교문에 닿게 되었다. 10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아이는 재잘재잘 말이 많다. 그 목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불안과 초조는 봄빛 앞의 눈처럼 진회색 흔적만을 남긴 채 스르르 녹아 없어진다. 그리고 교문을 통과한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하는 것이다.
출판사를 시작한다. 아직 책은 없지만, 사업자 등록하고 계좌를 트고 거래처 관계자를 만나는 일들은 진행되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올봄의 보폭에 맞춰 시작한 셈이다. 김수영의 시에서 ‘봄밤’을 가장 좋아한다. 특히 빛더러 서둘지 말라 일갈하는 그의 거대함이 좋다. 시인의 뜻은 아니겠지만, 지금 내게 저 문장은 일종의 자기계발서처럼 느껴진다. 좋은 봄날이다. 좋은 시작이면 좋겠다. 허나, 너무 서둘지는 않으려고 한다. 잠시 멈춰 살구꽃을 보는 순간에야, 봄은 우리 곁에 존재하는 것일 테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