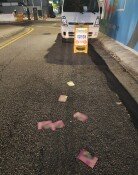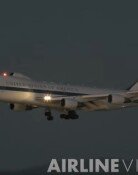30대가 넘은 세대는 대개 지리()를 지루한 암기과목으로 기억한다. 다음 중 텅스텐이 나지 않는 곳은?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낯선 지명을 외워야 했던 기억도 생생하다. 지리가 재미없던 까닭을 유우익 서울대 교수는 일본 식민지배의 유산이라고 했다. 당시 국어와 국사가 핍박은 받았지만 학문적 연구까지 금지된 건 아니었다. 반면 지리는 풍수지리로 격하돼 학문의 싹이 잘렸다. 지리를 알면 알수록 애국심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광복 후 지리의 중요성은 높아졌는데 가르칠 학자와 책이 있을 리 없다. 비()전공자들이 급하게 교과서를 만들다 보니 텅스텐은 어디서 나고식의 단편적 지식 위주가 됐고,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3면이 바다여서식의 부정적인 반도적() 결정론만 가르치게 됐다. 유 교수도 그런 지리를 공부했다. 1967년 독일에서 제대로 지리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김도정 교수를 만나면서 우리 땅을 재발견했다. 그가 기른 제자들이 1990년대 들어 재미있는 지리교과서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는 세계지리학회의 첫 비()유럽권 사무총장으로 뽑혀 내년부터 직무에 들어간다.
인터넷과 함께 국경도, 지리적 한계도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현실은 다르다. 지리와 지정학은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한 나라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지리적 속성을 갖는지에 따라 국가발전전략이 달라진다는 것이 유 교수의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이면서도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의 4강에 둘러싸였다는 지정학적 특성을 지녔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는 어떤 정책이나 국가발전전략도 통하지 않는다. 한때 동유럽의 대제국이었던 헝가리는 줄을 잘 못 선 죄(?)로 몰락했다.
반도는 바다로 뻗어나가야만 성공한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는 물론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반도로서 융성을 누렸다. 아시아와 태평양 사이, 천혜()의 땅 한반도에 자리 잡은 우리는 여전히 폐쇄적이면서,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 제로섬 게임만 하고 있다. 학창시절 지리를 재미없게 배운 탓일까.
김 순 덕 논설위원 yu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