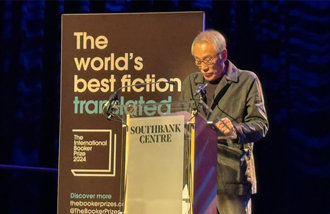집사람이 가장 보고 싶네요. 집에 보름이나 못 들어갔거든요.
1일 한국시리즈 우승이 확정된 뒤 김재박 감독(50)은 아내 정복희씨(48)를 떠올렸다.
하지만 경기가 모두 끝난 이날도 그는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 우승 축하연과 코칭스태프 회식 때문에 호텔 신세를 져야 했기 때문. 아내가 차려주는 점심을 먹기 위해 서둘러 집에가려는 김 감독을 2일 모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좌절이 강한 승부욕의 원동력이었다고 말머리를 꺼냈다.
대광고 시절 2루수였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실업팀에서 아무도 나를 안 뽑아주더군요. 키가 작았기 때문이죠. 당시 163cm 정도였어요.
그의 좌절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그는 1973년 영남대 창단팀에 들어가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팀과의 대결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며 이를 악물었고 1년 뒤 전혀 다른 선수로 태어났다.
영남대 2학년 때 가을리그에서 수위타자에 오른 그는 이후 대학선발과 국가대표 등 탄탄대로를 달렸다. 한국화장품에서 뛰던 1977년 실업야구선수권대회에선 타격, 타점, 홈런, 트리플 크라운상, 도루, 신인, 최우수선수상 등 전무후무한 7관왕에 올랐다.
그를 두고 빼놓을 수 없는 전설이 바로 1981년 세계선수권대회 일본전에서의 개구리 번트. 1-2로 뒤진 8회 폴짝 뛰어올라 번트 안타로 동점을 만든 장면은 아직도 많은 팬들의 기억에 생생하다.
당시 스퀴즈 사인이 난 게 아니고 내 스스로 기습번트를 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우홍 감독님이 사인 미스가 났다고 하시더군요. 어찌나 서운하던지.
김 감독은 1996년 현대 유니콘스의 지휘봉을 잡으면서 가장 먼저 현대의 기업문화를 떠올렸다고 했다.
1등 기업이었거든요. 성적을 못 내면 오래 감독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뛰어난 감독이라도 지면 잘리는 게 프로의 생리인데 현대에선 더욱 그랬죠.
1996년부터 9년째 감독으로 있으니 그동안 그가 좋은 성적을 낸 건 확실하다. 한국시리즈 4회 우승에 현역 최고 승률 감독(0.573)을 어떻게 자를 수 있을까.
9차전까지 간 이번 한국시리즈는 그에게 가장 힘든 승부였다. 그는 6-6으로 비긴 7차전이 가장 큰 고비였다며 사실 8-8로 비긴 2차전과 7차전은 모두 내심 포기했던 경기였는데 선수들이 너무 잘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잡기()에 능하다. 그것도 능한 정도가 아니라 경지에 올라 있다. 당구는 700점. 어릴 때 대구에서 아버님이 구둣가게, 어머님이 제과점을 하시던 2층짜리 건물에 당구장을 세준 뒤부터 당구를 접할 기회가 많았다.
골프는 싱글 핸디캡이고 볼링은 170180점을 애버리지로 친다. 그뿐인가. 탁구도 잘 치고 뛰어난 카드 실력은 소문나 있다.
내기를 하면 지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뭘 하든 실력이 빨리 늘었죠. 카드게임을 즐겨 했던 그는 야구가 포커와 비슷한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종목과 달리 패가 절대로 똑같이 들어오지 않아요. 경기 흐름이 있고 요소마다 결정을 내려야 하죠. 그리고 꾹 참고 기다리면 좋은 패가 들어옵니다. 노 히트를 당하더라도 찬스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일찍 물러난 다른 감독들과 달리 자신에게 온 찬스를 놓치지 않고 대박으로 연결시킨 김재박 감독. 앞으로 그의 손엔 또 어떤 카드가 쥐어질까.
김상수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