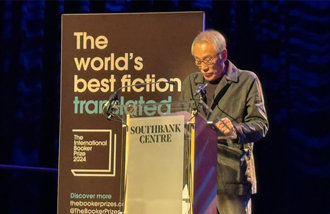새해를 맞아 본보는 한미동맹의 실상을 진단하고 한반도 주변정세를 100년 전 상황과 비교하는 기획을 연재했다. 엄혹한 국제환경 속에서 국권 상실의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고 강소국()의 길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 이 나라 외교정책의 최종 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경질로 초래된 자주 대() 동맹 논란 속에 신년 초 국민의 기대는 우려로 변하는 느낌이다.
청와대는 윤영관 장관을 경질하면서 참여정부가 제시한 자주적 외교정책의 기본정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년간 한국외교를 현장에서 지휘한 사령탑을 내보내면서 대외 의존정책과 자주외교 편가르기를 하는 청와대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외교부 사이에는 갈등이 없다고 강변한다. 과연 청와대는 스스로 초래한 혼란에 책임이 없는가. 들끓는 여론과 정치권에서 연일 쏟아지는 격렬한 비난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자주외교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이를 대외 의존정책의 대칭개념으로 규정한 정부의 인식 때문이다. 그 대상은 물론 미국일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외교가 미국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까지 감내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 현대사 및 현실의 조건과는 크게 동떨어진 위험한 인식이다. 한미동맹은 여느 동맹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북핵,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배치 등 참여정부 출범 이후 주요 외교현안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때로는 50년 동맹관계를, 때로는 국익을 내세워 추진해 온 기존 외교를 매도하는 것은 결국 미국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닌가.
갈수록 높아지는 중-일()간 동북아 패권경쟁의 와중에서 통일한국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은 필수적인 요소다. 정부는 과연 약육강식의 국제질서 속에서 동맹 없이 국익을 지켜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인가. 윤 장관이 퇴임사에서 용미()를 강조한 것도 정부 일각의 낭만적이고 공허한 자주론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미동맹은 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의 인식은 지나치게 안이하다. 연두회견에서 지금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하다고 한 말이 가까운 예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한강이남 이전에 대해서도 미국은 한국 내 반미() 감정을 주요 변수로 고려하는 데 비해 노 대통령은 유엔사의 서울 잔류를 낡은 생각이라고 단정했다. 이는 국민의 안보 걱정을 외면하고 현실을 호도하는 말이 아닌가.
앞으로 50년을 위한 동맹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어야 할 시기에 현실성이 희박한 자주외교론이 강조되는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행여 총선에서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대통령은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혼란수습에 나서야 한다. 우리에게 동맹 없는 자주란 아직 이상론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