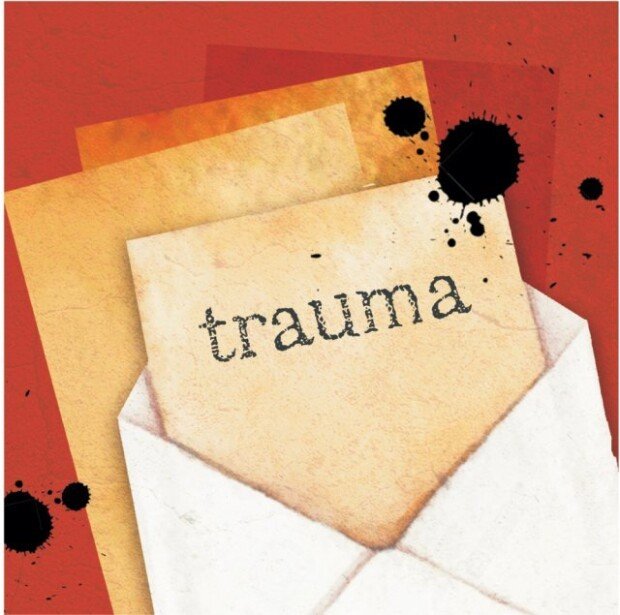
정신분석학자 도리 라웁은 트라우마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전도 없고 중간도 없고 이후도 없는 사건”이라고 정의한다. 시간이 흘러도 과거의 사건에 붙들려 있는 트라우마의 무서움을 강조한 말이다. 프란츠 카프카가 쓴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는 이것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편지를 쓴 때는 1919년 11월이다. 47쪽에 달하는 장문의 편지지만 요지는 첫 문장에 드러나 있다. “아버지께서는 최근 제가 왜 당신을 아직도 두려워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서른여섯이나 되었음에도 아버지를 두려워하다니. 그렇다고 그가 어렸을 때 매를 많이 맞은 것은 아니었다. 매질은 필요 없었다. 아버지의 쩌렁쩌렁 울리는 고함 소리, 붉으락푸르락한 얼굴, 의자에 풀어놓은 멜빵만으로 충분했다. 매질을 암시하는 그러한 징후들이 매질보다 더 공포였다.
아버지는 그러한 분이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어린 카프카는 침대에서 목이 마르다고 칭얼거렸다. 목이 말라서라기보다 어리광을 부린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노발대발했다. 그는 잠옷만 입고 있는 아이를 우악스러운 손으로 낚아채 베란다로 데려다 놓고 문을 닫아버렸다. 아이는 이후로 거대한 몸집의 아버지가 침대에 있는 그를 다짜고짜 낚아채 베란다로 끌고 가는 악몽을 꾸었다. 성년이 되어서도 그랬다. 오죽하면 “저의 글들은 모두 아버지에 관한 것입니다”라고 했을까.
편지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에 부합되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서른여섯 살인 그의 내부에 상처받은 아이가 들어앉아 있었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 편지는 그 아이의 울음이었다. 어쩌면 그 울음은 치유의 첫 단계였을지 모른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울음은 아버지의 귀에 닿지 못했다. 아버지에게 전해달라는 편지를 읽은 어머니가 너무 가슴이 아팠는지 아들에게 그냥 돌려줬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5년 후 카프카는 세상을 떠났다. 트라우마의 쓰라린 기록을 뒤에 남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