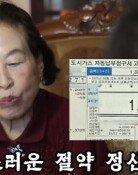단순 화재에 ‘국민메신저 먹통’… 재난 대비 ‘기본’ 안 된 카카오
단순 화재에 ‘국민메신저 먹통’… 재난 대비 ‘기본’ 안 된 카카오
Posted October. 17, 2022 08:54,
Updated October. 17, 2022 08:54
지난 주말 경기 성남시 SK C&C 판교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곳에 서버를 둔 카카오 서비스가 장시간 먹통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카카오톡 모바일 기능은 어제 새벽 일부 복구가 됐으나 나머지 서비스는 20시간 넘게 장애가 이어졌다. 실사용자수가 4750만 명인데다 다른 서비스의 관문 역할을 하는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카카오 같은 주요 정보기술(IT) 업체는 재난재해 상황에 대비해 데이터센터를 이원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야 한쪽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예비 서버에서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도 예비 서버만 정상적으로 가동됐더라면 피할 수 있었다. 카카오 측은 “외부 상황에 따른 장애 대응을 위한 이원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가장 단순한 카카오톡 일부 기능을 정상화하는데도 10시간이 걸렸다. 지진이나 테러가 난 것도 아니고, 더구나 서버 임대 공간이 아닌 전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도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이 무슨 의미가 있나.
카카오는 벤처기업 시절인 2012년 4월에도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이 끊겨 서비스가 4시간 중단된 적이 있다. 그때도 서버를 분산 운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카카오는 이후 10년간 계열사 수를 130여 개로 불리면서 카카오로 소통하고, 택시 잡고, 결재하는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시총 10위권 대기업으로 덩치를 키우는 동안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센터에는 투자를 소홀히 하다 전국이 마비되는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이후 대응도 국민 메신저의 위상과는 맞지 않는다. 정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주요 IT 기업은 장애가 발생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가 트위터에 상담 창구를 안내한 시각은 장애 사고가 발생한지 5시간25분이나 지난 후였다.
화재가 발생한 데이터센터에 서버를 둔 네이버도 카카오만큼은 아니지만 일부 서비스에서 접속 장애 현상이 발생했다.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모든 데이터를 모아놓는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해외 IT 기업들은 재난재해로 데이터센터 전체가 다운되는 사태까지 고려해 대응 훈련을 한다. 통신재난으로 일상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백업 체계를 점검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한 매뉴얼도 재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