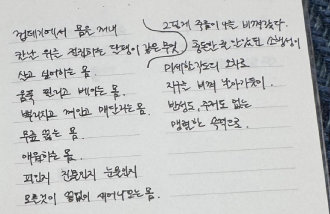할리우드 작품에 흑인 배우가 등장하는 일은 흔해졌지만 여전히 아시아 배우가 등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아시아 배우가 나오더라도 평면적인 인물로 표현되거나 미국에서 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영화로 분류되기도 한다.
1980년대 아메리칸드림을 좇아 이주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미나리’가 올해 골든글로브에서 작품상이 아닌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오른 일이 대표적이다. 이 작품은 한국계 미국인인 리 아이작 정(정이삭) 감독이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다. 제작사는 브래드 피트가 공동 대표인 플랜B다. 그럼에도 규정상 영화 대사의 50% 이상이 영어가 아니라며 외국어 영화로 분류된 것이다.
그러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2009년) 영화는 대사의 영어 비중이 30% 정도임에도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 감독과 배우가 백인이 아니라고 해서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19년엔 중국계 미국인인 룰루 왕 감독이 중국계 이민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페어웰’도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후보로 분류된 적이 있다.
아시아인이 등장하더라도 동양에 대한 서양의 시각이 드러나는 ‘오리엔탈리즘’이 녹아 있다. 영화 ‘시리어스맨’(2010년)에서 한국인은 낙제점인 F학점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한국인은 공부벌레로 표현되곤 한다. 영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2018년)처럼 돈밖에 모르는 부자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 작품은 백인이 주류인 서양권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동양인 갑부들의 이야기’로 신선하게 받아들여졌지만 동양권에선 ‘뻔한 신데렐라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며 흥행에 실패했다.
할리우드에서 아시아인이 소외되는 흐름을 바꾸기 위해선 영화 제작진에 아시아인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흑인과 멕시코인 제작자들이 할리우드 작품을 만들면서 편견을 극복해나간 것처럼 제작하는 이들이 차별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정지욱 영화평론가는 “영화 ‘기생충’을 계기로 할리우드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제작 시스템에 한국인이 포함돼야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한국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것”이라고 했다.
이호재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