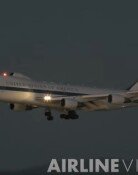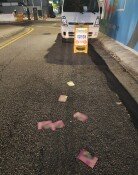청와대의 인사 청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경우는 대통령비서들의 각종 공직인사() 개입과 일탈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들은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의 주모자 또는 주동자로서 직업공무원제도를 흔들고, 산하기관장 공모경선제를 허울뿐인 제도로 추락시키고 있다. 실태를 규명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자체가 공직기강을 해치는 잘못이다.
대통령비서라는 자리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조하는 자리이지, 인사에 간섭하거나 청탁을 하라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은 청와대 판 인사 브로커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세금을 낼 수는 없다.
대통령비서들의 인사 개입은 이번뿐이 아니다. 2004년 박기정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이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 사퇴한 것이나, 노무현 정부의 첫 외교통상부 장관인 윤영관 씨가 외교안보팀 내의 자주파와 동맹파 간의 갈등 속에서 그만 둔 배경에도 청와대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특정 부처의 경우 청와대의 일개 비서관이 자기 사람을 워낙 많이 심어 그의 인맥이 진을 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이다.
이러니까 정부 산하기관 등의 인사추천위원회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 기관장이나 감사 선임 때 특정 인사를 미리 낙점해 3배수 후보자 명단에 포함시키도록 하거나, 장관들로 하여금 제청토록 하니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겠는가.
심지어 복수 추천 명단에 자신들이 점찍어놓은 인사가 포함되지 않으면 추천 자체를 없던 일로 하고 재공모를 하도록 하는 일도 빈번하다. 지난해도 한 부처의 산하기관장을 뽑으면서 이런 일이 생겨 물의를 빚었다. 당시 1차 추천 때 3위를 한 사람이 재공모 과정을 거쳐 결국 기관장이 됐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이번 일로 홍보수석실 관계자들도 조사했다고 하지만 과연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다. 인사 청탁을 거절한 사람을 압박하고 쥐어짠 민정수석실이 청탁 혐의자들을 조사했다는 것 자체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대통령비서들의 일탈은 결국 그들을 부리는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으니 대통령이 직접 진상규명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