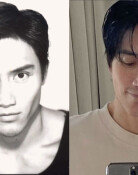요즘 재계에서는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걱정이 적지 않다. 특히 현 정부와 김대중 전 대통령 측에서 대북() 경제협력 방안과 관련해 갖가지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면서 많은 기업인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가 경제논리를 따지지 않고 자칫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수준의 대북 경협을 약속할 경우 차기 정부는 물론 해당 기업들로서도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의 해주 남포 등지에 제2의 개성공단을 조성하는 방안을 비롯해 도로 항만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지원 전기 등 에너지 지원 조림사업 지원 새마을운동 지원 등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각종 대북 경협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만약 냉정함을 잃고 퍼주기 식으로 대규모 대북지원 사업에 합의하면 그 비용은 결국 기업과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김대중 정부 시절 정권과 손잡고 무리한 대북사업을 벌였다가 한때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현대그룹의 쓰라린 경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업이 경제성을 무시하고 수익성이 낮은 경협에 말려들 경우 자칫하면 해당 기업이 결정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재계로서는 부담스럽다.
대북 경협 확대가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미국이 적성국으로 분류한 북한과의 경협 확대에 나서면, 해당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북 경협 확대가 국내 기업들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의 소비자 여론을 자극해 제품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민감한 전략물자가 많은 전자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을 확대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남북경협위원장인 박영화 삼성전자 고문은 올 8월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북한은 (테러 지원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바세나르협약에 따라 대북 반출 물자에 제약이 따르고 수출에서 특혜 관세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들은 현 정부가 임기 말 이벤트성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남북경협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산성이 없는 사업을 놓고 등을 떠밀 듯이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제사회의 각종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핵 문제 등 정치적인 불안요인을 우선 해소한 다음 항만 도로 전기 용수 등 각종 사회 인프라를 확보하고, 이후 투자안전 보장 등 세부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본격적인 경협 확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1990년대 중반 남북경협을 추진했던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당시 북한에 가전공장을 세우기로 하고 북한 당국에 일일 물류이동이 가능한 지역(평양 이남)에 용지를 제공하고 전기 및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 등 몇 가지 조건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남북경협이라고 말했다.
배극인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