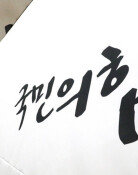북-러 “전쟁 땐 즉시 군사원조”…위험한 신냉전 결탁
북-러 “전쟁 땐 즉시 군사원조”…위험한 신냉전 결탁
Posted June. 21, 2024 07:46
Updated June. 21, 2024 07:46
북한과 러시아가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타방은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합의했다. 북한이 어제 공개한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의 내용이다. 아울러 새 조약에는 직접적 위협이 조성될 경우에도 곧바로 협상 채널을 가동하고, 방위력 강화를 위한 공동 조치들을 제도화하며, 우주·생물·원자력 등 과학기술 협력과 공동연구를 장려한다는 약속도 담겼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그제 서명한 새 조약은 과거 냉전 시절 북한과 옛 소련 간 동맹조약의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할 만한 내용이어서 1996년 폐기된 양국 동맹이 28년 만에 복원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 조약 4조는 1961년 체결된 북-소 조약의 1조에 ‘유엔헌장 제51조, 조선과 러시아 법에 준해’라는 대목만 삽입했을 뿐 똑같다. 여기에 ‘위협 조성 시 즉시 협상’ 같은 조항도 추가했다. 그 내용상으론 한미 동맹의 상호방위조약 수준을 넘는 동맹관계를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조약 내용만으로 동맹의 복원이라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김정은이 ‘동맹 관계’을 강조한 데 반해 푸틴은 ‘질적 격상’만을 얘기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기댈 데 없는 왕따국가 간에 이해가 맞아떨어진 데 따른 편의적 의기투합의 결과인 것은 분명하다. 당장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용 무기 조달을 위해 북한의 탄약과 미사일이 필요하고,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북-러가 신냉전 기류를 타고 상호 협력을 구체화할 경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악영향은 불가피하다. 양국은 앞으로 반미, 반서방 동맹을 내건 연합군사훈련 같은 도발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 나아가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북한제 무기 지원을 넘어 병력이 파견되거나, 한반도 위기 시 러시아가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북-러의 위험한 결탁은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어제 ‘엄중하고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지만, 한미동맹 강화와 국제적 공동 대응 같은 뻔한 맞대응으론 부족하다. 최근 한-러 간 상호 금지선 준수를 통한 안정적 관계 관리를 자신해 온 정부다.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레버리지(지렛대)를 적극 활용해 압박하고 한중 관계에서 진영 대결의 틈새를 찾아내는 등 북-러가 위험한 선을 넘지 않도록 중층적 외교를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