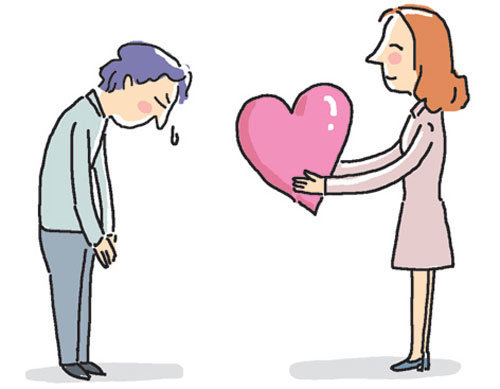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다.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가해자에게조차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다. 아일랜드 작가 샐리 루니가 쓴 ‘노멀 피플’(보통 사람들)의 주인공 메리앤이 그러하다. 그녀는 학교에서 늘 따돌림을 당했다. 특히 두 남학생이 심하게 그랬다. 그들 중 하나는 다른 학생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녀의 작은 가슴을 납작 가슴이라고 하면서 서로의 귀에 대고 모욕적인 말을 소곤거렸다. 그들은 더한 짓도 했다.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있었던 일이다. 열여덟 살 무렵이었다.
그녀는 졸업하고 몇 년 후 그들을 용서한다. 가해자 중 하나는 죽어서 용서할 수 없게 됐지만, 다른 하나가 사과하자 바로 용서한다. 자살한 친구도 미리 용서해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으랴 싶다. 그 친구도 속으로는 틀림없이 미안해했을 것만 같다. 그녀가 너그러운 것은 상처가 피해자한테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어쩌면 가해자에게 더 큰 상처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잔인한 짓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어쩌면 가해자에게 더 깊고 더 영구적인 상처를 입힐지도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생각 같지만 인간을 선하고 윤리적인 존재로 상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생각이다. 그녀는 피해자도 고통과 상처를 통해 배우고, 가해자도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잊을 수 없는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그녀가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는 이유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처를 통해 배우고 바뀐다는 믿음이 있는 거다.
피해 당사자가 전혀 아님에도 가해자를 향해 죽일 듯이 돌을 던지는 가학적인 문화를 생각하면 인간 본성에 대한 그녀의 낙관은 다소 순진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피해자인 그녀가 보여주는 눈부신 너그러움도, 그 너그러움이 상정하는 가해자의 선한 윤리적 본성도 우리 인간의 일부다. 그것만으로도 인간은 벌써 아름답다.







